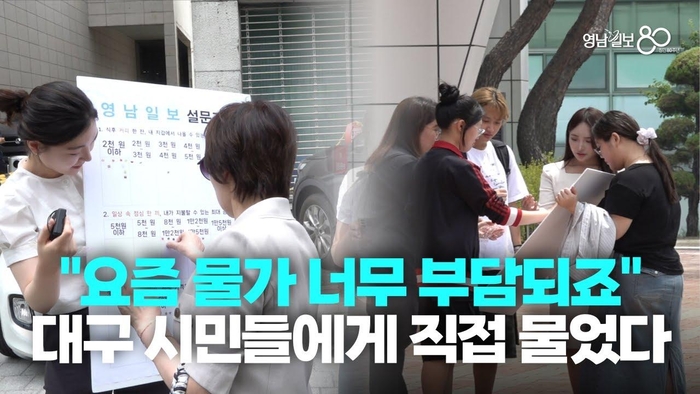|
| 박규완 논설위원 |
'둥근 네모'를 본 적이 있는가. 물론 실존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린 더러 '둥근 네모'란 말을 쓴다. 일종의 수사법(修辭法)이다. 의미상 양립할 수 없는 낱말을 함께 사용하는 어법, 즉 형용모순이다. 이를테면 '소리 없는 아우성' 따위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슬픈 웃음' '미운 사랑' 같은 형용모순의 언어가 자주 등장한다.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는 형용모순의 뉘앙스를 살짝 풍긴 상큼한 작명이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협치다. 한데 묘하게도 협치와 '둥근 네모'는 맥락이 관통한다. 여야의 각각 다른 주장 '원형'과 '네모'를 수렴해가는 게 협치여서다. 하지만 협치는 대화와 밀당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는 지난(至難)한 과정이 필요하다. 협상이 성공하면 대개는 '둥근 네모'의 결과물을 순산한다. 윤석열 정부 협치의 첫 시험대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로 결론 났다. '정호영+한동훈 낙마'를 포석했던 민주당의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둥근 네모'로 귀결된 셈이다.
협치는 협주를 빼닮았다. 협주다운 협주가 등장한 건 바로크 시대다. 그전까지는 독주이거나 음색·음량이 비슷한 악기끼리의 협연이 고작이었다. 협주와 피아노의 등장은 중세 음악 생태계를 훨씬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들었다. 협주는 음색과 음량이 전혀 다른 악기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호흡을 맞춰야 하니 너무 튈 수도 없다. 협주곡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협주는 독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빚어낸다. 협주의 묘미다.
내친김에 협업 얘기까지 펼쳐 보자. 2015년 첫 방영된 '헌터(Hunter)'는 영국 BBC가 제작한 명품 야생 다큐멘터리다. 전 세계 포식동물들의 사냥 장면과 야생의 먹이사슬을 생생하고 적나라하게 포착했다. 필자는 북극여우의 북극토끼 사냥법이 기억에 남는다. 북극여우와 북극토끼는 달리는 속도가 같다. 북극토끼는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북극여우 한 마리가 북극토끼를 따라붙으면 절대 잡지 못한다. 하지만 북극여우 서너 마리가 협업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한 마리가 쫓고 양쪽에서 협공하면 북극토끼가 방향을 바꿔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의도 정치 현실은 협주와 협업의 솔루션을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공히 배려·양보·협조의 기본 덕목을 갖추지 않아서다. 여소야대의 윤 정부는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되뇐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협치를 예로 든 건 뜬금없고 생뚱맞았다. 처칠-애틀리 경우는 여대야소였고 연정을 했으며 전시였다. 지금의 우리 정치 구도와는 판이하다.
흔히 협치로 윤색하지만 기실 협치는 거래다. 거래는 기브 앤드 테이크다. 때론 기술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거래는 예술"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왕 줄 거면 선제적이고 파격적이어야 한다. 이미 지나간 얘기이지만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지명권을 야당에 넘겼으면 어땠을까 싶다. 협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물론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 전횡을 하지 않는다는 함의까지.
윤 정부 5년의 성공시대를 열 키워드는 '협치'다. 정책 및 인사에서 여야 합작의 '둥근 네모'를 양산해야 한다. 하지만 성상(性狀) 묘사의 언어 기법일 뿐 실제 '둥근 네모'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협치가 어려운 거다.<논설위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