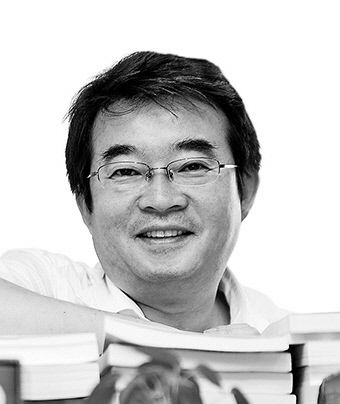 |
|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열흘 다녀왔다. 단국대에서는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문학창작을 강의하는 국제 창작프로그램을 매년 두 차례 개최한다.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이 프로그램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교민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듣는다.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는 분 중에 1932년생 최경희라는 분이 계신다. 본명은 김윤자이며, 김경희라는 이름을 쓰기도 한 그분은 올해 아흔한 살. 1981년에 언니를 따라 이민을 갔다. '이곳에 와서 가진 직업이라고는 바느질 노동, 베이비시터, 환자 간병인 정도. 그 뒤로 영어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기술도 없고 나이만 많은 '잉여인간'으로 노숙자 생활을 면한 것은 이 큰 나라가 저소득자들에게 주는 혜택 덕이다. 두 남매는 성장해 결혼도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손자 하나, 손녀 셋도 얻었다. 나는 이 천사의 도시에 묻히는 것이 기쁘다.' 그의 수필은 에두르지 않고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다.
하루는 강의가 끝나고 8시가 넘었는데 그가 밥을 먹자고 했다. 한인타운 식당에 마주 앉아 은대구탕을 시켰다. "책을 한 권이라도 내고 죽고 싶어요." 그는 김제고녀를 다닐 때 1949년 군산신문사 주최 전북중고등학생 문예작품 현상모집에 시 '용마리'가 당선된 것을 프로필의 제일 앞줄에 놓는다. 미국 생활이 시작된 이후 시와 시조를 써 등단하기도 했으나 작품집이 없었다. 그동안 발표한 작품의 복사본과 노트와 갱지에 쓴 습작품을 꺼내놓았다.
여고 다닐 때 영광 법성포 사는 청년 하나가 최경희를 흠모했다. 서울상대 2학년 김규문, 그는 최경희에게 자주 편지와 엽서를 보내 사랑을 고백했다. "두어 번 만났지만 그게 첫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도 못했어요. 한자와 일본어까지 섞인 유려한 필체의 편지를 당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그 편지를 가져가 읽어달라고 부탁드렸죠." 편지를 읽고 난 교장은 경희를 보고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요놈 사랑에 빠져 있구나."
봉투에 넣고 비닐로 싼 그 편지와 엽서는 금방이라도 가루가 되어 부서질 것 같았다. 6·25전쟁 때 피란을 갔을 때도 가지고 갔고, 교사 생활을 할 때도 결혼하고 자식 둘을 낳을 때도 옆에 있었고, 70년 넘게 껴안고 살았다. '달빛이 흘러내리는 외로운 밤에 연모의 마음을 누를 길 없다'는 문장을 나는 겨우 읽었다. 또 1946년에 8·15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한 해방조선 우편엽서에는 법성포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김규문의 월북으로 최경희의 첫사랑은 막을 내렸다.
또 있다. 고등학교 때 흠모하던 음악교사 장원석 이야기를 정리하는 일을 최경희는 필생의 업처럼 여기고 있다. 작곡을 하던 그 교사는 재학 중에 세상을 떠났고, 그는 교사를 추모하는 시를 썼는데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등사기로 인쇄한 옛날 교지를 내밀며 꼭 작품집에 넣고 싶다고 했다. 내가 은대구탕을 한 그릇 비우는 동안 그는 국그릇에 손도 대지 않았다. 포장해서 가져가면 된다며 종업원을 불렀다. "아가씨!" 깜짝 놀랐다. 한국 사회에서 사라진 그 말을 미국에서 듣게 될 줄 몰랐다.
최경희의 구형 폴더폰이 울렸다. 집으로 모시고 갈 분의 전화였다. 올해는 동행한 박덕규 교수와 함께 최경희 작품집을 만들어 그 폴더폰으로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