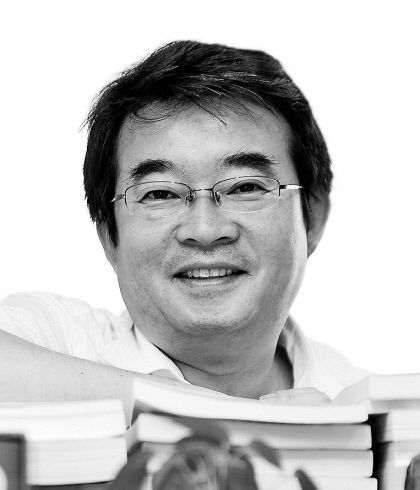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올해 대한민국의 10월은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온통 물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단풍보다 뜨겁게 말이다. 100년을 조금 넘긴 한국현대문학사에 이처럼 경사스러운 일이 또 있었을까 싶다. 한국문학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초유의 일이다. 한글을 모국어로 삼고 있는 우리로서는 백번 어깨를 으쓱해도 좋을 일이다.
노벨문학상이 발표된 다음 날, 모든 언론사의 뉴스는 30분 가까이 수상 소식을 특집으로 꾸며 내보냈다. 길거리 시민들의 인터뷰를 내보내기도 했다. 아직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했다. 한국인들도 읽지 않은 소설을 스웨덴 한림원이 먼저 알아보고 선택을 했다는 것인가? 이렇게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이 많다는 걸 안다면 그들이 정말 후회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독서, 도서관, 출판 관련 예산이 200억 가까이 삭감되었다. 덩달아 지방 자치단체도 독서 관련 예산을 폐지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책을 읽는 일을 중지하라는 건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한강의 책은 수상 소식 이후 100만부 넘게 팔려나가고 있다. 대형 서점 중심의 불합리한 유통구조 때문에 그마저도 작은 동네책방에서는 한강의 책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내가 아는 한강은 그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작가다. 그가 흥청거리는 문단 행사에 얼굴을 자주 내비쳤다거나 자기 자랑에 열을 올렸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흔한 작가 초청 강연도 거의 다 정중히 거절하는 편이다. 그는 은둔하는 고행자처럼, 그저 쓸 뿐이다. 기자회견이나 문학관 설립 같은 상투적인 방식을 마다하는 것 또한 한강답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의 작가로서의 몰두와 집중력에 주는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년이 온다'는 광주 5·18을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이 광주를 다룬 소설 중에 유독 돋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구성이 완벽하고 묘사가 치밀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두 번째 장 '검은숲'에서는 죽은 열다섯 살 소년 정대의 영혼이 화자로 등장한다.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은 정대의 영혼이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는 장면, 썩어가는 시체들을 군인들이 불태울 때 정대의 자유로운 영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의 쾌감을 선사한다. 이로써 독자는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안타까운 소년의 죽음을 온전하게 복원시킨 작가에게 손뼉을 치게 된다.
추측건대 우리 생전에 한국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다시 수상하는 일이 올 것 같지는 않다.
한국문학과 작가가 미약해서가 아니라 확률상 그렇다는 거다. 이제 한국문학은 한강 이전과 이후로 문학사를 확연하게 나누어 시대구분을 할지도 모르겠다. 한강 이전에 책을 읽지 않던 한국인들이 한강 이후에 책벌레처럼 책을 읽는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