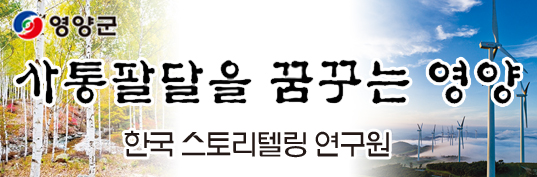한때 대구를 먹여 살렸던 ‘섬유산업’이 고사할 지경에 이르렀다. 소규모 업체들은 도산할 위기에 처했고,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업계는 원인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 등 기업 운영을 옥죄는 현실,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가 부진한 점을 꼽는다. 정부가 지역 특정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섬유산업의 쇠락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는 힘들다. 지역 섬유패션산업은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국내 섬유패션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전문연) 7곳 가운데 4곳이 대구와 경산에 몰려 있다. 이들 전문연은 수십 년간 정부 R&D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매년 각종 박람회와 패션쇼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의 결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수십 년 전에 개발된 화학섬유가 여전히 지역 섬유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가 전문연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밀라노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했다면 섬유패션산업은 지금까지 대구산업의 주력 업종으로 자리잡았을 것이다. 대구섬유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쇠락해가는 이유는 산업을 일으켜 세울 변화와 적응의 기회를 놓친 채 안주했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문연의 존립 위기를 죽어가는 산업을 되살릴 마지막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서민지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지원 유세에 목 다 쉰 한동훈 “위기 앞 우리 모두 나서야”](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5/news-m.v1.20250521.b3a6527cde6f40d48ee201b802bdf1a2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