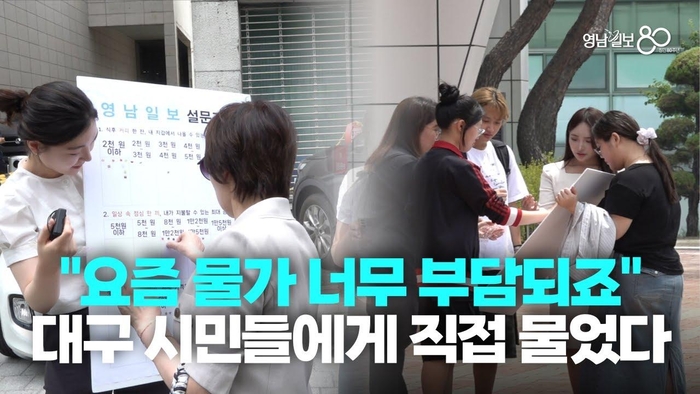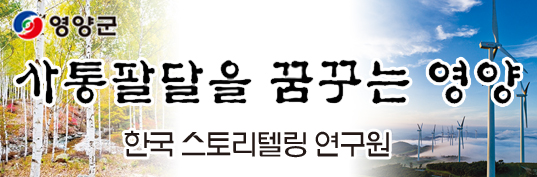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한밤마을 돌담길. 구불구불 이어지고 망연히 끊기는 미로 같은 돌담길이다. 벽이 되고 길이 된 돌은 작게는 지름 10㎝ 정도의 주먹돌부터 크게는 80㎝ 정도의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 |
이 길이 아닌데. 게다가 터널이라니. 이 껌껌한 터널에서 무지개 조명이나 보자고 이 청명한 가을날 팔공산으로 나섰던 건 아니었다. 세상이 변하는 동안 동굴에서 잠잔 느낌이다. 팔공산터널은 2017년에 개통되었다고 한다. 터널 길이가 무려 3.7㎞. 긴긴 터널을 지나 얼마 달리지 않아 층층으로 펼쳐진 황금빛 논들이 보인다. 사태들, 깨밭들, 큰들. 들 아래 나지막한 마을에서는 한 줄기 연기가 가을가을 피어오르고 있다.
一夜에서 大夜, 나중에 大栗로
입구엔 밤나무 대신 솔숲 반겨
1930년 산사태 때 쓸려온 돌
구불구불 고요한 돌담길 돼
한때 서당으로 쓰였던 大廳
지금은 마을의 광장같은 곳
붉은 산수유… 노란 은행잎…
마을 뒤쪽엔 붉게 익은 사과
 |
| 대율리 대청. 마을의 돌담길은 모두 이 대청으로 모여들고 또 대청에서 퍼져나간다. |
◆가을의 한밤마을
경북 군위 부계면 대율1리 버스정류장 옆에 플라타너스가 장하다. 아직은 초록이 더 많은 무성한 이파리들 속에서 딸랑딸랑 매달린 열매들이 소리를 삼킨다. 나무를 앞세우고 집 한 채 가만히 앉았다. 마을 정유소란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 세월 보냈을 집, 지금도 세월 보내기 좋게 생겼다. 집과 마주보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유리 미서기문 속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 것만 같다. 모퉁이를 돌자 어떤 시선도 없는 고요한 돌담길이 저만치 앞서 있다. 쫓으면 또 저만치 앞선 돌담길. 쫓기를 멈추고 가만히 걷다보면 어느새 곁에서 함께 걷는 돌담길. 구불구불 이어지고 망연히 끊기는 미로 같은 돌담길이다.
돌담 위로 가을이 쏟아진다. 아직 푸르거나 거뭇거뭇한 반점이 시작된 이파리들 속에서 완벽하게 매끈한 산수유가 붉게 빛나고 있다. 하늘에는 아기의 주먹만 한 감들이 대롱대롱 매달리었고 어른 손바닥만큼이나 큰 감들은 돌담에 걸터앉거나 땅에 닿을 듯 늘어져 있다. 수은행나무는 아직 푸르고 암나무는 은행들을 감추듯 노랗게 물들었다. 담장을 뒤덮은 호박 덩굴에 호박이 없다. 수확을 하지 않은 호두나무에 호두가 흐드러져 있다. 오랜만에 보는 탱자나무에는 탱자가 시큼하고 이미 앙상한 나무에는 둥치를 휘감은 담쟁이가 붉다. 돌담 위에 쌓아 놓은 잔가지들은 땔감일까. 어느 댁 문간에는 땅콩이 넓게 누웠다. 대문 없는 마당에서는 아저씨가 선풍기를 동원해 키질 중이다. 킁킁, 연기 냄새가 난다. 골목길 모롱이에 할머니가 주저앉아 낙엽을 태우신다. 가을가을 연기 오른다.
이 마을은 대율리 혹은 한밤마을이라 불린다. 밤이 길어 한밤이라 했다 한다. 팔공산의 북쪽 산자락, 긴 밤은 아주 커다랗게 마을을 뒤덮었을 것이다. 처음 이곳에 마을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은 일야(一夜)라고 했고 950년 부림홍씨 홍란이라는 선비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대야(大夜)라고 고쳤다고 전해진다. 이후 1390년 무렵 부림홍씨 14세손인 홍노라는 사람이 마을 이름에 밤 야(夜)는 좋지 않다 하여 밤 율(栗)로 고쳐 쓴 것이 현재까지 이어진 대율리(大栗里)다. 마을에 밤나무는 많지 않다.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밤은 길고 클 것이다. 가슴을 짓누르는 아득한 한밤, 입 안에 가득 들어차는 한밤.
마을 한가운데에 대청(大廳)이 있다. 마을의 자랑거리란다. 한때는 학동들을 가르치는 서당으로 쓰였고 지금은 마을의 경로당이자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의 돌담길은 모두 이 대청으로 모여들고 또 대청에서 퍼져나간다고 한다. 대청 옆 커다란 은행나무는 곧 샛노랗게 물들 듯하다. 대청에서 마을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들이다. 두어 개 논배미만이 추수가 끝났다. 논 가까운 길에는 딱 그만큼의 나락이 펼쳐져 있다. 말리기가 끝났는지 중년의 부부가 나락을 쓸어 모아 포대에 담는다. 싹싹 싸르르르르.
 |
| 한밤마을의 솔숲. 팔공산이 성처럼 둘러싸고 있어 성안숲이라 부른다. |
◆천 따라 길 따라
큰들에서 한밤8길 따라 주욱 내려간다. 이 길을 따라 위천 상류인 동산계곡물이 흐르고 마을의 큰길인 한티로를 따라 남천이 흐른다. 마을은 두 천 사이에 만두처럼 들어 앉아 있다. 이 많은 돌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분명 이 두 개의 물길과 관련 있겠다 싶지만 여기에는 좀 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
1930년 여름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 늦은 밤 두 시간 넘게 퍼부은 비가 골짜기를 순식간에 휩쓸었고 팔공산의 돌들이 쓸려 내려왔다. 그날의 산사태와 수해로 93가옥이 유실되고, 92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3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비가 그친 뒤 사람들은 사방에 널린 돌들을 하나하나 지고 날랐다. 천변에는 둑을 쌓고 집은 돌담으로 감쌌다. 벽이 되고 길이 된 돌은 작게는 지름 10㎝ 정도의 주먹돌부터 크게는 80㎝ 정도의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 무척 든든한 돌담과 나란히 걸으며 낯선 사무실 건물과 군인 아파트를 지나 어느새 골목으로 들어선다.
 |
| 군위 대율리 석불입상. 마을사람들이 미륵불로 모시고 있는 보물이다. |
대문이 활짝 열린 집의 강아지들은 순하기 그지없다. 대문을 걸어잠근 집의 강아지들은 목청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짖어댄다. 여느 집들과 다름없는 어느 대문간에 발을 들이민다. 딩동, 저절로 벨소리 울린다. 마당 안쪽에 석불입상이 있다. 마을 사람들이 미륵불로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시다. 원래는 마을의 외진 곳에 허리 아래가 파묻힌 채로 있었다 한다. 지금은 보물 제988호다. 부처님을 배알하고 코스모스와 금잔화가 피어난 돌담길을 지나면 한티로가 열린다. 옛 초등학교 앞에 수령이 140년쯤 되었다는 느티나무 다섯 그루가 눈부시다. 그 너머로 솔숲이 넓다.
솔숲이 있는 이곳이 마을의 입구다. 200년이 넘게 자란 늙은 소나무들이 이룬 숲은 막힌 데 없는 마을 앞을 알맞게 가려주고 겨울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비보림이다. 팔공산 자락이 마을을 성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숲이 있다고 '성안숲'이라 한다. 현재는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한티로로 인해 숲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숲에는 임진왜란 때 영천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홍천뢰 장군과 홍경승을 추모하는 비가 큼직하게 서 있고 석탑의 기단 하나가 폭신한 솔잎 위에 놓여 있다.
솔숲을 가로질러 마을 뒤쪽의 들로 나간다. 바뜩들이다. 황금빛 물결의 가장자리는 과수원이다. 탐스럽게 익은 사과들 덕에 달콤한 향기가 넘친다. 저 사과를 한 입 깨문 새는 어디서 배부른 낮잠을 잘까. 사방이 고요하다. 솔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한티로로 향한다. 수풀 속에서 불쑥 고개를 내민 돌기둥 위에 돌오리가 앉아 있다. '진동단(鎭洞壇)'이라 부르는 솟대라 한다. 옛날에는 팔공산에서 자란 정결한 나무로 오리를 조각한 솟대를 3년마다 새로 세웠는데 그게 번거로워 아예 돌로 솟대를 세웠다고 한다. 마을의 안녕을 빌며 한티로를 따라 위천을 거슬러 오른다. 다시 대율1리 버스정류장이다.
글·사진=류혜숙 여행칼럼니스트 archigoom@naver.com
- 여행 Tip -
중앙고속도로 칠곡IC에서 내리거나 신천대로를 타고 팔달교를 건너간다. 칠곡중앙대로를 타고 군위 방향으로 계속 북향하다 동명사거리에서 우회전한다. 동명저수지를 지나 기성삼거리에서 좌측 한티로로 빠져 한티재를 넘어가기를 추천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길 100에 속하는 산길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다. 2017년 개통한 도로로 인해 차량도 약간 줄어든 느낌이라 더욱 호젓하다. 기성삼거리에서 직진해 79번 지방도인 팔공산로로 가면 3.7㎞의 팔공산터널을 지나게 된다. 시간이 촉박한 분들께 추천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