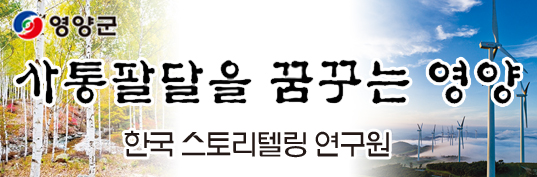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만추(晩秋). 비로소 가을과 겨울이 나무에 공존한다. 그 무렵이면 나무는 자기가 거느린 낙엽을 '창고 대방출'한다. 활엽수 가지에 매달렸던 단풍의 90%가 사라진다. 산의 속살이 여지없이 노출된다. 그래서 도시의 면적이 몇 배나 더 넓어진 느낌. 나무의 동면(冬眠). 수액은 상방으로의 진군을 멈춰버리고 뿌리 쪽으로 서둘러 피난을 간다. 홀로 남겨진 가지와 줄기는 극지 펭귄의 형용이다. 다들 얼어 죽을 각오로 어금니를 악물고 있다. 돌멩이처럼 야문 나뭇가지의 눈초리.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린 빛바랜 잎사귀가 더없이 황홀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단풍나무도 조생종과 만생종이 있다. 서둘러 지는 놈도 있지만 가지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는 질긴 놈도 있다. 그런 단풍일수록 야성이 강하다. 바로 '버즘나무'로 불리는 플라타너스이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멋진 가로수의 대명사로 불린다. 엄청 키다리다. 한국의 플라타너스는 프랑스에 비하면 단신이다. 상당수 잎은 이듬해 2월까지 매달려 있다.
은행잎은 목련꽃 지듯 대책 없이 진다. 단숨에 노랑 폭우처럼 사정없이 땅바닥으로 내려꽂힌다. 그리고 발길과 차의 바퀴에 짓이겨진다. 바나나껍질만큼 미끈거려서 낙상을 초래한다. 봄날 하늘거리는 연분홍 꽃을 매달았던 벚나무는 가장 고혹한 빨강·노랑·주홍의 앙상블을 보여준다. 남천과 화살나무, 담쟁이덩굴도 멋진 단풍을 그려낸다. 물론 감나무도 그 못지않다. 감잎 단풍에는 황톳빛과 녹색이 드문드문 묻어난다. 차인에겐 다식 받침대로 사랑받는다.
가을의 완성은 첫눈과 마지막 잎새가 만날 때다. 첫봄의 첫 잎, 그 연둣빛 움들은 다들 씨앗의 형용에서 점차 총알의 포스로 진군한다. 그게 크게 풀리면서 싹을 지나 잎으로 진용을 갖춘다. 무진장한 잎의 대열, 처음에는 그 잎의 컬러는 제각각이다. 4월의 산하는 그 초록의 각기 다른 스펙트럼이 완벽하게 균존한다. 하지만 찢겨 졌던 그 푸르름의 장막은 진초록으로 통합된다. 지루한 여름이 그 장중한 초록 하나로 버티는 것 같다. 산하의 속내는 좀처럼 들키지 않는다. 짙은 녹음과 폭염 사이에 태풍이 구렁이처럼 지나간다. 이윽고 가을이 도달하면 하나로 통일돼 있던 초록의 산하가 수천수만 갈래의 빛으로 쪼개진다. 식물의 모든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만다.
문인은 마지막 잎새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것은 희망도 절망도 아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다. 목숨이 삶의 방식에서 죽음의 방식으로 몸을 뒤집을 뿐이다. 임종 직전의 몸도 어떤 가문의 가지에 달린 마지막 잎새 아니겠는가. 그 잎새를 보내면서 뿌리에 가득 찬 수액들은 더욱 생기를 머금게 되는 것이다. 죽어줘서 '생큐'랄까?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찬탄파 반탄파 분당 가능성?](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29.dfce1e66f6774371bc2ae25a5d9b7a34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