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안군이 2017년 화가 김호석에게 의뢰해 그린 이매창 영정. |
거문고·詩와 보낸 짧고 정한 가득한 삶
봄날 시름도 거문고 타며 마음 토닥여
당대 최고 시 비평가 허균, 매창에 찬사
권필·한준겸 등 문인들과 시 주고 받아
아끼던 거문고와 공동 묘지에 매장돼
한시 54편 모은 '매창집' 1668년 간행
1917년, 부안 시인 모임서 새 비석 세워
매창의 묘 문화재로…매창공원도 설립
거문고와 시를 누구보다 좋아했던 이매창. 거문고를 자신의 무덤에 함께 묻어 달라는 유언까지 했던 매창의 짧고 정한(情恨) 가득했을 삶을 그녀가 거문고에 실어 노래한 시(한시)를 통해 엿보면 어떨까 싶다. 먼저 '거문고를 타면서(彈琴)'이다. '몇 해 동안이나 비바람 소리를 내었던가(幾歲鳴風雨)/ 지금껏 지녀온 작은 거문고 하나(今來一短琴)/ 외로운 난새의 노래는 타지 말자 했건마는(莫彈孤鸞曲)/ 끝내 백두음 가락을 스스로 지어서 타네(終作白頭吟)'.
백두음은 버림받은 여인의 원망을 담은 노래다. 거문고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슬픔은 결코 노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떠나간 임을 원망하며 슬퍼하는 노래를 연주하게 되었다고 읊고 있다. 또 다른 '거문고를 타면서(彈琴)'이다. '거문고로 속마음 하소연해도 누가 가엽게 여기랴(誰憐綠綺訴丹衷)/ 만 가지 원한 천 가지 시름 이 한 곡조에 들었다오(萬恨千愁一曲中)/ 강남곡을 다시 타는 동안 봄도 저물어 가는데(重奏江南春欲暮)/ 고개 돌려 봄바람에 우는 짓은 차마 못하겠네(不堪回首泣東風)'.
강남곡(江南曲)은 연밥을 따며 부르는 연가(戀歌)이다. '봄날의 그리움(春思)'이다. 멀리 떠난 임을 그리워할 때도 매창에게 거문고는 더없는 친구가 되었던 모양이다. '삼월이라 동풍이 불어(東風三月時)/ 곳곳에 꽃이 져 흩날리네(處處落花飛)/ 거문고 뜯으며 임 그리워 노래해도(綠綺相思曲)/ 강남으로 가신 임은 돌아오시질 않네(江南人未歸)'.
이 시 '규중에서 서러워하네(閨中怨)'도 마찬가지다. '옥 같은 동산에 배꽃 눈부시게 피고 두견새도 우는 밤/ 뜰에 가득 달빛 어려 더욱 서러워라/ 꿈에서나 만나려 해도 잠마저 오지 않고/ 일어나 매화 핀 창가에 기대니 새벽닭이 우는구나// 대숲 집엔 봄이 깊고 날 밝기는 멀었는데/ 인적도 없는 작은 정원에 꽃잎만 흩날리네/ 거문고 빗겨 안고 강남곡 뜯으며/ 끝없는 시름으로 한 편의 시를 이루네'.
◆마음 달래는 반려, 거문고
봄날 시름도 거문고 없이는 달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봄날의 시름(春怨)'과 '옛님을 생각하며(憶故人)'이다. '대숲 집에 봄이 깊어 새소리 늘어나고/ 눈물 얼룩진 화장 얼굴로 창을 가린 비단을 거두네/ 거문고 끌어다가 상사곡 뜯고 나니/ 꽃잎 지는 봄바람에 제비들만 비껴 나네' '봄이 왔다지만 임은 먼 곳에 계셔/ 경치 보면서도 마음 편치 않다오/ 난새 거울 보며 아침 화장을 마치고/ 달 아래서 거문고를 뜯는다오/ 꽃 볼수록 새로운 설움 일고/ 제비 우는 소리에 옛 시름 생겨나니/ 밤마다 임 그리는 꿈만 꾸다가/ 오경 알리는 물시계 소리에 놀라 깬다오'. 매창이 임서(1570~1624)에게 보낸 시다.
'파랑새가 날아와 편지 전하니/ 병중에 시름겨운 생각 더욱 서글퍼지네/ 거문고 타고나도 알아주는 이 없어/ 장사에 가서 적선(謫仙)이나 찾아뵈어야겠네'. 임서의 '석촌유고(石村遺稿)'에 실려 있는 시다. 임서가 무송현과 장사현이 합해진 무장현의 현감이었으므로 매창이 '장사로 찾아가겠다'고 했다. 적선은 당나라 시인 이백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시인 임서를 말한다. 임서를 이백에 비유한 것이다. 임서는 이 시를 받기 전 자신의 생일잔치에 매창을 초대하며 아래 시를 써 보냈다. '봉래산 소식이 아득하여 전해지지 않으니/ 홀로 향기로운 봄바람을 맞으며 멍하니 생각하네 아름다운 사람은 잘 지내는지/ 신선 술자리에서 선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네'.
◆매창은 죽고…
매창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허균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기리는 글 '매창의 죽음을 슬퍼하며(哀桂娘)'를 짓는다. 시 2수가 포함돼 있다. '계생(桂生)은 부안 기생이다. 시에 능하고 글도 알았으며, 또 노래와 거문고도 잘했다. 천성이 고고하고 깨끗하여 음탕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가 그 재주를 사랑하여 교분이 막역하였으며, 비록 우스갯소리를 나누며 가까이 지냈지만 어지러운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 사귐이 오래가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 한 차례 울고 난 후, 율시 2수를 지어 그를 슬퍼한다.'
당대 최고의 시 비평가였던 허균은 매창의 재주를 높이 평가했다. 이에 많은 문인들이 매창을 찾아 시를 주고받으려 했다. 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들로는 권필, 심광세, 임서, 한준겸 등이 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권필은 매창에게 주는 시에 '여자 친구 천향에게 주며(贈天香女伴)'라고 적을 만큼, 친근감을 표현했다. 한준겸도 매창에게 시를 지어 건넸으며, 매창을 당나라 중기의 이름난 기생인 설도(薛濤)에 비유하기도 했다. 매창에게 있어서 유희경, 허균, 이귀, 한준겸 등 당대의 문사들은 마음을 함께 나누며 시를 노래하는 친구와 다름없었다.
매창은 공동묘지에 그녀가 아끼던 거문고와 함께 묻혔다. 매창이 묻힌 뒤 사람들은 이 공동묘지를 '매창이뜸'이라고 불렀다. 그가 죽은 지 45년 후인 1655년 무덤 앞에 비석이 세워졌고, 1668년에는 부안의 아전들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당시까지도 전해졌던 그녀의 한시 54편을 모아 개암사(開岩寺)에서 '매창집(梅窓集)'을 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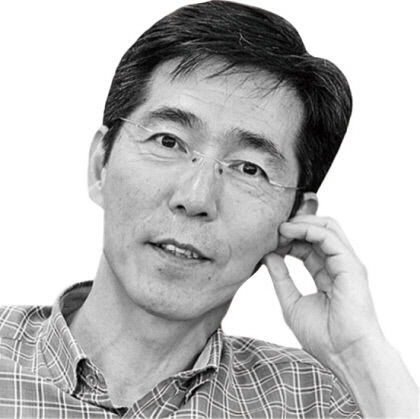 |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1983년 이매창의 묘는 지방기념물 제65호의 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01년 그 묘역을 중심으로 매창공원이 만들어졌다. 2001년 매창공원이 만들어지면서 매창과 명창 이중선의 무덤만 남기고 나머지 무덤 1천여 기를 이장했다고 한다.
허균 친구 권필은 매창을 위해 지은 시 '여자 친구 천향에게'에서 이렇게 읊었다. '선녀 같은 자태 풍진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 홀로 거문고 안고 저무는 봄을 원망하네/ 거문고 줄 끊어질 때 애간장도 끊어졌네/ 세상에 그 소리 알아주는 사람 찾기 어려워라'.
글·사진=김봉규<문화전문 칼럼니스트> bg4290@naver.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