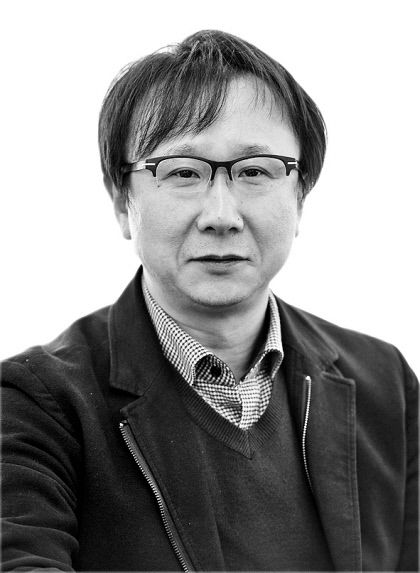 |
| 이창호 논설위원 |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만큼 기자들과 잦은 실랑이를 벌인 이도 없을 게다. 2020년 11월 말 백악관 기자회견장.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였다. 활발하게 문답이 오가던 회견장이 일순간 싸해졌다. 대선 승복 여부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가 불같이 성을 냈다. 부정 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트럼프에게 기자가 "확실하게 말하세요. 승복을 안하겠단 말입니까"라고 재차삼차 묻자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이건 약과다. 코로나 팬데믹 땐 기자들이 "지금 이 시국에 자찬성(自讚性) 회견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면박을 줬다. 이에 트럼프는 "너희(기자)들은 태생적으로 무뇌아"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이처럼 백악관 기자회견에선 대통령과 기자의 원색적 말싸움이 예사로 벌어진다. 총만 안들었지 전쟁터와 같다. 매섭다 못해 살벌하다.
대한민국 용산의 기자회견장은 어떤가. 좋게 말해 점잖고, 언짢게 말하면 미적지근하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국민의 눈높이에선 그렇다. 그날 회견은 '혹시나' 했지만 결국 대통령의 '어찌됐든 사과'에 그쳤다. 솔직히 '기자들이 좀 더 공격적(전투적)으로 질문을 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시종일관 정곡을 찌르는 송곳 질문을 던졌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영혼없는 사과'는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나마 회견 말미 '사과의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한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은 언론의 체면을 세워줬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고 한 것은 허튼 소리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없다'(백악관 출입기자 故 헬렌 토머스의 명언)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를 갖고 무례하다고 한다면 우리 기자들이 좀 더 '무례해도' 좋다.
각설하고, 윤 대통령 워딩대로 '어찌됐든' 그의 사과는 내용도 스타일도 민망스럽다. '하도 사과하라고 하니 하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태도. 좀 더 심하게 말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식이다. 논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한 답변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과에 인색한 이가 윤 대통령 뿐이랴. 숱한 범죄 혐의에도 사과할 줄 모르는 정치인도 있지 않은가. 멀리 볼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다. 오늘 위증교사 1심 선고(이 대표)와 내달 12일 자녀입시비리 대법원 선고(조 대표)를 앞두고 있는 이 둘은 여전히 국민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공당(公黨)의 대표라면 빈말로라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리스크 때마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비판 여론을 달랬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사과의 끝판왕'이었다. 논란이 생기면 늘 "내가 망쳤다" "내 잘못이다"라고 했다. 변명이나 사족('기분이 나빴다면' '본의 아니게' '다만' '하지만' 등)을 달지 않았다. 사과는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YS도, DJ도, 노짱(노무현)도, 오바마도 모두 사과의 중요성을 깨달은 위정자들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는 경상도 말로 뻔치가 좋다. 책 제목처럼 '미움 받을 용기(타인이 자기를 미워해도 개의치 않는 것)'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왠만한 비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 말이다. 분명히 말해두겠다. 이 세 사람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선 안된다. 위정자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 출발점은 국민을 향한 '사과다운 사과'다.
이창호 논설위원

이창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