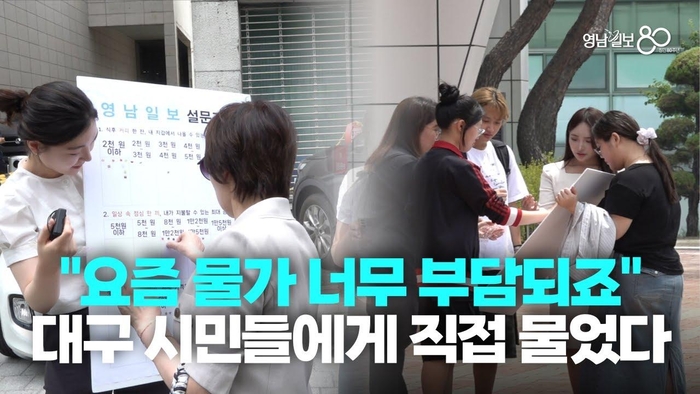1923년 6월11일 오후 6시 온양온천여관 마당.
객실에서 여자의 신음 소리가 들렸다. 순간 대구 대부호 장길상(張吉相)
의 장남 장병천(張炳天)이 자기가 투숙한 방으로 쏜살같이 뛰어들어간다. 방
금 쥐약을 먹은 조선권번 기생 강명화(康明花)가 괴로워하고 있다. 그녀를
품에 안은 장병천이 “내가 누구인지 알겠느냐”고 묻자 강명화는 꺼져가는
소리로 “세상에서 날 가장 사랑해주는 파건(장병천의 아호) 아니오. 난
독약을 먹어 모든 게 틀렸으니 마지막으로 날 꼭 껴안아주시오” 란 ‘절
명사(絶命詞)’를 토해낸다. 강명화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져 몇몇 장안 기생
들의 애도속에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된다. 실성한 장병천은 식음을 전폐한
채 그녀와 동거했던 서울 중구 종로 6가 32 안방에 앉아 온종일 애인의
옷만 쳐다본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장병천 역시 한 달만에 온천여관에
서 쥐약을 먹고 강명화의 뒤를 따랐다. 한국 최초 소프라노 윤심덕보다 3
년 전에 일어난 정사(情死)였다.
대부호의 장남과 명월관 기생의 자살. 이 메카톤급 뉴스는 곧바로 사람
들의 입을 통해 전국 각처로 퍼져나갔다. 한국인은 물론 일본인들도 충격을
받았다. 1924년 일본 감독 하야가와(早川)는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실제
기생 문명옥(文明玉)을 캐스팅, 영화 ‘비련의 곡’을 제작했다. 대박을
예감한 출판계는 곧바로 익명의 소설가를 앞세워 1925∼26년 ‘강명화의 죽
음’이란 소설을 발간한다. 이 소식을 들은 장길상은 “아들을 두번 죽이고
우리 집안에 흠집을 내는 처사”라고 분격하며 동생 장직상(張稷相)을 통
해 전국에 배포된 소설을 전량 구매, 소각처분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장
길상은 집 몇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을 날렸다. 그녀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967년 강대진 감독이 조흔파 원작 ‘강명화’를 갖고 영화를 만들었
다.
이 영화는 아세아극장에서 상영됐는데 당시 영화관 앞에는 대구관, 계림
관, 죽림헌, 청수원 등 대구 일급 요정 기생들이 많이 북적댔다. 아이러니
컬하게도 당시 아세아극장 사장은 장병천의 동생이었다.
강명화의 미모는 남달랐다. 80년 전 여인의 얼굴치곤 모던풍의 이목구비
였다. 그녀는 일제 때 최고의 뉴스메이커였다. 월간지 ‘조광(朝光)’ 1936
년 6월호는 그녀가 일제시대 한국에서 가장 먼저 단발을 실천한 여성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단발에 숨겨진 기막힌 사연을 아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
다. 어머니 윤씨는 “기생 주제에 부잣집 맏며느라니”라면서 늘 딸을 닦달
했다. 분노한 강명화는 “머리털이 없으면 쪽도 질 수 없으니 기생노릇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라며 가위로 머리를 싹둑 잘랐다.
구미 오태동에서 태어난 장병천은 동경 게이오대학 상과에 다녔고 17세
때 삭령 최씨와 결혼했다. 그가 강명화를 만난 곳은 일본 도쿄와 서울 일
류 요리집 명월관이란 두 가지 설이 있다. 일설에는 강명화가 평양권번에서
기생수업을 받던 중 당시 손님으로 온 상해 임정요인 등을 접하면서 자
연스럽게 독립운동에 간여하게 됐고, 군자금 확보차원에서 장병천한테 접근했
다는 설도 있다. 하여튼 강명화를 만난 장병천은 공부대신 사랑을 선택한다
.
둘은 서울과 도쿄를 오가면서 동거를 했고, 먹고 살기 위해 학비를 생
계비로 충당했지만 이 사실도 작은 아버지한테 들켜 더욱 궁색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강명화 역시 대부호 자제와 사랑한다는 소문 때문에 명월관에
서도 따돌림을 받았다. 사람의 눈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막노동까지 해
보지만 상황은 설상가상의 연속.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유학생들이 두 사람이
동거하는 집으로 찾아와 장병천을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자, 옆에 있던 강
명화가 식칼로 왼쪽 무명지를 끊으며 둘의 사랑의 깊이를 입증해 보였다.
보다 못한 장길상이 아들을 위해 임시로 살 집을 만들어주었지만 그녀의
아버지 강기덕이 대구와 서울의 장병천 집안 사람들을 만나 온갖 협박과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장병천은 아버지와 의절하게 된다. 정사를 위해 서울
을 떠난 날은 강명화의 생일이었다. 평생 돈 얘길 못하던 강명화는 그날따
라 옷과 구두를 사달라고 했다. 장병천은 옥양목으로 만든 옷 7벌과 흰
구두 한 켤레를 사주었다. 그 옷이 그녀의 수의가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용산역, 그는 서울역에서 온양으로
갔다. 장병천의 어머니는 아들 발인제 때 돈을 태워 비명에 간 두 사람의
한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취재후기
한해 쌀 7만섬 이상 수확했던 전국적 부호 장길상의 일제 때 아흔아홉
칸 대저택은 현재 동산호텔(현 엘디스리젠트 호텔)과 동산맨션 자리로 변했
다. 남산동 51의 1천600평 집은 솟을대문과 중문, 안채, 바깥채, 사랑채,
뒤란의 대숲, 정자를 세운 연지(蓮池)까지 갖춰 고건축학적 가치가 있어 보
존이 추진됐지만 문화재관리법이 제정되지 않아 무산되고 말았다. 장길상은
대구 첫 은행격인 경일은행을 만들었고 청산리 장남이 죽은 지 2년만에 문
을 닫는다. 그의 둘째 동생은 광복직후 초대 수도청장을 역임한 장택상(張
澤相)이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