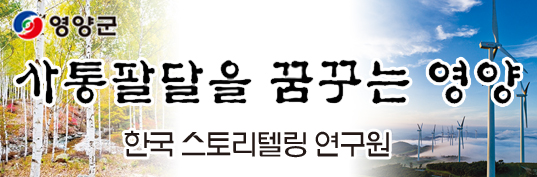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끝을 예측하기 힘든 불황이 이어지면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실리추구를 위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에는 롯데시네마가 아닌 CJ그룹의 CGV가 자리 잡고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
“정보는 국경도 모르고, 돈은 조국도 모른다.”
현대경영학을 창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피터 드러커의 말이다. 이 말은 실리를 위해 ‘적과의 동침’에 나선 기업들의 행태에 적용하면 그 뜻이 선명해진다. 조국도 뛰어넘는 것이 ‘돈’인데,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실리를 위해 경쟁기업과 손잡는 것이 하등 이상할 리 없다.
기업의 ‘적과의 동침’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지기도 하고,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실리 추구를 위해서는 간혹 위장이혼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한 경품 행사에 참여해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10장을 받은 오세현씨(28·대구시 동구 봉무동)는 지난달 27일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을 찾았다. 이곳에 극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오씨는 영화를 한 턱 쏘겠다며 지인 8명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그는 이날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롯데가 운영하는 아울렛이지만 이곳에 입점해 있는 극장은 CJ그룹의 CGV였기 때문. 그는 몇 번이고 영화관 상호를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CGV였다.
오씨는 “롯데에서 운영하는 아울렛이니까 당연히 같은 그룹계열사인 롯데시네마가 입점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허탈해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3년 대구에 첫발을 내디딘 롯데백화점 대구점, 롯데마트와 아울렛이 함께 있는 대구율하점에 롯데시네마가 입점해 있듯이 당연히 그곳 역시 그러리라고 짐작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롯데시네마가 들어갔겠지만, 앞서 대구에 롯데시네마가 많이 들어선 상황이어서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CGV가 입점하게 됐고, 최근에는 극장영업이 꽤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CGV를 찾은 관람객이 롯데아울렛에서 쇼핑을 한다면 롯데가 돈을 벌도록 CJ가 도와주는 셈이 되고, 그 반대가 되면 롯데가 CGV에게 관객을 모아주는 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홈플러스 1호점인 대구시 북구 칠성동 홈플러스 대구점. 이곳 1층에 자리잡은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2층에 있는 패밀리레스토랑은 애슐리다. 애슐리는 동아백화점과 NC아울렛을 가지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회사다. 홈플러스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식업체를 자사에 입점시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홈플러스 대구점에는 롯데리아가 아닌 맥도날드가 있었다.
대구에는 9개의 홈플러스가 있다. 이 중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마트나 아울렛을 가진 롯데와 이랜드 그룹의 회사에 공간을 내주며 적과 동침을 하는 곳은 6곳. 전체의 66%에 이른다.
롯데리아와 애슐리 모두에 자리를 내준 홈플러스는 대구점, 칠곡점, 상인점, 동촌점 등 4곳, 내당점은 롯데리아에만 공간을 내줬다. 칠곡점에는 롯데리아와 유니클로가 들어와 있다. 지난 5월 칠곡점에 입점한 유니클로는 롯데 브랜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유니클로는 롯데백화점이나 영플라자 등에만 있었는데 중저가이면서도 브랜드 콘셉트가 우리와 맞다고 생각해 유치했다. 롯데뿐만 아니라 경쟁업체인 이랜드 계열의 뉴발란스, 헌트 키즈 등도 입점해 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계열사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럴 경우 실리 추구를 위해 적과 손잡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이 적과의 동침에 나섰다면 롯데는 기업 이익을 위해 위장이혼에 나서기도 했다. 롯데마트 대구율하점에 있던 완구전문매장 ‘토이저러스’를 독립매장으로 분리한 것. 대형마트는 관련법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휴무해야 해 토이저러스도 함께 문을 닫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분리에 나선 것이다. 롯데 측은 마트 매장 내가 아닌 다른 층에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사업가 부부의 모습을 떠올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이익이 생긴다면 이를 마다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이 벌이는 적과의 동침이 불경기 탓도 있겠지만 수익극대화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 인터뷰] 영남일보 찾은 김문수, 3분안에 숏터뷰](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16.85b0360d5915419cad03beef68880ca5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