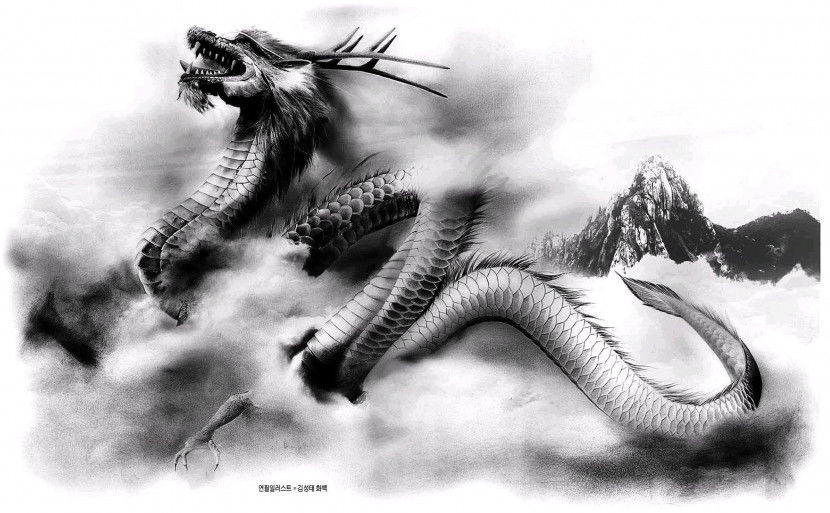 |
아득한 옛날부터 의성에는 용이 많이 있었다. 용이 살았던 흔적은 용소, 용 절, 용문, 용바위, 용마 등의 이름과 전설로 남았다. 의성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용은 경북팔경의 하나인 빙계계곡의 용이다.
원래 이 계곡에는 거대한 못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못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물길이 없어서 고인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이때 계곡 뒷산 큰 절에 있던 힘 센 장수(또는 부처)와 못에 살던 용이 만나 물길을 어떻게 낼 것인가를 가지고 의논하게 되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각자 힘껏 물길을 내되 빨리 내는 사람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했다.
용은 몸을 힘차게 움직이고 꼬리를 쳐서 서쪽 산맥을 끊기 시작했고 장수는 쇠스랑으로 북쪽 산맥을 끊기 시작했다. 용호상박, 아니 용장상박(龍將相搏)의 대결이 펼쳐지며 산천이 뻐개지고 바위가 날았다. 용은 먼저 서쪽으로 물길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는 바람에 중간에 큰 소가 만들어졌으니 이곳에 용소(龍沼) 혹은 용추(龍湫)라는 이름이 붙었다.
장수는 쇠스랑으로 산맥을 너무 급히 찍다가 자루가 부러지는 바람에 물길을 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용에게 지고 말았다. 북쪽 능선에는 장수가 쇠스랑으로 찍은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를 ‘부처막(佛頂)’으로 부르고 있으며 그때 깨어진 돌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런데 ‘부처막’에서 부처를 상정하기보다는 힘 센 장수였다고 보는 게 신빙성이 더 놓은 것이 의성 지방에는 유사 이래 힘 센 장수가 출현한 흔적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안사면 만이골 깊은 산중에도 아기 장수가 태어났다는 전설이 있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모습이 비범하고 기골이 장대하며 성장 속도가 무척 빨랐다.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다. 아기가 장차 역적이 될 게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가난하고 무지한데다 어리석은 부모는 후환을 두려워하여 아기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 중 힘깨나 쓰는 사람들 몇에게 아기를 맡겼고 그들은 서쪽 준령의 계곡에 아기 장수를 산 채로 엎어 두고 그 위에 거대한 소나무 나뭇짐을 덮어 눌러버린 채 내려왔다.
사흘이 지나도록 아기 장수를 덮어 놓은 나뭇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뇌성벽력이 일고 용마가 크게 울음을 터트리면서 장수가 탈 안장을 던지고 그 위를 날아가 버렸다.
비슷한 이야기는 또 있다. 단밀면 낙정리 나루터에서 2백미터쯤 상류에 위치한 용바위(龍岩)에 얽힌 전설이다. 낙정에 윤 씨 성을 가진 역졸이 있었는데 어느날 긴요한 공문서를 2백 리 가량 떨어진 유곡역에 전달하게 되엇다.
윤 씨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모래밭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아이에게 문서를 들려 보냈다. 아이는 발이 얼마나 빨랐던지 오후가 되자 벌써 돌아와 모래밭에서 다시 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이때부터 오히려 근심에 사로잡혔다. 보잘 것 없는 신분,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비범한 아이는 역모를 꾸밀 것이라는 미신이 횡행하던 시절이었다. 게다가 잠자던 아들의 겨드랑이에 돋은 날개까지 보게 되었다. 아버지는 굳게 결심하고 아들이 잠든 사이에 동아줄로 묶고는 죽이려고 했다.
이때 하늘에 빛나던 별들이 사라지면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울리면서 소낙비가 쏟아졌다. 이와 때를 맞추어서 용바위 아래 낙동강의 소에서 크나큰 용마가 나오더니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미친 듯 달려가 버렸다. 아이가 자라서 타고 다닐 용마였다.
단북면 소재지 앞 쪽 들판에 도로를 끼고 커다란 못이 있는데 이름은 연지(硯池)다. 옛날 옛적 이 못의 자리에는 민가가 있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몸집이 아주 컸고 골상이 비범한 데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문이 퍼졌고 부모가 아들을 없앨 결심을 하게 되었다.
다른 곳과 다른 점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집이 흔적 없이 파여 커다란 못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벼락못(雷池)이라 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벼루못(硯池)이라 바뀌었다고 한다. 인근에서 용마가 버리고 간 안장을 주워다가 신당을 지었는데 영험이 많아서 제사를 정성들여 지낸다고 한다.
마지막 이야기는 훨씬 더 구체적이다. 사곡 땅에 자식이 없는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길손이 충고하는 대로 산중의 고목을 신주처럼 받들고 백일동안 기도하여 옥동자를 얻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생후 사흘째부터 말을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게 범상치 않은 풍모를 보였다.
한 해가 지난 어느날, 부부는 한창 모내기에 바쁘고 아이는 논둑에서 놀고 있었는데 한 장군이 말을 타고 긴 칼을 휘두르며 달려와서 다짜고짜로 이들에게, "지금까지 심은 모의 포기 수를 알아내고 만약 모른다면 이 칼로 세 사람의 목을 벨 것이다"라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공포에 질린 부모를 대신해 앞에 나선 아이는 "장군이 타고 온 말이 여태껏 몇 번이나 발굽을 내딛었는지 알아맞추면 나도 모의 포기수를 말씀드리겠소"라고 했다. 장군은 안색이 싹 변하더니 "두고 보자" 란 말을 남기고 사라져 갔다.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어느날 아기는 어머니에게 콩알 백 개를 볶아달라고 부탁했다. 어머니가 콩을 볶다 무심결에 한 개를 그만 먹어버리는 바람에 99개의 콩만 주자 아이는 슬픈 얼굴로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목을 잘라서 명주 수건에 싸서 남쪽으로 가다가 첫째 못에 버리십시오. 누가 내 목을 찾더라도 절대로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하고 방문을 열었다.
난데없이 화살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아이는 콩을 던져서 화살을 막기 시작했다. 아흔아홉 번은 막아냈지만 백 번째 콩이 없어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다. 어머니는 슬프고 경황없는 가운데서도 아들의 당부를 생각하여 목을 남쪽 못에 가져다 넣었다.
막 돌아서는데 갑자기 지난날의 장군이 달려와 아들의 목을 내어 놓으라고 위협했다. 어머니는 두려움에 혼이 나가 그만 사실대로 가르쳐 주고 말았다. 장군이 못 둑에 있는 수양버들 세 개를 따서 못 위에 던지자 물이 갈라졌다.
못 가운데는 갑옷 입은 장수가 일어나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장군은 한 칼에 장수의 목을 치고 말았다. 이 못을 일컬어서 ‘신주(神主)못’이라고 한다.
나는 아기장수들이 비명에 죽어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부모가 그런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목을 흐린 뒤 아기 장수를 어디론가 탈출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춘산면 대사리에 오장군(吳將軍) 묘가 있는 것이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온 오장군은 어릴 적부터 나막신을 신고서도 절벽을 오르내리는 절세의 용력을 자랑했으며 복경산에서는 큰 바위를 조약돌처럼 던져서 도적떼를 전멸시켰다. 그 때의 큰 바위는 아직도 마을 앞들 가운데 있다.
또한 비안면 남쪽 두모강변 두모동에는 두모라는 장수가 나타났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천하장사여서 그가 거동하면 바위에 손자국, 발자국이 남았다고 한다. 두모장군은 동구의 중앙에 거처하면서 이 동네를 수호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마을 높은 곳에서 바위문이 있고 그 바로 옆에는 장군이 밥을 지어 먹던 흔적도 볼 수가 있다.
무슨 혁혁한 명예도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도 없이 스스로와 마을 공동체, 삶의 터전을 도적과 재앙으로부터 지키며 살다 간 무명의 장수, 장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이 아닐까.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리라.
성석제<소설가>

김기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