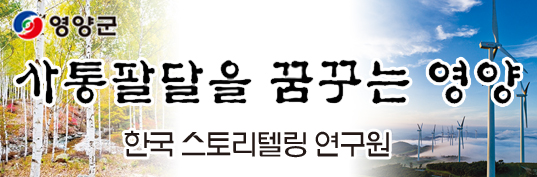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이 대표가 자신이 사용하던 스튜디오 추억 앞에서 웃음을 한 모금 머금는다. |
사람은 누구나 '변방의식'에 침잠할 때가 있다. 잘나가던 시절이 저무는 징조이기도 하고 터널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변곡점이기도 하다. 무기력이거나 매너리즘이거나 혹은 골몰의 시간이 몰려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게 어디로 기울 건지는 속단할 수 없다. 조바심과 성찰 속에서도 뭔가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모티프가 가슴에 고여있다면 그 열망이 무슨 국면을 반드시 끌고 온다. 밥이 되든 죽이 되든 간에.
충무로서 1년간 광고사진 동향 익혀
칠곡서 지방 최대규모 스튜디오 오픈
한강이남서 꽤 잘나가는 광고사진가
中 시장 잠식…작가의 꿈 다시 생각
제2의 삶 돌파구 공간 '갤러리 안나'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로
◆사진이란 오랜 대륙
그는 '사진'이란 대륙을 오래 탐험해 왔다. 그가 만진 사진은 작품이라기보다 하나의 '상품' 같은 것이었다. 디자인 감각이 무척 많이 스며들었다. 절묘한 모양의 각도, 기막힌 색의 황금분할…. 그 기준과 원칙의 근육을 키우며 절정의 그림을 얻어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사실 그건 그의 것이 아니라 주문자의 몫이었다. 그가 찍고 싶은 것을 찍을 수가 없었다. 클라이언트의 주문이 '지상명령'이었다. 그는 그 명령의 그림자 위에 앉아서 새벽녘까지 사진을 찍었다. 밤의 조도를 점차 잊어만 갔다. 어쩜 그 사진은 '반쪽 완성품'인지도 모른다.
먹고 사는 일은 숭고했다. 그 일로 가족을 먹여 살리면 그는 '프로'이다. 그럼 프로 중 프로는 누굴까? 그건 당연히 작가(Artist)다. 자신도 작가라 우기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주문생산한 그 사진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었다. 반대진영에 있는, 종일 작품에만 올인 하는 사진 혁명가들은 그가 가진 능숙한 감각을 '상업적'이라 이유로 폄훼하기 일쑤였다.
아무튼, 그는 한강 이남에선 꽤 잘 나가는 광고사진가였다. 어찌 된 셈인지 한국에서는 '광고'라는 단어가 따라붙으면 그 길을 걷는 이들은 늘 '미완의 작가'로 분류돼 버린다. 그럴 때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태어나 1976년 영국 런던에 정착해 패션사진의 신지평을 열었던 마리오 테스티노 같은 존재를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였다.
 |
| 2017년 포토갤러리 안나를 오픈한 사진가 이만호. 그가 자신의 작품인 '잡초에 대한 연민'을 배경으로 무심하게 앉아 있다. |
◆중앙대 사진학과 졸업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그때만 해도 사진작가로 삶을 마감할 듯했다. 작가를 꿈꾸었다. 그 무렵 다큐멘터리 사진에 푹 빠지게 된다. 풍경보다는 일상성이 피처럼 살아있는 현장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기념사진 속에 등장하는 그렇고 그런, 뭐랄까, '민방위 교육용' 같은 인물이 아니라 경계의 수위를 벗어난 도심의 사각지대에 피사체로 다가오는 이들을 노렸다. 동성로 뒷골목은 나의 사냥터였다. 일상과 초월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춘의 실루엣을 낱낱이 포착해 나갔다. 그게 'in my memory'란 이름으로 졸업작품전에서 노출된다.
졸업 즈음, 다들 불안했다. 길 위의 삶, 아니면 길 밖의 인생. 둘을 저울질하며 그의 20대는 절충의 시간에 빠져든다. 초월보다 현실의 욕망이 한 수 위였다. 사진과 선배들의 행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진이 운명이면 그 길이 죽음이라도 그냥 묵묵히 간다. 하지만 이승에서 단련된 근육만으로는 현실의 불안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사회초년생이 되어간다. 선배들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계 사진기자가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대다수 광고기획사 등으로 내몰린다. 그래도 혈기는 있어 '나만은 순수 혈통의 작가로 남아 보자'고 다짐한다. 동성로에서 '워크숍'이란 복합문화공간 같은 카페를 오픈한다. 사장이 된 것이다. 공연과 전시가 잦았다.
'직장'이란 참 대단하다. 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무지막지하게 내동댕이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도 처음에는 나름 아방가르드 한 카페를 오픈한 것으로 많이 위안을 했다. 속으로 '일단 문화공간이잖아'라면서 틈이 나면 좋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겠노라고 다짐했다. 맘처럼 굴러가지 않았다. 갈수록 사진 찍을 시간이 폭감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절충한 일이 바로 광고사진.
일단 서울 충무로에서 1년간 광고사진 업계의 동향을 익혔다. 그리고 대구로 와서 1990년 경북대병원 근처에 '포토제닉'이란 사진 스튜디오를 오픈한다. 당시 지역에는 서진, 거송 등 굵직한 광고기획사가 포진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사진의 창의성보다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이 승부처였다. 창작열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비슷비슷한 마케팅, 비슷한 접근의 사진라인들. 설상가상 시장도 영세했다. 그만큼 밥벌이는 더 어려웠다.
 |
| 흑백 톤의 표정, 컬러 톤에서 능숙하고 노회한 색을 다 빼고 싶어 한다. |
◆섬유사진의 신지평
그는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고 싶었다. 대구가 섬유도시이니 섬유 관련 광고사진을 특화한다. 2000년 탈도심, 칠곡 동명에서 '스튜디오 2000'을 오픈한다. 전원 스튜디오의 신지평이었다.
바야흐로 디지털 세상. 촬영 시스템을 온라인 모드로 전환했다. 서울로 가서 잘나가는 스튜디오를 벤치마킹했다. 더욱 첨단적이고 모던한 CF촬영 장비를 대거 매입해 나갔다. 수천만 원의 독일 카메라, 원격조정 되는 최첨단 조명시스템까지. 모르긴 해도 지방에서는 최대 규모였다. 서울 못지않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몇 년 못 가 새로운 버전의 카메라가 등장했다. 안 질세라 그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해야만 했다. 번 돈이 신모델 구입비로 다 나가게 생겼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중국 시장이 한반도를 압도하기 시작한다. 지방 광고주도 고사상태. 돈은 서울·경기권에서만 맴돈다. 일상이 너무 힘들었다.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에 혼자 앉아 넋을 잃고 지난 추억의 시간 속으로 자맥질을 했다. '그래, 작가 이만호를 꿈꾸었지'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아내한테도 미안함 맘이 들었다. 그녀를 위해, 그리고 나의 제2의 삶을 위해, 둘에게 도움이 되는 돌파구 공간이 필요했다. 그 고민의 결과가 2017년 꽃처럼 피어난다. 바로 '갤러리 안나(아내의 세례명)'.
동명에 있던 스튜디오는 현재 자리로 신축 이전을 한다. 거기서 2016년까지 스튜디오를 운영했다. 하지만 그 갤러리가 오픈되면서 26년간 지속된 광고기획사도 미련 없이 정리해버린다. '자발적 파산'이랄까. 그랬다. 새로운 이만호만의 창세기(?)를 그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향후 개인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나는 진정 무엇을 찍고 싶어 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 사진책도 멀리한 채 그냥 사색하고 성찰하고 독서를 하고 산책을 한다. 의도되지 않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사진을 원하는데 아직 그게 뭔지 모른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클릭을 조정해 가며 내가 원하는 물성을 인위적으로 분재용 가지를 맘대로 절단하듯 그렇게 가공된 그럴듯한 사진을 건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저절로 봄이 오듯 자기 맘의 행로를 반추하고만 있다. 그게 잘되면 전시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평생 못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지금 생각. 가식과 거짓에 자기 열정을 섞기 싫다는 경고로 들렸다.
글·사진=이춘호 전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찬탄파 반탄파 분당 가능성?](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29.dfce1e66f6774371bc2ae25a5d9b7a34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