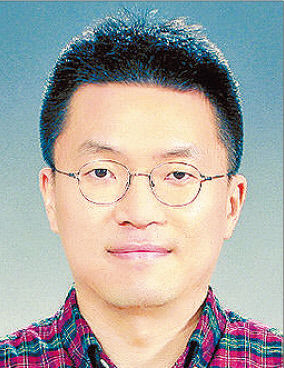 |
| 김언동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 교사〉 |
스팀(STEAM) 교육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골드버그 장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생김새나 작동원리는 아주 복잡하고 거창한데 하는 일은 사실 너무 단순하고 재미만을 추구하는 장치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기계를 뜻하지요. 미국의 만화가 루브 골드버그가 그린 만화 속 기계 장치들에서 고안되었습니다. 만화가적 상상력이 대폭발하는 기계로, 얼핏 보면 진짜로 작동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에 대해서 다양한 상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각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널리 아는 '톰과 제리' '백 투 더 퓨처' 같은 만화, 영화나 상업 광고에도 골드버그 장치가 등장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작한 '매우 비효율적이지만 재미있는 장치'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낀 수많은 과학자, 공학자, 일반인들은 저마다의 골드버그 장치를 실제로 만들며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게 공을 굴릴지, 어떻게 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구슬을 움직일지 따위를 궁리합니다. 급기야 과천과학관 같은 기관에서는 쉬운 일을 얼마나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골드버그 대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향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골드버그 장치가 보여주는 '비효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월 초에 저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였는데요. 저는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머릿속에 '회색 지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정지우는 책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에서 '문해력 또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 뇌가 그럴 용기를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적으로 계속 자기 이해, 자기 입장에 익숙한 방식에만 길들여져서 그것에 갇혀버리는 폐쇄성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 '흰색'이라면 나와 다른 생각은 무조건 '검정색'이 되는 일은 교실에서도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나와 친구가 의견이 다르면 그 '간격'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간격'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인문학의 시작일 것입니다.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무수히 많은 '회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가치 있고 분명하다면 더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이미 인문학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남형도 기자의 책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기자의 체헐리즘'을 소개했습니다. '애 없는 남자의 육아 체험' '집배원과 소방관 하루 체험' '폐지 수집 동행' '유기견 봉사'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느낀 내용을 쓴 에세이입니다.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자존감, 번아웃, 성격 등 개인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그의 말과 행동이 바로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느리지만 그 과정에서 관습을 깬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골드버그 장치에서 인문학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을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다양한 회색 컬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비효율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에 매력을 느낀 수많은 과학자, 공학자, 일반인들은 저마다의 골드버그 장치를 실제로 만들며 어떻게 하면 더 복잡하게 공을 굴릴지, 어떻게 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구슬을 움직일지 따위를 궁리합니다. 급기야 과천과학관 같은 기관에서는 쉬운 일을 얼마나 더 복잡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겨루는 '골드버그 대회'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향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골드버그 장치가 보여주는 '비효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9월 초에 저는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였는데요. 저는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가 머릿속에 '회색 지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작가 정지우는 책 '내가 잘못 산다고 말하는 세상에게'에서 '문해력 또는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타인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 뇌가 그럴 용기를 학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적으로 계속 자기 이해, 자기 입장에 익숙한 방식에만 길들여져서 그것에 갇혀버리는 폐쇄성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이 '흰색'이라면 나와 다른 생각은 무조건 '검정색'이 되는 일은 교실에서도 벌어집니다. 학생들은 나와 친구가 의견이 다르면 그 '간격'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간격'을 인정하고 그 차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인문학의 시작일 것입니다. 흰색과 검정색 사이에 무수히 많은 '회색'이 존재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인문학을 공부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가 가치 있고 분명하다면 더 좋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이미 인문학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로 남형도 기자의 책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남기자의 체헐리즘'을 소개했습니다. '애 없는 남자의 육아 체험' '집배원과 소방관 하루 체험' '폐지 수집 동행' '유기견 봉사'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직접 체험하고 그 속에서 느낀 내용을 쓴 에세이입니다.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자존감, 번아웃, 성격 등 개인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는 그의 말과 행동이 바로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모습입니다.
느리지만 그 과정에서 관습을 깬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골드버그 장치에서 인문학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을 흰색과 검정색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다양한 회색 컬러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의 비효율과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김언동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 교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2/news-m.v1.20251215.bfdbbf3c03f847d0822c6dcb53c54e24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