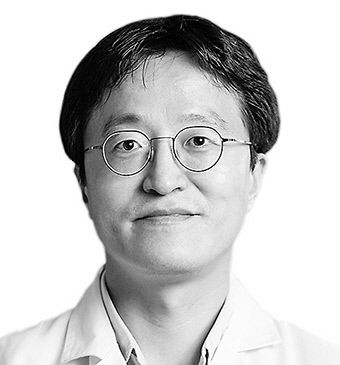 |
|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
물은 지구 표면의 약 75%를 덮고 있지만, 부피비로는 대략 0.15%에 불과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전체 물의 0.26%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만들면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될 때는 97%가 물이고, 나머지 3%는 단백질이다. 신생아는 약 75%, 청소년 60%, 노인 50%로 나이가 들수록 신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적절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줘야 신체활동이 원활하고, 노화도 늦춰질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 지구의 인구는 20억명이 증가하여 80억명을 넘어섰다. 즉 지구의 물은 제한적인데 반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이 매우 절박할 정도로 부족해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수가 판매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였으며, 외국 선수단에게 식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일시적 허용이었다. 1994년 법적으로 생수 시장이 열린 것은 업체들의 지속적 소송 제기 끝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오랫동안 물은 무한히 많은 자원이며, 누구나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재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식수원이 낙동강 페놀 오염과 같은 다수의 치명적인 사고 등으로 불신을 유발하면서, 안전한 식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덕분에 물을 끓여 마시던 모습에서, 생수를 구매해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통해 걸러진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즉 물에 경제재의 성격이 입혀진 것이다.
사실 깨끗한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한 식수로서의 필요성에 더해 농업, 보건, 산업에서 절대적 요소이다. 온대 기후 지역에 속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며, 산지가 70%이며, 대부분 수목으로 구성되어 물 자원의 유지에 비교적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프리카의 국가는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 어려워 농산물 생산에도 큰 차질을 겪고 있다. 비위생적인 물을 식수로 쓰는 일이 빈번하여 이질과 콜레라로 어린이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또한 겪었지만, 경제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둔 산업, 광업, 농업 활동은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여 안전한 식수 부족을 더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진국이 물에 대한 윤리 인식이 부족한 시절에 단순 자유재로 생각하고 경제 논리에만 맞추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물은 초기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물의 존재는 생명의 기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물은 생명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자유와 존엄, 인권을 행사하는 모든 것에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과 물이 풍부한 국가들의 상당수에서 물의 낭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기후 문제와 연계되어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는 지구 생명 유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에너지의 불안정적인 공급이 지난 몇 개월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지만, 물 부족은 즉각적으로 생명 활동 유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더불어 식품과 물 사용에 의존하는 수많은 상품 가격의 상승을 촉발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도체조차도 국내 공업용수의 약 13%를 소비한다.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식수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촉진할 것이다. 물이 통제되는 세상이 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하다. 물 문제는 인간 존엄에 대한 윤리 교육과 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