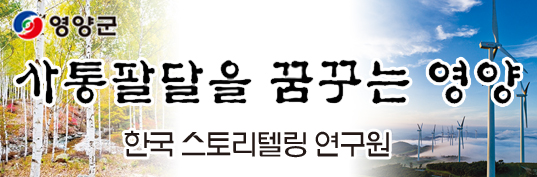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김살로메 소설가 |
태풍 '힌남노'가 휩쓸고 간 지 20여 일이 지났다. 겉으론 어느 정도 안정되어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눈길을 돌려도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최대 피해지인 이곳 포항도 예외가 아니다. 불보다 빠르고, 바람보다 날랜 공격수가 물이란 것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나날이다.
맘이 아파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현장은 잘도 보인다. 독서회 가는 길에 만나는 포스코의 울타리는 무너진 철책만이 그때의 다급했던 순간을 말해준다. 아름드리 꽃나무로 단정한 품새를 자랑했던 담장이었다. 주요 시설부터 점검해야 하니, 부대 시설까지 손길이 미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실개천 주변 현장에서는 굴착기와 집게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전국의 중장비는 다 모인 듯, 쓸려간 바닥을 다독이고 둔치를 정비한다.
저지대 주택가 골목마다 물에 젖은 가재도구와 생활 쓰레기가 산을 이뤘다. "어르신, 그건 다 망가져서 가져가셔도 소용없어요." 풀썩이는 쓰레기 더미를 헤치는 노인을 달래는 봉사자의 목소리에 다정 섞인 연민이 묻어난다. 마을의 마트도 문을 닫았다. 진흙 묻은 생수병 무더기만이 문밖을 지킬 뿐이다. 치킨집도 문을 열었다지만 휑하기만 하다. 간이의자에 걸터앉은, 주인인지 객인지 모를 중년 남자의 실루엣에 그늘이 먼저 읽힌다. 빵집은 용케 문을 열었다. 새벽, 허리만큼 차오른 물을 피해 주인은 몸만 겨우 빠져나왔단다. 군인과 봉사자 등 50여 명이 나서서 망가진 가재도구와 물 묻은 집기를 치워주고 닦아 주고 갔단다.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동안 가까운 사람들의 손길이 한몫했다며 고마워한다.
속에서 뭔가 끓어오른다. 결국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계급 문제가 뚜렷이 각인되고, 평등에 관한 숙제도 떠오른다. 피해에 취약한 조건까지를 고려해주지 않으니 하늘은 매정하다 치자. 하지만 하늘의 뜻과 상관없이 상념이 꼬리를 문다. 왜 해마다 지옥 같은 현실이 되풀이되어야 하나. 자연재해에 인재가 더해지는 속수무책 앞에서, 왜 피해자는 항상 물리적·경제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어야 하나. 여태껏 가진 자들이 수해를 입었다거나, 힘 있는 자들이 화마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진 못했다. 나아가 필요한 도움의 연대 앞에서 발 벗고 나서는 이들 또한 왜 말 없고 성실한 사람들이어야 하나.
'피해 입은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게 최선을 다하겠다.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은 책임져야 할 이들이 일착으로 내놓는 단골 멘트다. 지키지 못할 저런 말들은 위로를 말할수록 덜 위로받고 있음을 확인해 줄 뿐이다. 필요한 건 현실적인 대안과 실천 방안이건만, 개선되는 속도는 느리고 느리다. 속만 터지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만다. 자본주의 체제가 강화될수록 기후는 난삽해지고 환경은 파괴될 것이다. 그 이익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작동되는 한, 취약계층은 영구히 재난 대책의 빠질 수 없는 일 순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껍데기뿐인 정쟁(政爭)보다 아직은 시린 정경에 눈길이 머물 때! 그들의 가식과 거짓이 횡행하는 동안, 아프고 힘없는 사람끼리 보듬느라 수해 현장은 여념이 없다. 연민의 연대에 익숙한 착한 사람들, 오늘도 삽자루와 대빗자루를 들고 덜 마른 골목을 누비거나, 지하 주차장의 진흙을 치우려 든다. 누군가 가지런히 세워놓은 음료수 유리병 위로 흔들리듯 노을이 내려앉는다.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진다.
김살로메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