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국 송나라 휘종의 '청금도(聽琴圖)' 중 인물 부분. 휘종 자신이 칠현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중국 역대 왕들 중에는 칠현금 연주를 즐긴 이들이 적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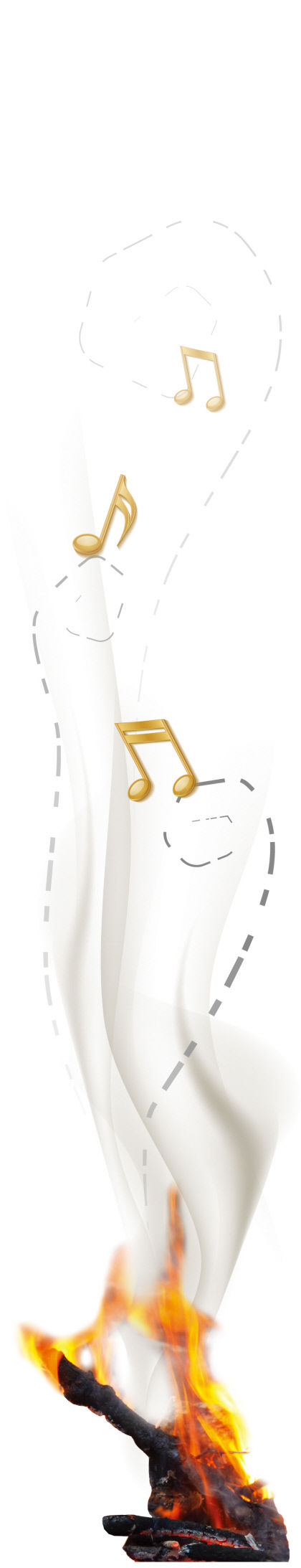 |
크고 비감한 소리로 듣는 이들 눈물
요량 음색에 빠진 초장왕이 국사 잊자
왕비 간언으로 철퇴 내리쳐 부숴버려
거문고 대명사 된 사마상여의 녹기
조선 이매창이 지은 詩서 언급되기도
사마상여의 거문고 '녹기'는 후세 시인들이 시를 지을 때 거문고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애용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백은 '촉에서 온 준 스님의 금 연주를 듣고(聽蜀僧浚彈琴)'에서 거문고(칠현금)를 '녹기'로 표현했다.
'촉 땅의 한 스님 녹기(거문고)를 안고(蜀僧抱綠綺)/ 서쪽에서 내려와 아미산에 이르렀네(西下峨嵋峰)/ 손 놀려 나를 위해 한 곡을 연주하니(爲我一揮手)/ 온 산의 소나무 소리 듣는 것 같네(如聽萬壑松)/ 나그네 마음 흐르는 물에 씻기는 듯하고(客心洗流水)/ 남아있는 거문고 소리 종소리에 스며드네(餘響入霜鐘)/ 어느새 푸른 산은 황혼에 물들고(不覺碧山暮)/ 가을 구름 어둑어둑 첩첩이 끼어있네(秋雲暗幾重)'.
사마상여가 촉나라 사람이었고, 시 속에서 거문고를 연주하는 이가 또한 촉나라 승려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거문고를 '녹기(綠綺)'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거문고를 '녹기'로 표현한 시들이 많다. 우리나라 시인들도 마찬가지다. 거문고를 너무 좋아해 자신이 애용하던 거문고와 함께 무덤에 묻힌 조선시대 기생 시인 이매창이 봄날의 그리움을 읊은 시 '춘사(春思)'이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삼월(東風三月時)/ 곳곳에서 꽃잎 져 흩날리네(處處落花飛)/ 거문고(녹기) 뜯으며 상사곡 불러 봐도(緣綺相思曲)/ 강남으로 떠난 임은 돌아오지 않네(江南人未歸)'.
'고금(古琴)' 또는 '칠현금(七絃琴)'이라고 불리는 금(琴)은 중국의 대표적 전통 현악기이다. 칠현금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고, 여러 명금(名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다. 명금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도 함께 전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명금이 사마상여의 '녹기'를 비롯해 제환공의 '호종(號鐘)', 초장왕의 '요량(繞梁)', 채옹의 '초미(焦尾)'이다. '사대명금(四大名琴)'으로 불리는 칠현금이다.
◆제환공의 호종(號鐘)
'호종(號鐘)'은 주(周)나라 때의 명금이다. 금의 소리가 커서 종소리 같고 호각을 부는 것같이 사람의 귀를 진동시켰다고 한다. 고대의 걸출한 금 연주가로, '지음(知音)'이라는 말이 유래한 고사의 주인공인 백아(伯牙)가 호종을 연주해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세월이 흐른 뒤 호종은 춘추시대 제(齊)나라 임금인 제환공(齊桓公)의 손에 들어왔다. 제환공은 제나라의 유명한 군주였고, 음률에도 능통했다. 당시 그는 많은 명금을 소장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호종을 가장 아꼈다고 한다. 그는 부하들에게 우각(牛角)을 불고 노래를 부르게 시키면서, 자신은 호종을 연주했다고 한다. 그러면 우각의 소리도 처절하고, 호종의 소리도 비감하여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초장왕의 요량(繞梁)
'여음요량 삼일부절(餘音繞梁 三日不絶)'이라는 말이 있다. '열자(列子)'에 나오는 한 이야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주나라 때 한국(韓國)의 유명한 여가수인 한아(韓娥)가 제나라로 갔는데, 옹문(雍門)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됐다. 마침 식량이 떨어지자 노래를 불러 음식을 구했다. 그녀의 처량한 목소리는 공중을 맴돌았는데, 외로운 기러기가 길게 우는 것과 같았다. 한아가 떠난 지 3일이 된 후에도 그녀의 노랫소리는 여전히 집의 대들보 사이를 맴돌고 있었고(요량은 대들보를 맴돈다는 의미),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요량(繞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음(餘音)이 특별히 길었던 모양이다. 요량은 화원(華元)이라는 사람이 초장왕(楚莊王)에게 바친 예물인데, 초장왕에게 바치면서 '요량'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초장왕은 요량을 얻은 이후에 하루 종일 연주했고, 음악에 도취되어 살았다고 한다.
한번은 초장왕이 요량에 빠져 연속 7일간 조회를 보지 않고, 국사는 모두 내팽개쳤다. 왕비인 번희는 걱정이 되어 초장왕에게 권했다. "왕이시여 너무 음악에 빠져 계십니다. 과거에 하나라의 걸왕이 '말희의 거문고(末喜之瑟)'에 빠졌다가 살신지화를 당했고, 은나라 주왕은 '미미의 음(靡靡之樂)'을 듣다가 강산사직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군왕이 이처럼 요량의 소리를 좋아하시며 7일이나 조회에 나가지 않으시니, 국가와 목숨을 잃고 싶으신 겁니까?"
초장왕은 이 말을 듣고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사람을 시켜 철여의(鐵如意)라는 철퇴(鐵槌)를 가져오게 한 뒤 금을 내려쳐 부숴버렸다. 요량은 이렇게 사라져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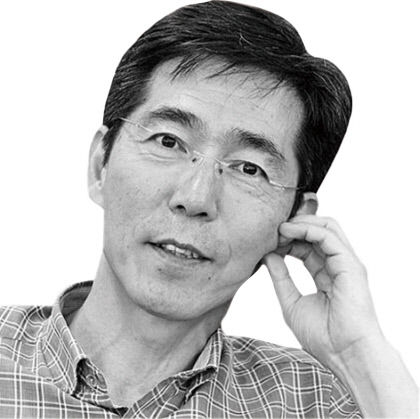 |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초미(焦尾)'는 동한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이고 음악가인 채옹(蔡邕)이 직접 만든 금이다. 채옹은 조조가 스승으로 모신 인물이기도 하다. 채옹은 오나라에 귀양 가 있을 때, 불속에서 아직 타지 않은 부분이 남은 서까래 나무를 발견했다. 소리가 특이한 오동나무였다. 그 오동나무의 형상과 길이에 맞추어 칠현금을 하나 제작했는데, 역시 소리가 비범했다.
이 금의 꼬리부분(尾)에 탄(焦) 자국이 있어 이름을 '초미'라고 했다. '초동(焦桐)'이라고도 불린다. 완성된 거문고는 채옹의 손에 들어가자 기막힌 음조를 발하며 천하의 명금이 됐다. 초미는 귀를 즐겁게 하는 음색과 제작과정의 특이함으로 유명해졌다.
한나라 말기에 채옹이 살해된 후, 초미는 황실의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었다. 300여 년 후, 제명제(齊明帝)가 재위할 때, 금의 고수인 왕중웅(王仲雄)을 데려와서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초미를 꺼내어 연주하게 했다. 왕중웅은 연속 5일간 연주하고, '오뇌곡(懊惱曲)'을 작곡해 명제에게 바쳤다. 그 후 명나라 때가 되어서도 곤산 사람 왕봉년이 초미를 수장하고 있었다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고 있다.
◆사마상여의 녹기(綠綺)
'녹기(綠綺)'는 한(漢)나라의 유명한 문인인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연주하던 금이다. 사마상여를 흠모한 한나라 경제(京帝)의 동생인 양왕(梁王) 유무(劉武)가 사마상여에게 글을 요청하자 상여는 '옥여의부(玉如意賦)'를 지어주었다. 양왕은 매우 흡족해하며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거문고 '녹기'를 그에게 선물했다. 이 명금에는 '동재합정(桐梓合精)'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를 사용해 만든 것이라는 의미다. 사마상여는 '녹기'를 얻은 후 보배처럼 생각했고, 그의 뛰어난 연주 실력에 녹기의 특별한 음색이 더해지면서 명금으로 널리 알려지게 됐다.
사마상여가 갑부의 딸인 미녀 탁문군(卓文君)의 마음을 얻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녹기 덕분이었다. 사마상여는 자신이 탁문군의 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시 '봉구황(鳳求凰)'을 지어 직접 녹기로 연주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직설사설] 안철수에게 물었다. “당대표 출마하실거죠” “이번 대선 패배 이유?”](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6/news-m.v1.20250618.099f3928f85044ba809698a789d0544a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