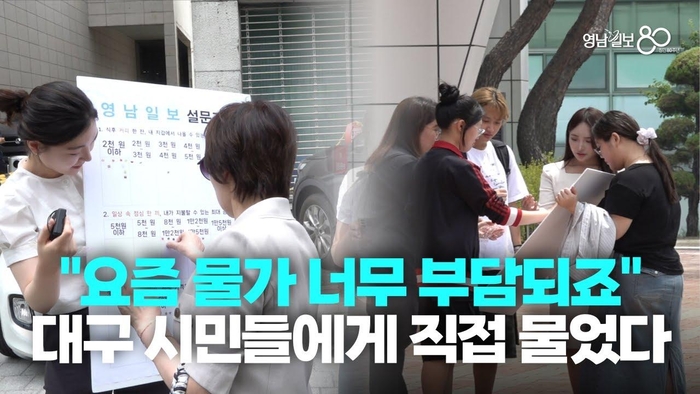|
| 정만진 (소설가) |
'가을의 기도' '눈물' '플라타너스' 등은 고등학교 국어 또는 문학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라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플라타너스'를 읽어본다.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명작이지만 '옥의 티'를 짚으려 한다.
"꿈을 아느냐 네게 물으면/ 플라타너스/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다.//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나/ 플라타너스/ 너는 네게 있는 것으로 그늘을 늘인다.// 먼 길에 오를 제/ 호올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 너는 그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중략)// 나는 너를 지켜 오직 이웃이 되고 싶을 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시에서 '중략' 부분만 간추려 다시 읽어본다.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플라타너스/ 나는 너와 함께 신(神)이 아니다!//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 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이 있느냐?"
시어를 기준으로 할 때 '중략' 부분은 글쓴이의 주제 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중략' 아닌 부분에는 비유와 상징의 언어인 "길"이 핵심어인데, '중략' 부분은 개념어 "신"이 휘어잡고 있다. 그만큼 비문학적이다. 도가(道家)는 문학에 가깝고 신학(神學)은 철학과 닮았듯 "길"은 "신"보다 훨씬 인간과 친하다.
'플라타너스'에 "길"이 나오니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 저절로 떠오른다. "노랗게 물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중략)// 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하리./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않은 길'에는 "신"에 해당되는 시어가 없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가 흔히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라는 제3연이 생략된 채 읽히는 사실을 시인들은 기억해야 하리라.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