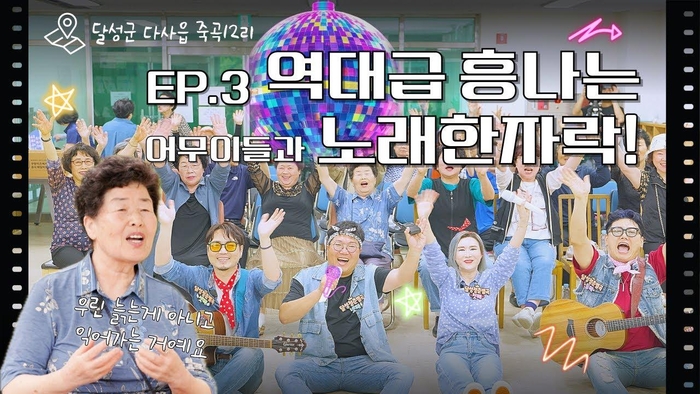|
| 김재권 변호사 |
최근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국토부는 계약갱신요구기간 내에 임차인이 기존 집주인에게 먼저 갱신요구를 했다면 그 집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새 집주인에게도 갱신요구의 효력이 승계돼 새집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년간 더 갱신해 주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국토부는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①매수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이 가능하나 ②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과 퇴거 합의 후 제3자와 실거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토부 유권해석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이 해석대로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인데, 그 사이에 주택 매수인이 매수하여 등기된 시점과 임차인의 갱신 요구 시점의 선후에 따라 갱신요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국토부도 주택매매가 없을 경우, 즉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갱신 요구 했더라도 집주인이 나중에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3조 4항)에 의하면, 주택이 매매되면 종전 임대차가 새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집주인의 갱신 거절권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마땅하다.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다르게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국토부가 새 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법리에 반하는 해석이다. 주택매매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 또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기존 주인에게 갱신요구를 하면 형성권 행사가 되어 새 집주인에게도 갱신요구의 효력이 승계되어 새 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억지 해석을 하고 있다.
이점은 나중에 실제 분쟁사례가 소송으로 비화하게 되면 법원이 판례로 정리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