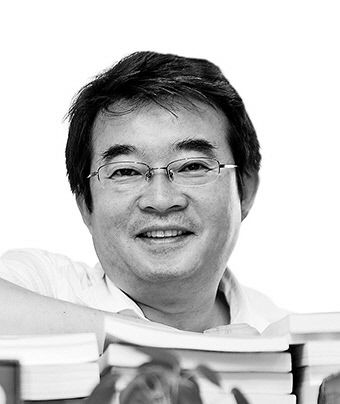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시인 백석은 시 '국수'에서 국수를 "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이라고 표현한다. 꿩 국물과 동치미 국물을 섞어 육수로 쓰고 겨울에 즐겨 먹었다는 이 국수는 요즘 말로 치면 평양냉면이다. 평북 정주 출신의 시인에게 메밀로 만든 이 냉면은 옛적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살뜰하니 친한 것'이었다.
나는 평양의 옥류관과 고려호텔 냉면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다. 꿩이 귀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닭고기 세 가지로 육수를 냈다는 냉면 말이다. 백석은 '슴슴하다'고 말했지만 표준어 규정에는 이 말이 없고, '밍밍하다'는 단어가 평양냉면의 맛에 가장 가까운 말일 것이다.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는 표현도 꽤 어울릴 성싶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맛없음의 맛있음' 때문에 여름이면 은근히 생각나는 게 평양냉면이다. 그럴 때면 나는 영주 풍기의 '서부냉면'이나 '서문가든'을 찾는다. 달지 않은 육수가 그나마 평양냉면 육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에도 여름에 자주 먹는 국수가 있다. 경북 북부지방의 칼국수와 건진국수가 그것이다. 이곳에서는 칼국수를 끓일 때 육수를 따로 만들지 않는다. 멸치도 바지락도 필요 없다. 멀건 맹물에 텃밭의 푸성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게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파와 풋고추를 총총 썰어 넣고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뻑뻑하게 만든 양념간장을 끼얹어 먹는다. 이 지방에서는 이를 양념간장이라고 하지 않고 장물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 장물을 국물에 흥건하게 풀지 않고 칼국수 위에 한 숟가락쯤 끼얹어 먹는다. 그래야 혀에 짠맛이 각기 다르게 닿는다.
건진국수는 이 지방의 아주 특별한 음식이다. 건진국수를 먹으려면 멸치 육수를 미리 끓여 냄비째 식혀야 한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어르신이나 귀한 손님에게 건진국수를 올리려면 아낙네들의 수고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건진국수는 칼국수를 끓인 다음 즉시 찬물에 헹궈 건져내야 한다. 여기서 건진국수라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서늘해진 면을 그릇에 담고 미리 식혀둔 육수를 붓고 애호박볶음이나 오이채를 고명으로 얹으면 건진국수가 완성된다. 이때 식은 조밥과 된장에 찍어 먹을 여름 채소 몇 가지가 옆에 있으면 안성맞춤이다.
벼를 심을 논의 면적이 적은 지방일수록 밭에 콩과 조를 많이 심었다. 칼국수와 건진국수는 경북 북부지방 땅의 특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여름 별미라고 할 수 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는 콩가루를 아끼지 말고 넣어야 한다. 아끼는 데 이력이 난 우리 어머니도 이때만큼은 콩가루 과다 사용자였다. 그래야 밀가루의 미끈거리는 식감이 감소하고 국수가 구수해지면서 툭툭 끊기는 맛이 배가된다. 안동에 건진국수를 파는 음식점이 몇 군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보질 못했다. 여름에는 건진국수 한 그릇 후루룩 들이켜야 더위가 성큼 물러나는데.
또 콩국수를 빼놓을 수 없다. 냉장고가 없어 얼음이 귀하던 시절에도 콩국수를 한 그릇 비우면 배 속이 설원을 들이마신 듯 서늘해졌다. 어느 여름에 대구의 어느 콩국숫집을 따라가서 국수를 넣지 않은 시원한 콩물을 한 그릇 비운 적이 있다. 입가에 묻은 콩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나는 입이 헤헤 벌어진 날이었다. 뜨거운 햇볕이 메밀밭과 콩밭을 아무리 달구어도 우리 곁에는 메밀냉면이 있고, 칼국수가 있고, 건진국수가 있고, 콩국수가 있다.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