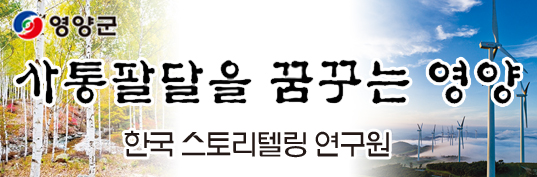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전남대 철학과 교수 |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글에서 한국의 현대 시에 대해 말한 까닭은 나에게는 한류가, 드라마가 아니라, 시를 통해 왔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한국의 시가 나에게 그랬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6·25 전쟁 후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나는 오랫동안 내가 태어난 나라가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개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내가 자기 자신에게 느낀 감정은 부끄러움뿐이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윤동주가 노래했던 그 치욕의 감정은 광복이 된 나라에서 태어난 나에게도 부모가 남긴 빚처럼 상속되었다. 좋은 대학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식민 지배 덕분에 이 나라가 개화되고 근대화되었다고 감지덕지하는 나라에서, 내가 조국이나 겨레에 대해 무슨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혼자 걷지 못해 남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얼빠진 민족이라니. 가끔 이 나라에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과 경탄할 만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긍지 높은 겨레가 합심하여 더불어 이룬 역사가 아니라, 오직 고독한 개인이 지배적 현실에 반역함으로써 이루어낸 결실일 뿐이라고, 오랫동안 나는 생각했다.
그 사이 79년 부산과 마산의 봉기가 있었고 80년 광주의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87년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안타까운 죽음들과 그 죽음을 배웅했던 백만의 함성이 있었다. 유학하던 독일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그 자랑스러운 감정은 아직 한국의 예술과 철학에 대한 정신적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내가 공부하는 서양의 철학과 예술 앞에서 내가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은 한낱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점에서 나는 요즘 사람들 말로 검은 머리 서양인이었던 셈이다.
그런 내게 어느 날 한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찾아왔다. 싫어도 버릴 수 없는 내 나라니까, 보기 싫은 내 나라의 모습에는 내 모습도 섞여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먼 훗날 신이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떳떳이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역사 속에 그래도 내가 긍정하고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유산이 있을까 찾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 시가 나를 찾아왔다. 만해의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였다.
길지 않은 그 시 속에는 '없다'는 말이 열두 번이나 나온다. 그 시가 보여주는 현실은 없음 속에 있는 현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핍 속에 지속하는 세계이다. 일 년 열두 달이 흐르듯, 열두 번의 없음이 반복된 뒤에, 비로소 '있다'는 낱말이 마치 윤달처럼 처음 등장한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 모든 것을 빼앗긴 없음의 세계에 처음 등장하는 '있음'이 하필이면 '빛이 있으라'와 같은 눈부신 '있음'이 아니라,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라는 '있음'이었으니! 시인의 세계는 일 년 열두 달 없음 속에 잠겨 있는데, 그 없음 속에 오직 있는 것은 나를 능욕하려는 장군뿐이었던 것이다. 일찍이 어떤 시인이 고통받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토록 명징하게 형상화할 수 있었을까? 가난과 결핍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 까닭은 약한 자를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슨 까닭이 있겠는가? 그 투명한 시인의 본질 직관 앞에 나는 숨이 멎었다.
그런데 나를 시인의 정신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든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이 한 문장이었다. "그를 항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일 년 열두 달 없음 속에서 사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능욕하려는 장군에게 항거해야 한다. 저항이 없다면 자유도 없다.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우리를 능욕하려는 장군이 대를 이어 지배하는 이 나라에서 시인까지도 저항하는 투사가 되고 감옥에 갇힌 수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항거는 늘 '남에 대한 격분'과 함께 일어난다. 자기를 능욕하려는 남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항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전개이다. 하지만 격분이란 너무도 쉽게 미움과 증오로 나타난다. 3·1운동으로 옥에 갇혀 여러 해 동안 학대와 모욕을 받으며 만해 역시 '남에 대한 격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 격분 속에는 미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격분과 미움이 끝이었더라면, 그는 결코 당신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폭력으로 침략하고 약탈하는 자와 그 폭력에 항거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불타오르는 미움은 불의가 지배하는 세계의 양면이다. 폭력도 미움도 지옥의 얼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그 지옥에서 '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격분도 미움도 오로지 남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격분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를 잊고, 자기가 미워하는 남에게 매여 살게 된다. 자기는 없고 오직 미움의 대상이 된 타인이 자기의 내면을 지배하는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이 깃들일 수 있겠는가. 오직 남을 향해 분출되던 격분과 미움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할 때,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나 자신의 내면에서 비로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는 당신 앞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옥에 갇힌 시인도 남에 대한 격분을 자기에 대한 슬픔으로 바꿀 줄 알았다면, 오늘날 한국의 선남선녀들은 누구에게 그리도 능욕당했기에, 오로지 남에 대한 격분과 증오로 날밤을 새우는 것일까? 이 나라에서 독재와 저항의 시대가 지난 뒤에 너무도 많은 사람이,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거저 얻은 정치적 권리를 현실을 아름답게 형성하는 활동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타인을 증오하는 데 탕진한다. 내면의 공허와 열등감을 타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채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선동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온갖 그럴듯한 이유로 타인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설교할 때, 그들이 선 자리가 바로 지옥이다. 그러니 그대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수 없거든, 그럴 수 없는 자기를 슬퍼하라. 정치의 이름으로 타오르는 이 증오의 불길이 이 땅을 아주 폐허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전남대 철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