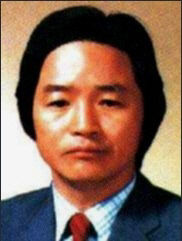 |
| 천기석 경북대 명예교수 시인 문학박사 |
원로교수의 업적은 국가적 자산이다.
우리나라에 해마다 정년한 원로교수는 몇 분이나 될까?
그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런 일들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날 하지 못한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스포츠 등 취미생활을 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에 출강하는 이도 있을 것이고, 원고를 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교수들은 한생을 꽃다운 나이에 상아탑에 들어와서 강의하고 연구를 했다. 세월이 지나 원로교수가 되었다. 그러다가 정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상아탑은 수도원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곳이다. 세상과 절연하고 오로지 연구하고 강의하는 그런 공간이다. 자기 청춘을 오로지 후진양성을 위해 한생을 보내면서 오늘의 고등교육에 헌신했다. 그분들의 쌓아온 업적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아니던가?
그 보물들을 후세에 남겨주면 사회나 국가 그리고 인류에게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 아닌가?
정부는 원로교수의 업적을 출간하도록 지원하여 주기 바란다. 이 같은 사업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 나아가 인류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들의 업적들을 출간되도록 정부가 국가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시생은 정년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원로 교수들의 지난날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들은 어디 마음 놓고 가족들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을까? 갑남을녀처럼 마음껏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얼마나 될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일생을 마음 졸이면서 살아온 그들이다. 교수의 가족들에게도 희생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머나먼 이국에 머물 때는 가족을 떠나 혼자 외로운 시간을 많이도 보냈을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화려한 직업이 아니다.
교수로 가는 길은 화려하지 않다.하지만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출근과 퇴근이 자유롭다. 주어진 시간에 강의하고 자기연구에 성과를 기록한다면 어느 누구도 교수의 권위나 프라이버시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이 교수의 특권이라면 특권이다. 하지만 교수가 그 같은 특권을 누림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청춘에 대학에 발을 들여놓아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생을 세상과 절연하고 연구에만 몰두하고 강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수의 책무이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부실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참으로 엄청나다 하겠다. 교수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는가? 학사, 석사,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한다고 수많은 시간을 보낸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밤을 낮으로 지새운 적이 많았을 것이다. 가족들은 뒷바라지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을 것이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청춘이 지나가 버린다 는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해외 교환교수로, 파견교수로 장기출장도 떠난다. 그들은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다.
한생의 삶이 이토록 가파르게 이어지기만 하여서 참으로 한생은 참 고달픈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놓고 연구할 지원은 받았는가? 그래서 정년하고 평생교육원에 나가면 어떤 늙은 학생이 내게 이런 말을 한다. "교수님,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웃으면서 넘긴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긋난 말이 아니다. 논문의 매듭이 풀리지 못하고 성과가 오르지 못할 때는 밤을 지새워야 하는 그런 고충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나 깨나 논문, 실험, 강의에 올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직업이 교수생활이다. 하지만 자기탐구에 몰입하여 세상사 모두를 잊어버리는 그 시간들에 끌리는 희열은 아무나 모를 것이다.
라틴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학자의 말과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진하다고 했다. 사회에서는 그렇게 교수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가? 정년하면 그만이다.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에는 유별나게 교수라고 명함을 새겨서 다니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시생은 국립대에서 40년을 보냈다. 조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10여 년이란 시간들이 흘렀다. 그래서 한국에 머문 어느 외신기자는 "칸트는 전임교수가 되는데 시간강사를 15년이나 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교수도 박사도 너무 많다고 하였던가? 코리아를 빈정대는 말이다.
정년한 원로교수들이 한생을 바쳐 연구한 결과들은 자못 대단하다.
그 업적을 저서로 남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여주기를 바란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다면 본인은 물론 사회적·국가적인 손실도 클 것이다.
나도 원고를 써 놓았지만 어디하나 마음대로 출간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시집도 내야 하고 오랜 외국생활에서 각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써 두었다. 하지만 이것을 출판사에 출간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의 출판사의 여건이 그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원고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 업적들이 쌓이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원로교수들이 평생 동안 청춘을 바쳐 탐구한 결과들은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인생의 행복은 할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말 원로 교수에게는 정년 후에 각자에게 맞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년 이후에도 여생을 연구에 몰입하도록 정부는 뒷바라지를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이보다 더한 국가적 자산이 되는 길이 있을까? " 최고의 명품은 정년 후에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하다. 재임시간에는 시간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정년이후 에는 시간제약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명품생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이다.
천기석<경북대 명예교수,시인,문학박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