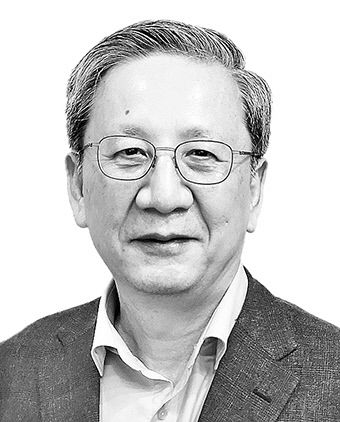 |
|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
지난 7월 말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방안을 보면 기존의 5개 사업 유형(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을 2개 사업 유형(경제재생형, 지역특화재생형)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참여(민간자본투입 포함)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성화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도시재생은 커뮤니티(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중요한 목표로 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도시정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후 2019년 도시재생 특별법의 전면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534개 사업지구에 약 5조6천억원의 국비예산이 투입되었다.
도시재생을 위한 이러한 노력의 결과 다소의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했던 점도 여러 가지 발견된다. 우선 사업지구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정작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업지구의 활성화와 기능회복에 필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인프라(예:교통망) 확충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나타난 결과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은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시공간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예산의 투입은 공공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종결로 끝나서는 안 되고,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공재원 투입이 종료된 후 도시재생사업이 지속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공공주도 도시재생사업이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지방의 쇠퇴와 인구소멸 대책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별로 특화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해야 한다. 예컨대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도시재생 목표설정과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미시적인 공간혁신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도시공간계획(예: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공(公共)주도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공공주도의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개별 도시마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은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와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도시를 살리는 길이다.
영남대 명예교수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