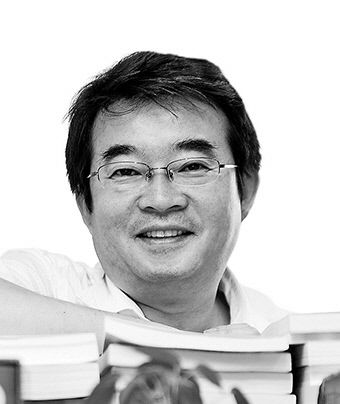 |
|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 |
나는 예천에서 태어나 열두 살까지 안동에서 성장했다. 열세 살 이후 7년간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청소 시간에 담임선생님은 우리에게 말했다. "휴지를 모도 조라." 이 말이 휴지를 주우라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대구로 전학 간 촌뜨기가 대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구 말을 '비스무리하게' 쓰는 것부터 익혀야 했던 것. 고등학교 때는 울진과 상주에서 유학 나온 친구들의 억양이 귀에 익숙해서 그들과 더 각별하게 지내기도 했다.
우리의 몸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핏줄로, 우리의 정신은 어머니의 입으로부터 빠져나온 방언으로부터 형성되었다. 나는 '걸리적거린다'를 '걸구친다'라 하고, '어수룩하다'를 '어리하다'라 쓰고, '부추전'이 먹고 싶으면 '정구지적'을 해달라고 한다. 대구 사람들은 '정구지찌짐'이라고 하겠지만. 가족공동체가 공유해 대를 이어가며 사용하는 이 방언은 가족을 연결하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 방언은 '가가 누집 아인지' '어데 살다 왔는지' '어예 그쿠로 티미한지' 잘 알려준다.
표준어는 모든 언어를 평준화시키는 언어다. 표준어에 의해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개인 간의 의사소통은 편리해진다. 국가는 단일한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치가 수월해진다. 이에 반해 방언은 사용 지역과 사용 집단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는 언어다. 독자성은 뚜렷하지만 불편한 언어다. 방언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을 하나로 결집하기 때문이다.
케케묵은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이 군대에서 발생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본 적이 있다. 군대라는 낯선 집단 안에서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친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질적인 말씨는 배타적인 감정을 만들고 급기야 지역 카르텔 혹은 권력 카르텔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실하던 시기에 전방의 군대에서 형성된 이 못된 감정이 '카더라 통신'을 통해 각 지역으로 퍼져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고정된 건 아닐까.
그럼에도 나는 방언의 힘을 믿는다.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언어의 다양성이 언어 사용자의 상상력을 훨씬 풍부하게 만든다. 상상력은 과거를 환기하는 능력이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방언은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철에 무를 납작납작하게 썰어 말린다. 말린 무를 물에 불렸다가 갖은양념을 더해 꼬들꼬들한 무말랭이를 만든다. 이걸 영주, 안동, 예천 등의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곤짠지'라고 하거나 '골짠지'라고 한다. 무가 수분을 빼고 골았으니 '곤'이나 '골'을 쓰고 소금을 치거나 소금에 절인 짠 김치 종류이므로 '짠지'를 붙였다. 상주지역에서는 '골금짠지'로 한 글자 더 늘어나고, 군위나 칠곡지역에서는 '오그락지'라고 한다. 모양이 오그라든 무로 만든 김치! 모두 기막힌 명명이 아닐 수 없다. 밋밋한 표준어 '무말랭이'가 따라붙을 수 없는 위력을 이 이름들은 품고 있다.
사소한 음식 이름 하나가 지나온 시간 전체를 불러낸다. 그야말로 사무치게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방언의 힘을 지나치게 가벼이 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가만히 우리 어머니처럼 발음해본다. "안 그르이껴?"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