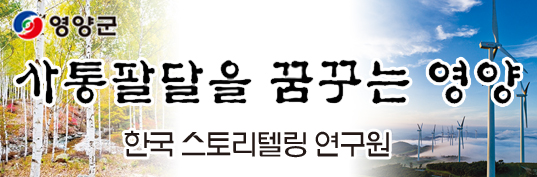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 |
책 사면 을유문화사 자주 찾는다고
그곳 오디오 탐난다며 두 눈 반짝여
예술 거장 시리즈 한국인 포함 강조
서울 종로구 피맛골에 있는 노포, '열차집'. 장정일 형은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요즘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을 구입한 뒤 자주 을유문화사를 찾는다고 했다. 그곳 사무실에 있는 고가의 오디오는 봐도 봐도 탐이 난다며 진심으로 부러운 듯 두 눈을 반짝였다. 또한 형은 을유문화사에서 발간한 책 중 빌 에반스, 빌리 홀리데이, 마일스 데이비스 등 재즈 뮤지션이 많이 포함된 '현대 예술의 거장' 시리즈가 마음에 든다고 했다. 형은 이 시리즈가 독자에게 더 큰 관심을 받기 위해선 '임방울' '추송웅' 등 한국인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래야만 제대로 된 형태와 균형을 갖춘 기획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형의 생각인 것 같았다.(이러한 형의 의견이 반영된 듯 을유문화사는 2010년 10월, '임방울, 우리 시대 최고의 소리 광대'란 제목의 책을 출간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장정일의 악서총람(책세상)' 345쪽 참조.)
형은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몇 달 전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결국 들고 있던 책의 판권지에 적혀있는 출판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웃픈'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덕여대'를 '동국여대'라고 하지 않나,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의 성과 이름을 뒤섞어 말하지 않나…. 정말 심각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형은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꼭 인터뷰 요청이 온다고 했다. 첫째 '외설 시비', 둘째 '양심적 병역기피', 셋째 '학력 논란'인데 형은 이 세 가지 모두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H씨가 휴대폰이 없는 형 대신 기획자로 되어 있는 자신에게 전화가 더 많이 온다며 '푸~' 하고 장난스레 긴 한숨을 내뱉었다. "장정일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답니다"라고 답해도 기자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형은 내 소설 '베르메르 vs. 베르메르'(민음사)가 팩션(faction)보다는 예술가 소설에 더 가깝다고 했다.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허구의 기록이라면, 역사 그 자체는 결국 팩션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 그게 진정 개성 있는 팩션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팩션은 이덕일씨와 같은 역사학자가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형은 그러한 책으로 '다빈치코드(문학수첩)'를 통해 잘 알려진 '성혈과 성배'(자음과모음)을 예로 들었고, 한국은 편집자들이 문학적 성향이 강해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잠시 모작과 위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창작과 모방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천재란 결국 미량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만을 소유한, 그 보잘것없는 독창성과 신선함에 기생하는 불행한 연기자 같은 것 아닐까요?"라고 내가 물었다.(물론 '미량의 오리지널리티 부재' 역시 예술가를 절망케 하는 무서운 동인이 되겠지만.) 형은 반쯤 비워진 술잔을 바라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래요…"만을 되풀이했다.
사족 하나. 형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 우연히 한겨레신문에서 아래의 시를 발견하고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정말 독자시로 발표했네.)
[독자시] 2008년 2월25일/ 장정일
한여름 낮/ 방안에 벌이 들어와/ 잉잉대던 소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먹먹하게 해 떨어진 밤/ 황금빛 파리가 붕붕대는 걸/ 어찌 참고 들으리?/ 저 똥파리 나대는 소리를!/한낮의 그 벌들은 다 어디로 갔나?
형은 (엷은 미소를 머금으며) 몇 달 전 자신의 집 전화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결국 들고 있던 책의 판권지에 적혀있는 출판사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웃픈'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덕여대'를 '동국여대'라고 하지 않나, 사람 이름을 부를 때 다른 사람의 성과 이름을 뒤섞어 말하지 않나…. 정말 심각하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형은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꼭 인터뷰 요청이 온다고 했다. 첫째 '외설 시비', 둘째 '양심적 병역기피', 셋째 '학력 논란'인데 형은 이 세 가지 모두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H씨가 휴대폰이 없는 형 대신 기획자로 되어 있는 자신에게 전화가 더 많이 온다며 '푸~' 하고 장난스레 긴 한숨을 내뱉었다. "장정일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답니다"라고 답해도 기자들의 연락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형은 내 소설 '베르메르 vs. 베르메르'(민음사)가 팩션(faction)보다는 예술가 소설에 더 가깝다고 했다. 역사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허구의 기록이라면, 역사 그 자체는 결국 팩션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 그게 진정 개성 있는 팩션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팩션은 이덕일씨와 같은 역사학자가 더 잘해 낼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형은 그러한 책으로 '다빈치코드(문학수첩)'를 통해 잘 알려진 '성혈과 성배'(자음과모음)을 예로 들었고, 한국은 편집자들이 문학적 성향이 강해 이런 방향으로 흐르기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잠시 모작과 위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창작과 모방의 경계가 모호해진 지금, 천재란 결국 미량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만을 소유한, 그 보잘것없는 독창성과 신선함에 기생하는 불행한 연기자 같은 것 아닐까요?"라고 내가 물었다.(물론 '미량의 오리지널리티 부재' 역시 예술가를 절망케 하는 무서운 동인이 되겠지만.) 형은 반쯤 비워진 술잔을 바라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래요…"만을 되풀이했다.
사족 하나. 형의 이름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다 우연히 한겨레신문에서 아래의 시를 발견하고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정말 독자시로 발표했네.)
[독자시] 2008년 2월25일/ 장정일
한여름 낮/ 방안에 벌이 들어와/ 잉잉대던 소리는/ 얼마나 즐거웠던가?/ 먹먹하게 해 떨어진 밤/ 황금빛 파리가 붕붕대는 걸/ 어찌 참고 들으리?/ 저 똥파리 나대는 소리를!/한낮의 그 벌들은 다 어디로 갔나?

우광훈 소설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