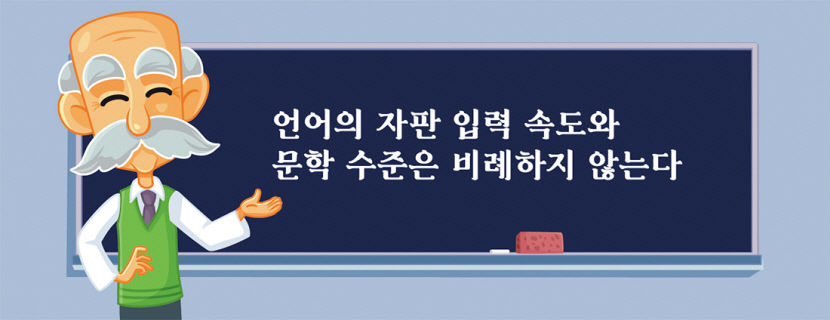 |
한글의 컴퓨터 입력 속도가 빠르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한·중·일 세 나라의 학생들이 자판 대결을 벌인 영상을 본 적 있다. 각자의 모국어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문장을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시합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 한국·일본·중국의 순이었다. 영상의 결론은 한국어의 입력 속도가 일본어와 중국어보다 7배 정도 빠르다는 것이었다. 간단한 실험의 결과인 이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자판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속도에서 한국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보다 상당히 빠른 것은 분명하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때 21세기의 디지털 시대를 예상치는 않았을 것이나, 한글과 한국어가 앞장서 세계 문화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른바 '한글 국뽕'을 외칠 만하다. 이 시대의 문자 생활은 대부분 컴퓨터 자판을 통한 문자 입력에서 시작되므로 입력 속도는 문자들의 우열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그러나 입력 속도가 디지털 시대 문자 생활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
| 이경엽 (한자연구가) |
한국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배경이 한글이란 말을 가끔 접하게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한글이 디지털에 최적화된 문자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입력 속도에 한정될 뿐이다. 컴퓨터에 한 번 입력된 문서 파일은 그것이 한글이든 한자든 저장·전송·출력되는 과정에서는 속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지고 보면 컴퓨터를 통한 문자 생활은 우리 언어생활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컴퓨터로 종일 작업을 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학자 등 특정인을 제외하면, 문자 입력의 속도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문자 입력의 목적 대부분이 지인과의 메시지 전달에 있다면 특히 그렇다. 한국어의 장점을 고작 한글의 입력 속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세종대왕께도 대단히 죄송할 뿐이다.
한글로 문자를 빨리 입력할 수 있다고 하여 우리의 문학작품 수준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작품을 더 빨리 완성할 수도 없다. 한글 입력이 빠르다고 우리 학자들의 논문이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논문보다 더 우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손이 빠르다고 두뇌 회전이 빨라지거나 창의성이 더 발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근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은 '한자불멸(漢字不滅) 중국필망(中國必亡)'이란 말을 했다고 한다.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다. 1936년에 사망했으니 그의 사후 9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중국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어찌 된 영문인지 궁금해진다. 한자가 디지털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한자를 쓰는 중국이 쉬 망하지는 않을 것이며, 일본이 가나와 한자를 함께 사용한다고 그들의 디지털 기술이 우리보다 뒤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문자는 매우 중요하나 컴퓨터 입력의 속도가 그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생활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한글의 우수성은 충분히 알려졌으니, 이제 한국어의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문자 입력의 방법은 AI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할 것이다. 긴 눈으로 보면 한자 또한 이에 적절히 적응할 것이니 우리가 한글의 입력 속도만 자랑하며 안주할 수 없다. 한국어 어휘의 질과 양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늘리는 데 서둘러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한자연구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