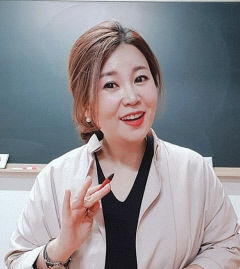 |
| 이승남 명지현학술원장 |
명리학에서는 세 가지로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연월일시(年月日時)다. 타고난 것이어서, 그 사람의 명(命)이라 한다.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명은 정해진 것이다. 살면서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읽어내는 데 사용된다. 이것으로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운(運)이다. 운은 사람마다 다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운이 좋다는 것은 타고난 명(命)에 맞는 부귀(富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운(天運)이 있다. 개인의 운은 노력에 의해서 변할 수 있지만, 천운은 하늘의 섭리여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시대인 지금은 최악의 천운이 온 셈이다. 이를 명리학 용어로는 편관(偏官)이라 한다. 절대권력이란 의미다. 편관이란 성과도 없이 개인의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한다. 정신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하는 지긋지긋한 것이다 . 편관은 개인에게는 과로 또는 공황장애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편관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한다면 살(殺)이라 부른다. 코로나 팬데믹은 천운(天運)에서 온 살(殺)이어서, 천재지변의 운이다.
명리학적으로는 살(殺), 즉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을 크게 넷으로 나눈다. 첫 번째는 식신제살(食神制殺)이다. 식신(食神)은 몸과 마음을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행동을 말한다. 이를 통해 살(殺)이라는 코로나 균이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백신을 맞거나, 운동이나 식품 등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식신은 명리학의 십신(十神· 삶의 모습을 10개의 틀로 구분한 명리학 용어) 중 가장 긍정적이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식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잘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잘한다.
두 번째는 살인상생(殺印相生)이다. 인(印)은 정신력과 익숙함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살(殺)을 참고 견뎌서 끝내 이긴다는 뜻이다. 마스크 착용하기, 거리 두기 실천하기, 기침 예절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습관적이기때문에, 식신제살에 비하면 미래준비가 없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몸은 지쳐 힘들고, 힘들게 보낸 세월이 아까워서 한탄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세 번째로 상관합살(傷官合殺)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과의 동침이다. 당연히 생활이 불안정하다. 일은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 을 받기도 한다. 코로나와 밀도 높은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다. 확진자 주변인이 대체로 이런 상황이다. 2주 격리 같은 자리 이탈 상황도 발생한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거치는 등 위험에 많이 노출되지만, 운 좋게 감염은 피해간다. 이런 환경에 오래 처해 있다 보니, 심신이 지쳐 있다.
네 번째는 재생살(財生殺) 살인상생(殺印相生)이다. 사명감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인물이 이런 유형으로 코로나를 극복한다. 이순신 정신이 재생살 살인상생이다. 재(財)는 명리학에서 신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몸을 살(殺), 즉 코로나와 직접 부딪히는 것이다. 의료진을 비롯해 코로나와 관련된 곳에 일하는 공직자 및 자원봉사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반드시 강인한 정신과 신체적 건강이 있어야 한다 . 후퇴할 줄 모르는 뚝심으로 자연 면역력이 생기는 경우이기도 하다.
천운(天運)도 시대와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개인의 운처럼 길운(吉運)과 흉운(凶運)이 번갈아 오게 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때의 전염병 대처법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 비과학적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잘 추정할 수 있게 기록돼 있다.
"전염병이 있어, 그 방문(方文)에 이르기를 …참기름을 코 안에 바르고, 누울 때도 바른다. 창졸간(倉卒間)이라 약이 없으면, 종이 심지를 말아서 콧구멍에 넣어 재채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 같은 세종때의 전염병 대처법은 식신제살형이다. 당시의 재난 대처법도 예방의 중요성을 당부하는 식신제살 방식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9년때의 기록에 잘 묘사돼 있다. "천재(天災)와 지이(地異)가 있고 없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조치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명리학적으로는 식신제살을 으뜸 방법으로 본다. 하지만 각자 나름의 상황에 맞춰 네가지중 하나만 하기도 하고, 몇개를 동시에 하면서 코로나에 대처하고 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각자에게 맞는 최상의 방법으로 대응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는 길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승남 <명지현학술원장>

이승남 명지현학술원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영·호남 공동선언…균형발전 위해 한목소리](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1/news-m.v1.20260117.4cf4c263752a42bfacf8c724a96d3b46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