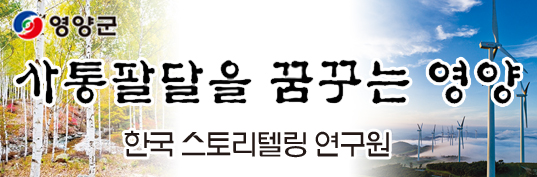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전가경 (도서출판 사월의눈 대표) |
얼마 전 모처럼 대구미술관에 찾아갔다. 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는 조금 다른 광경을 마주했는데, 다수의 영유아 관람객이었다. 본래 대구미술관에 이런 '어린' 관람객이 평소에도 많은 것인지 혹은 다니엘 뷔런 전시의 메인 작품이 동심을 소재로 하는 만큼 특정 전시의 영향력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이유야 어떻든 부모들은 유아차를 끌거나 아이를 안아 가며 미술을 감상했다. 상당히 보기 좋은 모습이면서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로선 그 장면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선 얼마나 예외적일 수 있는지를 잘 안다. '아이-친화적'이지 않은 미술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
아이-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은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 태도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아이와 함께 미술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부대 프로그램의 부재를 뜻한다. 당연히 미술관에서의 관람 태도라는 건 필요하다. 작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뛰어다니고 소음을 내는 행위는 제재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미술관은 마치 무균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양 아이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울음이나 소음 혹은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탓에 국내 미술 전시엔 유독 어린이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당일 미술관 관람 중에도 작은 사건이 있었다. 나에겐 전혀 방해되지 않는 아이의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장 지킴이는 바로 반응을 보이며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부모를 제재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연히 아이를 가진 부모는 미술관행을 꺼리게 된다. 사회 내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서 인식되는가 하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위는 불편을 조장하는 것이 되기 마련이다. 널리 알려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경구는 이 사회에선 설 자리가 없다. 이미 '노키즈존'이라는 해괴한 조어를 통해 이 사회 내 어린이에 대한 시선을 투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대구미술관에서 압도적인 비중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던 건 분명 긍정적 신호다.
한편 미술관이 아이에게 친화적으로 다가선다는 것은 비단 관람 태도만을 뜻하지 않는다. 난해한 현대미술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용 부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일이다. 아이의 관심사나 취향을 자극하는 몇몇 예외적 현대미술이 아닌 이상, 다수의 아이에게 미술관은 이해 불가능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인식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전시 중인 미술과 연계된 어린이용 프로그램 운영이다. 코로나19의 세상이 되기 이전인 2017년, 유럽에 있는 몇몇 미술관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런던과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의 몇몇 유명 미술관을 방문하며 감지한 것은 진행 중인 미술 전시와 연계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미술관은 대중과 아이를 향해 문턱을 낮추고 있었고, 한편에선 매우 친절했다.
인스타그램 피드에는 온갖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부모들은 실시간으로 아이의 '예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그 어떤 시대보다 아이의 귀여운 이미지가 넘치는 데 일조한다. 그러나 동시에 아동 혐오가 만연하다.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면 '어린이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폭력적인 용어인 '노키즈존'을 굳이 선택하는 것은 '공생'보다는 '차별'을 지지하는 태도다. 여러 영역에서 약자의 접근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의 미술관 접근에 관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하다.
"난해하고 어려운 현대미술을 허하라. 단,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라." 오래전 유럽 여행 후 느꼈던 감상문의 마지막 한 줄이다.
전가경 (도서출판 사월의눈 대표)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말로하자] 기초의원에게 기초의원이 꼭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8/news-m.v1.20250814.4aa48077a94f4a81ad024ed07bff267e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