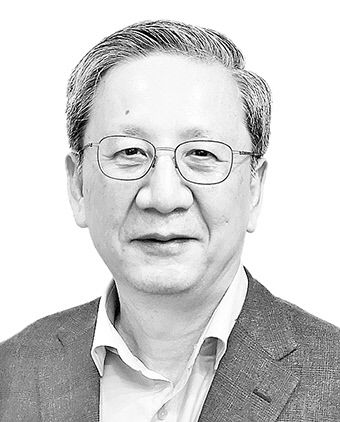 |
| 윤대식 영남대 명예교수 |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꿈 중의 하나이다. 라이트 형제(Wilbur Wright & Orville Wright)가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만들고 1903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지 120년이 지난 이제 플라잉 카(flying car)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 UAM은 많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들이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서 활주로가 필요 없는 것도 있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가 필요한 것도 있다. 그리고 도로를 달리다가 비행 모드로 전환해 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국내 대기업과 연구소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eVTOL·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를 개발 중이며,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무인 자율 비행이 가능한 저소음 기체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도로 주행 기능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M은 도로교통 혼잡이 심한 대도시에서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UAM 기체 제작을 선도하는 미국 Joby사(Joby Aviation)가 개발 중인 기체(S-4)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기체 인증을 받은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상용화가 예상된다. Joby사는 서비스 시행 초기 요금을 1마일(약 1.6㎞)당 3달러(약 3천700원)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13만원을 지불하고 10분 만에 갈 수 있다. 그러면 UAM 요금은 택시비의 2배가 되고, 통행시간은 6분의 1로 줄어든다. 이 정도의 요금 수준이면 바쁘고 시간가치가 큰 기업가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임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혼잡이 심하고 고소득자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UAM의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경우 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도시들도 많고,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UAM의 시장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아울러 UAM 서비스는 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 외에도 산악지역이나 도서(島嶼)지역과 같이 육상교통이나 해상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수요가 많다. 그러나 산악지역이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요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affordability)이 문제다.
UAM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갖추어야 하는 인프라도 많다.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UAM의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verti-port)다. 도시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겠지만, 버티포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다. 버티포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를 필요로 하고,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안전도 함께 고려해서 입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UAM은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마찬가지로 문전(door-to-door) 서비스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버티포트의 입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좋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편리한 곳(예: 철도역, 도시철도역)이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UAM은 여러 가지 기술적 한계로 주행거리가 제한된 도시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UAM의 상용화는 기체 개발을 위한 기술적 난관의 극복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의 여건에 맞는 요금체계와 관련 인프라(예: 버티포트)의 적절한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UAM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이슈뿐만 아니라, 제도, 인프라, 운영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영남대 명예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