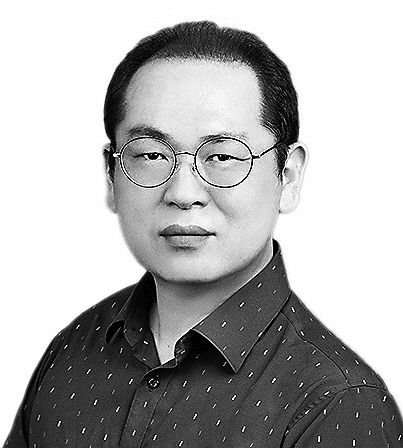 |
| 최수경 정경부장 |
1996년 5월29일 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대구의 한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홍철 교통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이 '대구경북 발전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대구-구미-포항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거론했다. 구미 전자제품과 포항 철강 소재를 활용한 산업을 대구가 적극 육성하자는 이른바 '대구포 산업벨트' 개념이 태동한 것. 구상은 신선했지만 실천은 되지 않았다. 이후 MB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인 '5+2광역경제권'이 이슈가 될 때 반짝 재소환됐지만 냄비근성 탓인지 또 흐지부지됐다.
그리고 2023년 7월20일. 윤석열 정부는 대구(전기차 모터 소재·부품·장비), 구미(반도체 소재 공급기지), 포항(2차전지 양극재 생산기지)을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유신 시절 중화학공업을 육성한다며 지역별로 육성할 전략산업을 정한 이후 간만에 접해본 상황이다. 대구포 산업벨트는 그렇게 27년 만에 귀환했다. 비록 정치적 배려로 지역을 안배한 냄새는 나지만 여기에 굳이 천착할 필요는 없다. 투자유치가 봇물을 이루도록 잘 가꿔가기 나름이다.
생산기반이 빈약해 30년 넘게 1인당 GRDP 꼴찌인 대구는 감흥이 남다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범일 시장(2006년 7월~2014년 6월) 때는 대구국가산단·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 신산업 씨앗만 뿌렸다. 권영진 시장(2014년 7월~2022년 6월) 시절은 섬유·기계금속에서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를 바꾸는 과도기였다. 가시적 결과물은 홍준표 시장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나타났다.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그 정점이다. 관운(官運)도 따랐지만 시장 자체 판단과 선택은 인정해야 한다. 전기차 외에 드론·UAM을 모빌리티 분야에 포함시킨 건 미래차 사업의 스펙트럼을 풍성하게 했다. 첨단산업 융합기술인 ABB(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야 육성카드도 주목받을 만하다.
구미는 웨이퍼 등 반도체 소재분야를 특화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 한동안 휴대폰·디스플레이 수출도시로 명성을 떨쳤다. 적어도 대기업 생산라인과 고급 인재들의 동시다발적 지역 이탈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구미에 부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쇳물과 철강만 연상되던 포항은 2차전지 소재(양극재)를 품에 안으며 주력업종 세탁에 성공했다. 포스코·에코프로 그룹의 통 큰 투자가 자양분이 됐다.
지금 우쭐해선 안 된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다. 난관은 차고 넘친다. 대구는 완성차 업체가 두 곳이나 있는 광주(자율차)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구미는 당분간 수도권 반도체클러스터에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지만 이 기능만으론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다시 깔고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을 유치해 무너진 반도체 생태계를 굳건히 세워야 한다. 대구가 시작한 센서반도체를 비롯해 전도유망한 차량용·전력용 반도체 공급도 책임져야 한다. 튼실한 부품·장비업체가 받쳐주고 있어 자생력은 충분해 보인다. 울산·새만금·청주와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포항은 차세대배터리(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지속적 원천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서 승부가 갈린다.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 경쟁에서도 무게중심을 잡아야 한다. 답은 명확하다. 대구포 벨트가 삼각공조를 통한 상생전략으로 가야 승산이 있다. 각자도생은 산업부흥을 오래 기다려온 지역민에게 자칫 희망고문만 줄 뿐이다.
최수경 정경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월정교 위 수놓은 한복의 향연··· 신라 왕복부터 AI 한복까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10/news-m.v1.20251031.6f8bf5a4fea9457483eb7a759d3496d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