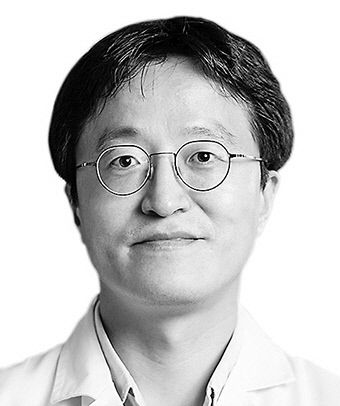 |
|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
중국은 인쇄, 화약, 나침반의 발명과 같은 우수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 풍요를 이루는 기반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룬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업을 잇게 하는 것보다 자녀들을 정부의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단편적으로는 이러한 전략이 사업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궁극에는 새로운 혁신에 대한 투자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였다. 인쇄, 화약, 나침반 기술은 오히려 유럽에서 더 발전되고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이는 학문을 보급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대항해를 시작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항로의 개척과 무역의 발달은 학문과 기술의 보급과 개발을 더 촉진하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하지만 유럽 역시 기술 개발의 이권에 대한 왕실과 기득권자의 유착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혁신과 사업이 등장하는 데 한계를 가지게 된다. 이로 인해 신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자유를 보장해주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일이 많아졌고, 미국은 20세기의 주도국으로 성장한다.
고려시대에 개화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조선의 건국이념인 '사농공상'에 막혀 고전을 하다가 세종에 이르러 혁신의 시기를 맞이한다. 1983년 일본 동경대학의 연구진이 집필한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는 15세기 전반의 세계 대표 기술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흥미롭게도 조선이 29건으로 세계 어느 나라와 지역보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때가 세종 대왕 재위 시기와 상당히 겹친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집현전 학사의 약 20%가 과학기술자라는 사실은 성군의 높은 관심과 안목을 알게 한다. 하지만 이후 세조 시기에 집현전은 폐쇄되고, 사회적 분위기는 과학기술자가 더욱 활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기술에 대해 근본적으로 투자가 빈약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이 살길을 자생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불행히도 조선의 발등을 찍게 만들고 만다. 대표적인 것이 방연석에서 은을 분리하는 연은법인데, 그 수율이 매우 높아서 당시로는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연산군 재위 시절 양인 김감불과 노비 김검동에 의해 개발되고 활발히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중종반정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치에 대한 경계 등으로 인해 은 생산은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그보다도 어쩌면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를 대우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든 비극의 시작이었을지 모른다. 이 기술은 일본으로 흘러 들어가 당시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며, 더 나아가 무역으로 화약과 실탄, 조총을 구매하여 훗날 조선을 침략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
세종 시기로부터 300년이 더 지나 정조 때에 이르러 규장각을 만들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다시 높였지만, 세종 때의 혁신을 떠올리긴 힘들다. 이처럼 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의 단절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을 요구한다. 슬프게도 고려부터 조선까지 99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역사에서 떠올릴 수 있는 과학자, 과학기술자의 이름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빈약한 인식과 대우를 느끼게 한다. 자유로움의 억제는 과학자의 창의성을 말살한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과학적 성취는 여러 학자의 대를 이은 고민 끝에 완성되곤 한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긴 안목의 투자와 자유로움이 주요하다.
박치영 DGIST 에너지공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