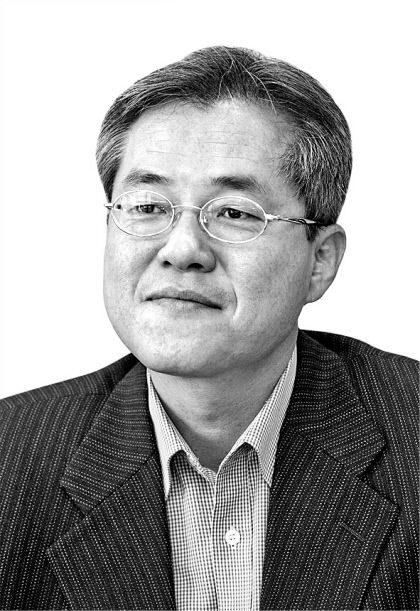 |
| 박재일 논설실장 |
박재일 칼럼 / 박정희에 대한 예우
밤에 걷는 취미는 이제 굳어졌다. 동성로도 그 행동 반경이다. 신천을 건너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다. 내가 가장 늙은 축에 든다는 위축감도 들지만 이도 금새 사라진다. 거리에 쏟아진 젊음은 옛 적 그대로이다. 물론 '생각의 간격'은 클 게다. 화려한 놀이시설 랜드마크도 생겼다. 옛 시립도서관이자 법원 자리다. 젊음은 그걸 모를 것이다. 이 건물 모서리 장식 기둥에는 초상이 새겨져 있다. 김광석, 이병철, 박정희다. 대구 태생 가수, 삼성의 창업주, 그리고 대통령. 건축주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참 잘했다'고 여기면서도 한편 가수는 보기 좋은 안쪽에, 박정희는 모서리 밖에 있는 것이 좀 불편했다.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이 박정희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보니 대통령 초상은 쓰레기통으로 완전히 차단됐다. 그가 이런 예우를 받아야 하나. 이젠 의구심이 생긴다.
'박정희', 그를 이 한 줄의 칼럼으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의 개발독재는 저항하는 투사들을 잉태했지만, 한편 대한민국은 수직 이륙했다. 비행기로 치면 'take-off' 이다. 저개발·미개발 국가는 이륙이 안된다. 다만 한번 날면 그냥 간다. 경제발전 단계 이론이기도 하다. 흔히 비유하듯 오늘날 한국이 자랑하는 전자, 자동차, 화학, 조선, 방산의 세계적 경쟁력은 박정희의 통찰과 뚝심에 유래했다. 박정희의 정적(政敵)이기도 했던 김대중 정권도 집권하고 놀랐다. 경제와 과학, 국가 기반의 절대적 기초가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반대인사들에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그가 깔아놓은 경제발전의 성취 덕에 민주화를 달성했다. '최소한의 경제적 부(富)가 없이는 민주주의가 어렵다'는 정치이론을 박정희는 증명했다.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칼 막스의 주장은 이 부문에서 겹친다.
박정희가 대구에 관심을 가진 건 자연스럽다. 그는 경북대 사범대 부속고 자리의 대구사범을 졸업했다. 결혼식도 대구에서 했고, 장교생활도 대구를 거쳤다. 그는 대구에 오면 수성관광호텔에 묵었다. 창문을 감싼 방탄철문은 지금도 있다. 이해봉 전 대구시장의 회고록(바보같은 인생)에 따르면 박정희는 '대구를 사람 살기좋은 도시'로 구상했다고 한다. 한때 교사였던 박정희는 대구가 구미-포항과 같은 산업도시가 아닌 교육도시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박정희는 대구의 도시계획도 챙겼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역-수성못 동대구로는 그의 생각에 닿아 있는 결과물이다.
오는 26일은 그가 서거한 지 44년이 된다. 그는 여전히 정치적이지만 그를 빼놓고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Nation-building'을 설명하기는 역시 불가능하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마틴 루터 킹'을 명명한 도로가 셀 수 없이 많다. 우린 그런 점에서 여유가 없다. 대구가 까닭없이 그를 기리지 않는다는 점은 몰염치다. 동상 하나 기념비 하나 없다. 쓰레기통 옆 초상이 대신한다.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가 대구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장소는 동대구역이나 반월당이 점지되고 있다. 성사되기 바란다. '생각의 간격'을 좁혀보는 역사적 시도가 될 게다. 그리고 박정희 초상 옆 쓰레기통은 치웠으면 한다. 동시대인으로서 난 정말 미안하다. 누가 말했다. 보수는 '먼저 간 이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고. 어쩌면 그건 보수를 떠나 인간의 예의일지도 모른다.
동성로 랜드마크의 박정희
초상은 쓰레기통에 가려져
숱한 대구인연 맺은 대통령
동상하나 기념비 하나 없어
먼저간 이들에 대한 여유를

박재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