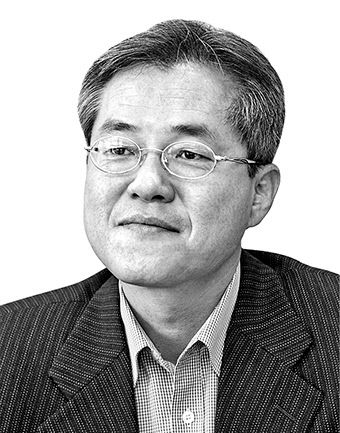 |
| 논설실장 |
그린벨트(Green Belt)법은 한때 부동산의 국가보안법이라 불렸다. 국가가 엄청난 제약을 부가한 땅이란 의미다. 말이 좋아 '푸른 그린'이지 실은 개발을 완전히 묶어버리는 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이다. 그린벨트는 단순 짐작하듯이 국토 전역이 아니다. 대도시 주변에 한정됐다. 도시가 난개발돼 외곽으로 마구 뻗어 나가는 폐해(sprawling)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3개 대도시(국토면적의 5.45%)에 적용됐다. 대구권의 경우 대구 도심을 마치 도넛처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그린벨트 면적은 대구권의 절반을 넘는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자연보전과 녹지 유지, 군사시설 확보란 명분에서 추진된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토 공간계획'의 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린벨트 제정 당시 박정희는 "현재 경제력과 재정 여건이 안돼 제대로 된 개발이 어려운 만큼 수십 년 뒤 우리 후손들이 여유로울 때 사용토록 개발을 유보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개발을 제한한 땅이라기보다 개발유보지역에 가깝다. 원래 영국 런던의 그린벨트를 벤치마킹했다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대도시 주변을 그린벨트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도시 주변이 그나마 푸르게 유지된 비결이다.
그린벨트가 처음 도입될 당시, '푸르다'라는 근사한 말에 혹해서 대도시 외곽의 토착민들은 "내 땅도 포함시켜 달라"고 행정 관청에 부탁했다는 일화도 있다. 대구 인근 가창에서는 당시 권력 실세가 조상 땅을 그린벨트에서 제척해 엄청난 이익을 창출했다는 소문도 있다. 그린벨트의 70%는 사유지다. 당연히 사유재산권 논란이 일었다. 인접 지역은 도시화로 개발되는데 내 땅은 주택 하나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팔리지는 않고 재산세만 냈다.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했다. 동대구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전국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집합 장소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라는 데모가 수시로 열렸다. 요즘 데모가 뜸한 이유를 대구시에 물어보니 수십 년간 민원이 폭주하면서 역대 정부가 그린벨트 정책을 틈틈이 완화하고 일부 지역은 풀어준 배경이 있다고 답했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린벨트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경기장과 선수촌이 그린벨트에 지어졌다. 김대중 정권 때는 상당한 해제지역이 나왔고, 박근혜 정권 때도 일부 해제됐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 당시 수도권 아파트 용지 확보를 위해 해제를 시도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강히 반대해 좌절됐다는 대목이다. 우파 국가주의자인 박정희가 만든 그린벨트를 좌파 운동가 출신이 보존을 외친 점은 '그린벨트 정치'의 아이러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엔 비수도권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 달성군의 미래자동차, 경주의 소형모듈 원전 단지를 비롯, 지역별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의 인구감소를 저지시켜 보겠다고 했다. 벌써 전국의 부동산 업계가 들썩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규제 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한다.
그린벨트 제정 당시, 박정희는 반대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결국 50여 년 전 구축했던 제도를 후대 정권은 풀 수 있는 정책의 여유를 가지게 됐다. 누구는 규제란 고양이 목의 방울을 달았고, 그 뒤의 누구는 정책의 칼자루를 갖게 됐다. 그린벨트를 보면 국가가 운영되는 원리를 일면 느낀다.
논설실장

박재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