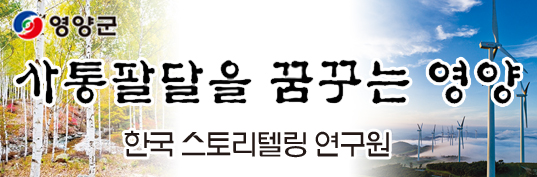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박지운의 오페라와 인생] 언밸런스(Unbalance)](https://www.yeongnam.com/mnt/file/201405/20140507.010300816200001i1.jpg) |
| <오페라지휘자 ·작곡가> |
필자가 한창 성악음악 작곡에 눈을 뜨고, 재미를 붙이며 곡을 쓰던 로마에서의 2002~2005년 시절. 그 후 기독교인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하여 성가곡으로만 구성한 제1회 작곡발표회를 올렸다. 그리고 귀국 후 그 곡들을 모아 선민음악사에서 ‘연주인을 위한 성가독창곡집’과 ‘전문연주단체를 위한 성가합창곡집’을 부푼 마음으로 2007년도에 발표하였다. 푸치니, 베르디, 드뷔시 등의 양식을 불어넣었다고 믿던 나의 사랑하는 과거가 뿜어낸 30여곡.
지난주 드디어 악보 판매의 로열티가 도착했다. 이 위대한 음악(?)이 살아 숨쉬는 악보는 얼마나 팔렸을까? 1만권이나 5만권, 아니면 10만권에 육박했을까? 놀라지들 마시라! 달랑 348권. 나의 4년간의 세월이 그러한 숫자에 새하얗게 짓눌려 뒤로 숨으려는 것을 내가 겨우 말려야했다. 하지만 뭐 어때? 빈센트 반 고흐는 생전에 단 한 점을 팔았는데…. 그것도 단돈 몇 만원에.
인터넷과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나의 곡과 오페라들은 지금 어디서 누구에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인가. ‘싸이’는 10억뷰를 했다는데, 강남스타일보다 수십억 배는 위대한 스타일의 기술과 비밀을 숨겨놓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은 나의 곡은 ‘348’이라는 숫자에 대롱대롱 매달려 나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가?
학교에서 교수나 교사로 가르치지 않고 순수하게 클래식 작곡만 하여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한국 현실에서 클래식 곡을 창작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음악대학 작곡과 내에서 흔히 배우는 스트라빈스키, 쇤베르크, 힌데미트, 메시앙 같은 20세기의 거장들의 기법을 총동원해 그러한 현대적 곡을 써 봐도 어디 발표할 곳도, 자발적으로 찾아주는 청중도 거의 없다.
작곡가 윤이상의 이름은 웬만한 지식인이면 한번쯤 들어나 봤겠지만 정작 그의 음악작품을 들어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남한과 북한의 경계에 서 있던, 사상적으로 독특한 기인으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것이지, 독일에서는 그렇게 찬사를 받은 그의 현대적 기법의 작품이건만 국내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함 그 자체로 다가서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반대로 대한민국의 연주회장에서 그나마 연주되는 전통 화성으로 쓰인 유일한 장르는 가곡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의 음악대학에서는 그러한 전통 화성학에 입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은 지 이미 오래이다. 아니, 왜?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이다. ‘작곡이란 행위는 오늘을 살아가는 기법을 우리시대의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작곡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전통 조성을 가지고 곡을 쓰는 사람은 작곡가로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누구의 성악발표회나 리사이틀, 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소프라노 누구누구의 순회연주를 한다. 그러면 꽉꽉 들어차던 연주회장이 누구의 작곡발표회나 작곡협회 주관 신작 발표회 때면, 갑자기 텅 비어 작곡가나 협회에 관계되는 학생들 수십 명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광경을 연출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작곡을 한다는 것은 대중음악이나 방송음악, 영화음악을 위한 작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 이 언밸런스(Unbalance)를 어찌 해야만 한단 말인가?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