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대용의 지기였던 청나라 선비 엄성이 그린 홍대용 초상. |
 |
| 충남 천안의 천안삼거리공원에 있는 홍대용 시비. 홍대용의 시 '건곤일초정주인' 일부와 그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
거문고·양금·가야금 능한 음악 명인
서양악기인 양금을 조선에 첫 소개
음악적 조예 깊어 명인의 경지에…
별장 '유춘오'서 지인과 풍류 즐겨
우정 나눈 박지원과 고담준론도 펼쳐
◆'거문고 명수'였던 음악가
이처럼 홍대용은 뛰어난 음악가였다. 그는 탁월한 음률 감각의 소유자로서, 음을 들으면 곧바로 기억을 하고 악기로 재현을 해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별장인 유춘오(留春塢)에서 친구나 지인들과 음악회를 수시로 열었다. 유춘오에는 그가 마련한 '건곤일초정(乾坤一草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홍대용은 이 정자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곤 했다. 그는 거문고를 소재로 한 시도 적지 않게 남겼는데, 그 중 '건곤일초정주인(乾坤一草亭主人)'라는 시가 있다.
'깊은 골목 안에 있는 집을 샀는데(買宅深巷裏)/ 서쪽 동산 한 채의 초가집이라(西園一草盧)/ 볼 만한 산과 샘 없어도(雖無山泉賞)/ 숲과 골짜기 자못 청허하도다(林壑頗淸虛)/ 짙은 그늘 무너진 언덕 가리고/ 우거진 풀은 섬돌 언저리를 둘렀구나(幽草遍層除)/ 문 앞엔 어른들의 수레 없으나(門無長者轍)/ 책상엔 먼 데서 온 편지가 있다네(床有遠方書)/ 앞서간 스승들의 교훈 길이 생각하니(永懷先師訓)/ 세상 사람과는 날로 멀어지는구나(日與世人疏)/ 다툼이 없으니 온갖 비방 면하고(無競免積毁)/ 재주 없으니 헛된 명예도 끊어졌네(不才絶虛譽)/ 좋은 친구 때때로 찾아오고(好友時叩門)/ 술동이에다 맛있는 산나물 안주가 있네(壺酒有嘉蔬)/ 맑은 거문고 소리 높은 난간에 울리니(淸琴嚮危欄)/ 곡조 속 슬픈 감회 그 누가 알겠는가(中曲且悲噓)/ 버려진 것 진정 하늘의 뜻이라면(棄置固天放)/ 꾸밈없는 본래 마음이 혹 태연하려나(素心或虛徐)/ 근심과 즐거움은 다할 때 없으니(憂樂無了時)/ 물성을 내가 어찌하겠는가(物性奈如予)'.
홍대용이 자신의 정자에 붙인 이름인 '건곤일초정'. 이는 당나라 시인 두보의 작품 '늦봄 양서의 새로 빌린 초가에 쓰다'에서 '양쪽 귀밑머리 쑥대처럼 덥수룩한 이 신세, 하늘 아래 이 초가정자 하나밖에 없네'라고 한 구절에서 따 온 것이다.
홍대용이 지기(知己) 친구인 청나라 선비 엄성(嚴誠)을 위해 지은 시도 보자. '철교 엄성에게 부침(寄嚴鐵橋誠)'이라는 작품의 첫째 수다. '성긴 비는 뜰 앞 오동나무 울리고/ 높고 큰 집에 서늘한 기운 감도네/ 묵은 화로에 향불 다 꺼지니/ 맑은 거문고 절로 상에 놓여있구나/ 불같은 더위 홀연 가버리고/ 세월 갈수록 감회만 더해지네/ 생각에 잠겨서 잠도 오지 않고/ 아득히 멀리 있는 친구가 생각나네/ 큰 물결 일어 바다가 막혔으니/ 만 리 밖에서 부질없이 바라만 본다네'.
홍대용은 음악을 즐기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한번은 그가 연경(燕京·베이징)을 다녀오면서 양금(洋琴)을 직접 구입해 왔다. 막상 양금을 사 오긴 했지만,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저런 방식으로 소리를 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홍대용은 양금으로 우리나라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조율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
홍대용이 양금을 우리나라 가락인 토조(土調)로 풀어낸 것은 1772년 6월18일, 그의 나이 마흔 두 살 때의 일이었다. 그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 낱낱이 적어 놓았기 때문이다. 홍대용이 양금을 토조로 풀어낸 이후 조선의 여러 금사(琴師)들이 이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양금은 새로운 소리를 갈망하던 18세기 사람들의 귀를 충족시켜 주었고, 그들의 벗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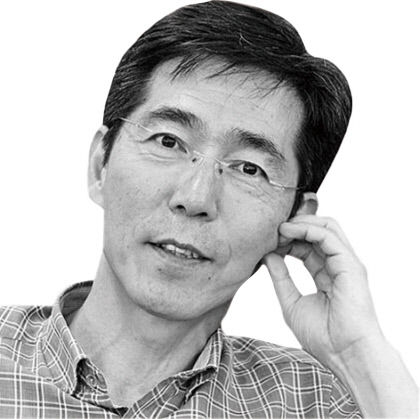 |
| 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
◆홍대용과 정조 임금
홍대용은 천문학, 수학, 음악과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성리학도 가까이했다. 그의 스승이자 고모부인 미호(渼湖) 김원행(1702∼1772)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다. 그의 가문은 노론 중에서 손꼽히는 가문이었다.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안이었다. 그는 주자를 맹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주자의 비판자도 아니었다.
홍대용만큼 실학자라는 명칭이 어울리는 인물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 실학자로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서얼 출신이어서 크게 출세할 수 없는 부류도 있었고, 남인이어서 정치적으로 억압된 경우도 있었다. 이덕무, 박제가 같은 이들은 서얼 출신이고, 이익이나 정약용 같은 이들은 남인 출신이다. 그러나 홍대용이나 박지원처럼 명문가의 후예도 있었다. 특히 홍대용은 정조가 세손 시절에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학문을 논하기도 했고, 정조가 임금이 된 이후에도 계속 관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다.
홍대용은 관직에 몸담은 이후 선공감 감역, 돈령부 참봉 등의 직책에 임명되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는 않은 듯하다. '계방(桂坊)'이라고 불린 세자익위사의 종8품직인 시직(侍直)이라는 직책으로 첫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세자익위사는 본래 세자를 호위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이 있으나, 차츰 세자가 학문을 연마하는 서연(書筵)에 드나드는 관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홍대용은 훗날 정조가 되는 세손의 서연에 드나들며 정조와 자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나눈 대화를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계방일기(桂坊日記)'이다.
계방일기는 여느 경연일기나 서연 일기들과는 달리 정조의 표정이나 잡담한 내용, 서연이 행해지는 방 안의 풍경 등 소소한 것까지 모두 세밀하게 묘사한다. 당대 최고 지성들의 학문적 깊이와 사유의 폭을 보여주는, 수준높은 문답들과 함께.
정조는 스스로를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 불렀다. 자기 자신을 세상의 모든 강물을 비추는 밝은 달에 비유했다. 그가 되고자 하는 임금의 모습이었다. 홍대용은 비유하자면 늘 이런 정조와 함께 했던 선비의 악기, 즉 거문고와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지음(知音)이었던 것이다. 글·사진=김봉규 문화전문 칼럼니스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시골 땅콩밭 방문객이 하루 1천명? “개천에서 용 났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6/news-m.v1.20250612.7499de31b83046fbb0bc5298763cf20c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