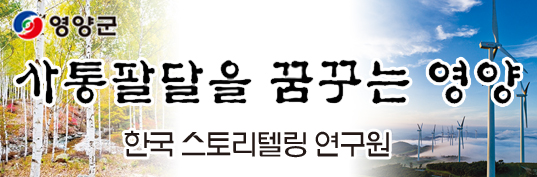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1985년 생애 첫 카메라를 손에 거머쥔 사진가 류태열. 그는 장승, 마애불, 불상, 안동 봉정사, 지리산 화엄사, 팔공산 은해사 거조암 오백 나한상 등 한민족의 얼과 맞물린 불교예술의 정수를 사진으로 포착해 그동안 모두 15번의 개인전을 열고 6권의 도록 및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
카메라는 절대 주인의 안목을 능가 못 해
취미 수준의 욕망으론 예술을 할 수 없어
절묘한 순간, 모두가 갈망하는 바 이지만
아무도 알려줄 수 없고 전수해줄 수 없어
장승·마애불·불상…'얼의 본령' 담는 중
사진기 옆에 사진작가가 있다. 자연은 둘 사이에 '연골'처럼 박혀 있다. 사진기가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피사체 때문이다. 피사체 앞에 선 사진기와 사진작가. 누가 주인공인가?
애송이 시절에는 사진기가 사진을 가져다주는 걸로 착각한다. 그래서 초심자들은 저급에서 벗어나 고급 사진기로 기종을 자꾸만 업그레이드 한다. 하지만 지상 최고의 사진기를 손에 넣어도 원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는 시절이 온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
절체절명, 한계의 순간이 도래한다. 자신이 뭘 찍고 싶은지를 모른다는 것, 모든 걸 찍고 싶다는 것, 둘 다 사진가를 절망케 한다.
취미 수준의 욕망으로는 절대 예술의 범주로 스며들 수가 없다. 사진기는 절대 주인의 안목을 능가하지 못한다. 눈 깜짝하는 사이 좌르륵~, 사진기가 '연사'란 방식으로 뭔가를 포착해내지만 '바로 이거야' 란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결정적인 한 방의 사진은 그런 연사의 그물망에는 걸리지 않는다.
절묘한 순간, 천의무봉의 순간, 그건 모든 예술이 갈망하는 바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고 전수해줄 수도 없다. 기술은 설계도가 있지만 예술에는 그게 없는 탓이다. 그래서 예술은 인생보다 더 유구하고 장구할 수밖에. 다들 절망의 보법으로 '신탁의 시간'을 기다린다. 그게 예술의 희망이자 절망 아닌가.
1996년 대구 동아쇼핑 내 동아갤러리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었다. 애송이 풍경 사진이었다. 이후 나는 모두 15번의 개인전, 6권의 도록 및 에세이 집을 펴냈다. 2회 개인전부터 주제를 확실하게 정했다. 장승, 그리고 마애불, 다음에는 불상, 사찰 등으로 주제를 심화시켜 나갔다.
이제 비로소 나는 '나만의 것을 찍는 류태열'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사진의 강을 벗어나 사진의 바다로 접어들었다. 강의 시절 내 사진은 다소간 균형과 비례, 그리고 섬뜩한 아름다움의 정령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정령은 본질을 보지 못한 '어떤 시류에 휩쓸린 상업적 미학의 일단'이란 것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진가가 아니면 하지 못 하는 일 그것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나고 끝내 내가 죽어 파묻히게 될 조국 산천, 그 한반도에 깃들어 살아온 한민족만의 문화 정신, 다시 말해 '얼의 본령' 같은 걸 사진으로 담아야 된다는 천명을 절감하게 됐다. '류태열 버전의 포토 다큐멘터리즘'이라고나 할까?
 |
| 청도군 각북면 복합문화공간 갤러리 '해브'의 큐레이터 일을 하면서 사진스튜디오 작업을 겸하고 있는 류태열. 그는 모두 5번의 존재 시리즈를 통해 불교 관련 흑백사진과 맞물린 안개와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기도 했다. 그가 갤러리 카페 벽면에 걸린 자기 사진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
나는 지금 아주 어스름한 경북 청도군 각북면의 한 강변에 닻을 내리고 살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같은 갤러리 '해브(HAVE)'의 큐레이터로 일 하며 틈틈이 별채에 마련된 내 숙소 겸 사진스튜디오에서 나만의 빛을 연구하고 있다. 낮에는 이 공간을 찾는 이들에게 커피와 차를 서빙한다. 해가 지면 야성의 시간으로 침잠하게 된다.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심지어 농가의 창문으로 스며 나오는 불빛조차 귀한 사진 원판 같은 깜깜한 밤. 더욱 초롱해지는 나를 인화한다. 달과 별빛 쪽으로 내 맘을 전송해 보며 지나온 날과 다가 올 날의 사진들을 파노라마처럼 완상하고 있다.
나는 아주 오래, 사진이란 찍는 건 줄 알았다. 그게 아니었다. 사진은 결국 '피사체한테 내가 찍히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찍는 것의 미학은 '아름다운 풍경'에 걸려 넘어진다. 잘 빚어진, 그 알량한 풍경이란 놈은 얼마나 치명적인가. 풍경 그 너머, 그걸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울 수 있단 말인가.
1958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나는 농사 짓는 가난한 부모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의 명령 때문에 세 형은 모두 직장으로 가버렸다. 우리 집에선 대학도 사치품이었다. 이원역 앞에 우리 집이 있었다. 역전 장돌뱅이. 그게 유년기 내 자화상이었다. 그 시절 '역전문화'란 예의와 범절을 조롱하는 것, 자연 나도 성난 말벌처럼 또래와의 관계를 피멍으로 망가트렸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날 사람 만들기 위해 대구로 불러 내렸다. 15세 무렵이었다. 남구 대명동 미도극장 근처 언덕배기 판자촌에서 얼기설기 살았다. 어쩔 수 없이 형이 다니던 가구공장 견습공이 된다. 등교하는 또래 학생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그게 내 첫 열등감이었다. 검정고시를 통해 인하대 영문과에 입학하지만 이내 그만두고 다시 9급 공무원 시험에 매달려 합격한다. 중구 남산동의 모 동사무소가 첫 근무지였다. 지금은 대단한 자리지만 그때는 그렇게 궁상맞은 자리도 없었던 것 같다. 두 달 만에 때려치운다. 가구공장에서 배운 목공기술 덕분에 동구에 있는 성보특수학교 목공 실기교사로 채용된다. 3년 정도 찐득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 학교 장애우를 촬영하던 사진작가 차용부의 사진에 크게 매료된다. 내가 목공을 대하는 자세보다 더 진지하고 성실하고 깊이가 있어 보였다. 그는 미국으로 사진을 배우러 유학을 떠났다. 귀국해 개인전을 했을 때 그를 찾았다. 그게 내 사진의 첫 단추 시절이랄 수 있다.
글·사진=이춘호 음식·대중문화 전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