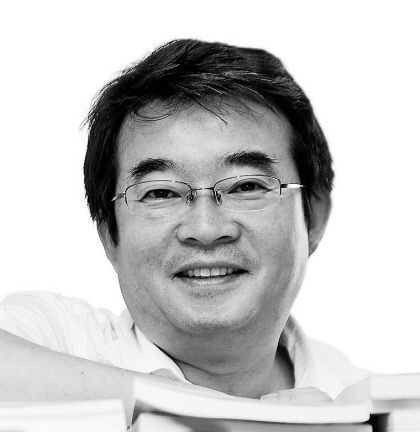 |
| 안도현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
초등학교 6학년 봄까지 안동 풍산에서 살았다. 나는 농협 바로 옆 가겟집 아이였다. 가게 앞으로 사시사철 조붓한 도랑물이 하나 흘렀다. 그 도랑은 가게에서 1㎞도 떨어지지 않은 연못에서 시작되었다. '눈꼽째기창'과 김홍도의 현판 글씨로 유명한 체화정 앞 연못이다. 50년 전만 해도 연못은 질척한 늪처럼 보였다. 어른들은 연못 안에 물이 나오는 소(沼)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발을 잘못 들여놨다가는 소가 발목을 잡아 빠져나올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도 덧붙였다. 여름에 도랑물이 불어나면 아버지는 밤에 족대를 세워 물고기를 잡았다. 손바닥만 한 붕어와 큰 메기가 세숫대야에 가득 찼다. 민물 뱀장어가 걸려든 날도 있었다. 그 뱀장어는 낙동강을 타고 내려가 남태평양에 알을 낳으러 가던 길이었을 것이다. 체화정 앞 연못은 지금도 물이 생성되는 수원지로서 내 상상력의 밑바닥에서 찰랑거린다.
고향에 집을 짓고 나서 마당과 텃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숙제가 생겼다. 연못을 하나 파야겠다고 생각했다. 없는 연못을 머리로 그려 보느라 한 달 넘게 잠을 설쳤다. 연못의 깊이를 떠올리고 가장자리에 앉힐 돌의 모양을 궁리하고 세상의 모든 연못을 검색하느라 일주일이 지나갔다. 연못 바닥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리를 가늠하고 물구멍의 높이를 생각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냈다. 연못가에 부들과 백련과 수련을 구해 심고 붕어와 미꾸라지를 키울 계획을 메모했다. 방수포와 비닐을 미리 주문했다. 그러다가 또 일주일이 지났다. 기다리는 포클레인 기사는 연락이 없었고 내 마음속의 연못은 컴컴해졌다.
포클레인 기사는 열흘 후쯤 덜컹덜컹 마당에 도착했다. 연못의 넓이와 깊이를 내게 물었고 나는 작대기로 둥그렇게 줄을 그었다. "몇 평쯤 파주세요"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기사는 연못이 너무 큰 거 같다고 했고 흙을 퍼낸 뒤에 어디에다 쓸 거냐고 다시 물었다. 나는 흙을 파낼 생각만 했지 흙이 쌓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다.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그러자 포클레인은 내가 작대기로 그어둔 선을 따라 어렵지 않게 흙을 퍼내기 시작했다. 밥그릇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듯이.
평평했던 땅이 깊이를 가지기 시작했다.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내가 정말 연못의 주인이 되는 걸까? 포클레인이 쌀자루보다 큰 돌을 옮겨와 연못 테두리를 두르는 것으로 작업은 끝났다. 나는 1m 깊이의 연못으로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다. 땅속에 허공이 있었던 거다! 내가 상상했던 연못은 어마어마한 허공이었고 나는 그 허공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었다. 연못을 궁리하다가 허공을 얻게 된 날이었다. 허공을 설계하고 허공에다 벽지 바르는 일을 상상하느라 나는 숨이 가빠졌다.
연못은 먹이를 뿌려주면 뽁뽁 소리를 내며 잘도 받아먹던 잉어들의 집이 되었고, 소금쟁이와 개구리들을 불렀다. 재미로 낚싯대를 던지는 제자도 있었고, 겨울에는 외손녀의 신나는 썰매장이 되어주었다. 올해 봄, 그 두껍던 얼음이 녹자 물 위로 잉어들이 죽은 채 떠올랐다. 아뿔싸, 내 욕심이 그 통통한 생명을 죽인 것이다. 연못의 깊이를 낮춘 건 3년째 세력을 키운 노랑어리연꽃의 줄기들이었다. 봄부터 나는 연못의 물을 양수기로 빼내고 10㎝마다 뿌리를 내리고 물속에 스크럼을 짠 노랑어리연꽃과 싸우고 있다. 다행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물방개가 들어와 사는 연못이야 라고 자위를 하면서.
단국대 문예창작과 교수·시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