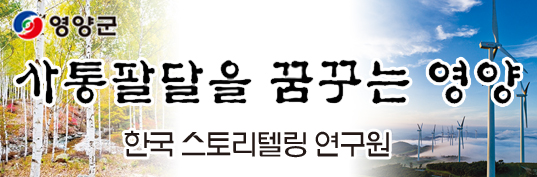|
| 김학조 <시인·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
가을빛이 국화 향기로 익어가는 아침에 시인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대구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헐티재 어디쯤이다. 도로 공사로 생긴 실틈에 쑥부쟁이 한 송이가 위태롭게 휘청거리고 있다. 시가 될 것 같은데 몇 날을 지나치며 궁리를 해도 마땅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인간이 추구한 편리성에 대항하는 자연의 항쟁과 자연의 영역을 덮어버린 인간 욕구에 대한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올의 실 같은 틈은 쑥부쟁이에게는 삶의 터였다. 쑥부쟁이로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듯했다. 그가 시를 썼는지 못 썼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햇살이 좋은 가을날의 벤치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즐김이 된다. 무념의 눈빛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발뒤꿈치나 살펴도 좋다. 동요 한 소절을 흥얼거려도 충분하다. 그런 무심함으로 '햇살샤워'라는 신조어를 막 생각해내고 있을 때였다. 똘망한 아이 하나가 토닥토닥 다가오더니 내 옆자리에 손을 얹는다. 엉덩이를 비켜 아이와 엄마가 앉을 틈을 마련하는데 아이의 손을 낚아챈 엄마가 나무라는 소리를 한다.
"아무 데나 앉으면 안 돼."
내가 앉은 자리가 느닷없이 '아무 데나'가 되었다. 나는 몸을 조금 움직여 의자의 빈틈을 메웠다. '아무 데나'를 메운 셈이다. 내가 앉고 남은 자리는 의자의 틈인 것이다. 그 틈이 아이 엄마에게는 '아무 데나'로 보인 것이다. 엄마로서는 거칠고 결이 고르지 못한 나무 의자는 '아무 데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엄마가 말한 '아무 데나'에 앉아 있는 나는 무엇인가? 하릴없이 낡아가는 허름한 나를 일컬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근히 마음이 불편했다. 틈은 서로 벌어져 사이가 난 자리이다. 내가 앉고 조금 남은 의자가 틈이라면 내가 만든 틈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틈은 상처가 되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틈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보도블록의 틈새에서 자라난 민들레의 홀씨는 사방으로 흩어져 내년 봄의 기약이 된다. 책갈피의 고운 틈에 끼워두었던 들국화 한 송이는 책장을 설렘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 한 줌은 강렬한 아침이 곁에 왔다는 걸 알게 한다. 기차선로의 덜컹거리는 한 뼘 틈새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
틈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도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오히려 여유가 되기도 한다. 메우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 얇고 보드라운 여유를 심어보면 어떨까?
어쩌면 그곳에서 구름이 빚어낸 고래가 춤을 출 수 있을 것이다. 반짝이는 바람의 비늘 하나를 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옆에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보도블록의 틈에서 쑥부쟁이가 시인에게 시적(詩的) 영감(靈感)을 주듯이.
김학조 <시인·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상] 1산단 이후 16년 만···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예타통과](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507/news-m.v1.20250729.79c3ffa8f4ac4b8d90fa3e712c2da9df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