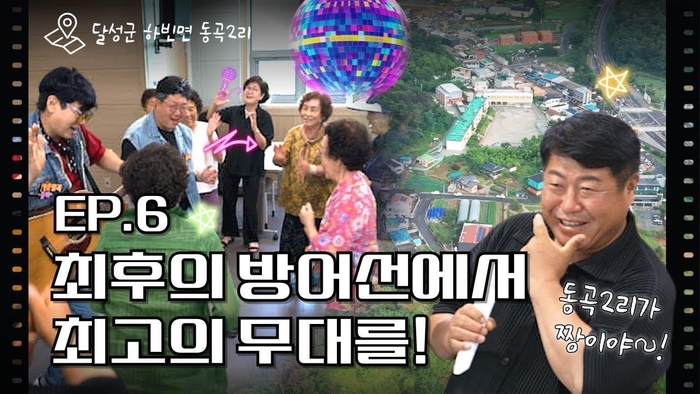정체성(正體性·Identity)은 타자와 자아를 구분한다.
개인과 집단에도 정체성이 있듯이 지역과 국가도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정체성은 시민이 공감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가치에서 나온다.
대구는 어떤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을까.
1982년 대구시가 펴낸 ‘대구의 향기’에서는 대구를 서울, 부산에 이은 한국의 3대 도시에 포함시켰다. 또 대구를 ‘분지성 내륙도시’ ‘정치도시’ ‘군사도시’ ‘상업도시’ ‘섬유도시’ ‘사과도시’ ‘교육과 문화도시’로 규정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대구가 한국 3대 도시로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다. 정치도시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보수일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적으로 대구는 섬유·염색산업 중심도시에서 자동차 및 기계부품산업 중심도시로 탈바꿈했다. 교육·문화도시라는 닉네임은 아직 유효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밀려 그 빛이 바래고 있다.
한때 사과의 주산지였으나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그 지위를 상실했다. 낙동강 페놀사건이나 벤젠·톨루엔 유출로 ‘환경오염도시’로 낙인찍혔는가 하면 두 번의 대형지하철사고로 ‘사고도시’로 전국에 각인됐다. 그 가운데 2003년 세계유니버시아드, 2011년 세계육상대회 등을 유치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했다. 또 도시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기 위해 ‘컬러풀 대구’라는 브랜드로 시민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도시의 정체성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생물처럼 변한다.
영남일보 위클리포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차례 이상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대구지역 인문·자연지리의 보고서인 대구지오(GEO)를 연재하면서 대구의 새로운 정체성 찾기에 나섰다. 대구지오는 멀리 공룡과 빙하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대구의 자연을 돌아봤다. 그 가운데 청동기~철기~신라~고려~조선~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대구사람이 어떤 생활과 무슨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위클리포유가 발굴한 대구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한다.
박진관기자 pajia@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