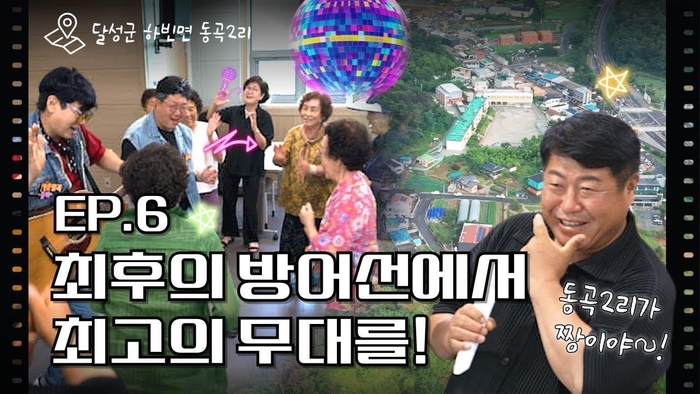|
1. 대구는 고인돌의 도시였다
한반도는 ‘고인돌 코리아’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지다. 전 지구상에 남아있는 고인돌 6만여기 가운데 4만여기가 한반도에 집중돼 있다. 이 중 2만5천여기가 남한에 있고, 나머지는 북한에 있다.
대구는 고인돌의 도시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부산, 광주, 인천보다 고인돌이 훨씬 많았다. 최근 고고학계에 따르면 대구 3천여기, 경북 3천여기 등 대구·경북지역에 약 6천여기의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사(市史)에는 1920년대 초만 하더라도 대구읍성 바깥에 위치해 장관을 이뤘다고 나와 있다. 1927년 일제는 우리나라 최초로 대구 ‘대봉동 고인돌’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도심의 개발과 확장으로 100기 남짓 남아있다.
대구의 고인돌 무덤형태는 북방형의 탁자식보다 바둑판 같은 기반식이나 묘실 위에 상석을 바로 올린 개석식 또는 묘표식(墓標式) 등 남방형이 대부분이다. 또 축조 시기는 청동기 후기라고 본다. 주로 신천 상·중류 양안, 달서구 진천천과 달성군 천내천, 칠곡 팔거천 일대 등 해발 20m 위에 분포하고 있다. 하천에 제방이 없던 시기에 신천과 연결된 금호강, 진천천과 연결된 낙동강이 범람해도 안 잠길 정도의 산지나 구릉지에 분포돼 있다. 이 시대 대구 사람은 주로 고인돌무덤과 돌덧널(석관묘)과 돌널(석곽)에 묻혔다고 추정된다. 위클리포유 보도 후 대구시는 고인돌을 도시문화 자산으로 재조명하고 역사·문화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심에 있는 고인돌을 주제로 한 ‘어반 갤러리 가이드맵’을 제작했다.
 |
2. 대구는 한·중·일 평화의 도시다
대구는 임진왜란 당시 침략군이었던 일본 장수 사야가와 구원군으로 참전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이 귀화해 정착한 평화의 도시다. 전국 어느 도시에도 이런 평화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 없다. 사야가는 선조로부터 김충선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김충선은 정유재란, 이괄의 난, 정묘·병자호란에 참전해 큰 공을 세워 삼란공신으로 추대됐다. 노후에 녹동으로 낙향한 그는 가훈과 향약을 지어 지역의 백성을 가르쳤다. 1789년 대구지역 유림에 의해 창건된 녹동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885년 재건됐다.
한편 두사충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각각 이여송과 진린을 따라 조선에 파병됐다. 두사충이 귀화하자 조정은 그에게 현 경상감영공원 일대에 식읍을 주고 살도록 했다. 그가 받은 땅에 경상감영이 옮겨오게 되자 그는 자신의 땅을 모두 내어놓고 계산동으로 옮겼다. 고국인 명나라를 생각하는 뜻에서 동네 이름을 대명동(大明洞)이라 붙이고 앞산 아래 단을 쌓아 매월 초하루가 되면 고국의 천자를 향해 배례를 올렸다. 그의 후손인 학생공파 60여가구가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다. 1912년 그의 후손이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그를 기리는 모명재를 건립했다. 위클리포유 보도 후 지난 21일 대구 수성구청이 모명재 일대를 대거 정비해 관광명소로 새로 태어났다.
 |
3. 대구는 세계최고 빙하기 자연유산이 남아있는 도시다
대구가 빙하기 자연유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슬산은 빙하기 한반도 기후의 비밀과 자취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팔공산, 가산, 응해산 등지에도 빙하기 대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흔적이 도처에 남아 있다. 서거정이 지구상에 빙하기가 존재한 것을 알았다면 대구십경에 공령적설(公嶺積雪) 대신 비슬암괴(琵瑟巖塊)를 넣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비슬산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빙하기시대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 영국 다트무어의 야너우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블루 록, 시에라네바다산맥의 돌강, 호주 타스마니아의 마운틴 바로보다 훨씬 아름답고 수려한 빙하기 자연관찰학습장이다. 세계 최고의 길이와 규모를 자랑하는 비슬산은 화강암이 만들어낸 돌강(암괴류·Block stream), 너덜겅(애추·Talus), 돌탑(Tor) 지대를 한 곳에서 모두 관찰할 수 있다.
 |
4. 대구는 혁신기생의 도시였다
대구는 400여년간 감영이 있던 경상도의 중심지로 평양, 개성, 진주, 경주와 함께 ‘기생의 도시’로 유명했다. 그러나 황진이와 논개, 매창과 계월향처럼 주체적 자아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기생은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구한말~일제강점기에는 그들보다 더욱 극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다간 혁신기생들이 대구에 살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대구의 혁신기생은 바로 선각자였다. 그들은 서구의 신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했으며, 개화와 계몽,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다.
전 재산을 털어 대구 최초의 여자학교를 세운 교육계몽 기생 김울산, 국채보상운동과 구휼에 앞장섰던 사회복지운동 기생 염농산, 의열단에 가입한 독립투사 기생 현계옥, 여성해방운동에 앞장선 사상기생 정칠성 등 그들의 행적은 진흙 속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4명의 혁신기생은 사후 재조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사람의 기억 속에 잊혀가고 있다. 더구나 김울산과 염농산의 업적을 기린 송덕비와 비각은 파괴되거나 훼손·방치돼 쓰러지기 일보직전에 있다. 위클리포유 보도 후 복명초등 졸업생인 김울산의 산소를 정비했다. 성주군에서는 염농산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여는 한편, 비석을 세우기로 했다.
 |
5. 대구는 흑백사진의 도시다
70년대까지만 해도 대구는 ‘사진의 수도’였다. 당시엔 컬러 대신 흑백사진이 대세였다. 하지만 지금의 ‘컬러풀 대구’는 사진의 수도가 아니다. 대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흑백사진대전을 35년째 개최하고 있는 ‘흑백사진의 수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흑백사진은 디지털사진으로 인해 동호인과 단체가 줄고 있다. 전국흑백사진대전 출품작 700~800점 가운데 순수한 아날로그 흑백사진은 2~3%에 불과하다.
또 흑백사진대전 출품작도 매년 줄고 있다. 1천점 이상 들어왔던 출품작이 조금씩 줄어 지난해와 올해 700점대로 떨어졌다. 혹자는 흑백으로 대변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대구사람의 보수적 기질이 흑백사진대전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대구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사진비엔날레를 2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
6. 대구는 누정(樓亭)의 도시였다
임진왜란 전후인 16~17세기, 낙동강과 뱃길로 연결된 금호강 중·하류지역에서 대구유학은 르네상스를 맞이한다. 누정(樓亭)을 중심으로 강안문학(江岸文學·강을 따라 오가며 문학행위를 하는 것)이 활짝 꽃피게 된다.
영조 때 발간한 초판 대구읍지에 따르면 총 6개의 정자가 기록돼 있으나 1924년 발행된 대구읍지에는 총 88개의 정자가 생길 정도로 늘어났다. 이 중심에 있던 곳이 바로 연경서원이다.
1563년(명종 20)에 창건된 연경서원은 대구지역 최초의 서원으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보다 20년 후에 건립됐지만 달성의 도동서원보다는 40여년 앞섰다. 연경서원은 효종 때 사액서원으로 승격된 유서 깊은 서원으로 퇴계 이황을 주향으로 하고 한강 정구, 우복 정경세를 배향했다. 이곳에서 공부한 대구지역 유림들은 임란의병의 선봉에 섰으며 대구유학의 문풍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300여년이 지난 1871년 연경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돼 자취가 사라졌다. 이 밖에 금호강 강안문학의 터미널역할을 했던 세심정(洗心亭)과 부강정(浮江亭) 등도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초기 6개의 정자는 전경창·응창 형제의 세심정, 채응린의 압로정(狎鷺亭), 정사철·광천 부자의 아금정(牙琴亭), 이주의 환성정(喚惺亭), 이종문의 하목정(霞鶩亭), 서시립의 전귀당(全歸堂)이다. 이 중 압로정, 환성정, 하목정, 전귀당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아금정은 금암서당 내에 있다. 위클리포유 보도 이후 대구시가 연경서원 복원을 추진 중이다.
 |
7. 대구는 미인의 도시다
한국에선 대구가 ‘미인의 도시’로 소문나 있다. 지난 50여년간 인구 대비 역대 미스코리아가 가장 많이 배출됐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200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2007년 이후 매년 본선 당선자가 배출되기 시작해 2007년 미, 2008년 선·미, 2009년 선, 2010년 선, 2011년 선·미, 2012년 미로 서울·경기·인천 출신이 대부분 본선 상을 독식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 출신이 매년 본선에 당선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남방계와 북방계미인이 반반씩 섞여있다. 대개 북방계는 남방계에 비해 피부가 희고, 눈이 작으며 키가 크고 늘씬한 편이다. 또한 콧날이 좁고 길며 입술은 얇다. 대구는 이러한 북방계와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는 남방계 인자가 잘 조합됐다.
특히 대구는 경북의 중심지여서 미인이 탄생할 조건을 두루 갖췄다. ‘사과를 많이 먹어서 예쁘다’ ‘패션도시라서 미인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대구 미인이 미인의 전형으로 등장한 건 근대에 들어서다. 조선시대에는 큰 눈이 미인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진주나 강릉 등지에서는 남방미인보다 평양이나 강계 등 한반도 북부지역의 미인을 더 알아줬다.
대구·경북미스코리아 입상자는 역대 미스코리아대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88년 준 미스유니버스로 당선됐던 장윤정은 한국의 미가 국제적으로도 입증된 쾌거였으며, 2002년 미스코리아 진 금나나는 외모뿐 아니라 뛰어난 지성으로 미스코리아대회의 격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위클리포유 보도 후 대구시가 대구미인을 특화해 뷰티산업으로 발전시킨 가운데, 올 10월 대구엑스코에서 ‘제1회 뷰티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 정리·사진=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