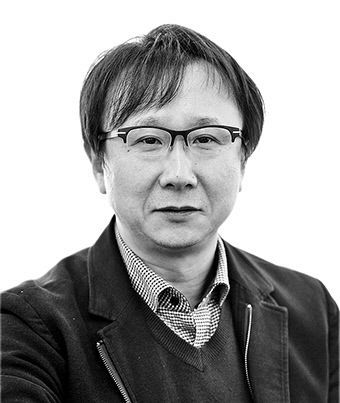 |
| 이창호 논설위원 |
스포츠가 감동을 주는 것은 혜성 같은 플레이어의 등장과 활약만도 아니다. 정점에 있던 스타들의 아름다운 은퇴도 있어서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존경했다는 미국 프로야구(MLB)의 '레전드' 루 게릭(1903~1941). 1939년 여름 어느 날, 그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코끝 찡한 은퇴 선언을 한다. 그때 나이 36세, 훗날 '루게릭병'으로 불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진단을 받고 나서다. 그는 "원치 않은 '중단'이지만 나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행운아다.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중들은 기립 박수로 쾌유를 기원했다. 은퇴 연설 2년 후 그는 세상과 작별했다. 선수 시절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그늘에 가렸지만 MLB 역사에선 루스보다 더 존경받은 그였다.
얘기한 김에 사례 하나 더.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 한때 아쉬웠던 순간이 있었다. 2014년 박지성의 은퇴였다. 축구 선수로서는 아직 뛸만한 나이(33세)의 은퇴에 무척 섭섭했던 기억이 있다. 정작 그는 "조금의 후회도 없다. 팬들의 사랑에 힘입어 영광과 행복을 누렸다"며 팬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미련 없이 떠날 때를 알았기 때문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갑(국민의힘 상임고문)씨가 떠오른다. 자칭 '원조 보수'로서 입바른 소리를 잘했다. 그런 그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었다. "3선이면 국회의원에게 환갑이다. 박수칠 때 떠난다. 난 이제 자유인이다." 껄껄껄 웃으며 밝힌 은퇴의 변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가히 '은퇴의 정석'이라 할 만하다.
작금 우리 정치판에서 물러날 때를 아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찾아보기가 드물다. 너도나도 '선수(選數) 쌓기'에 안달이다. '이 좋은 걸 왜 그만둬'다. 종합선물세트 같은 특권·특혜에 맛 들인 탓이리라. 입법 활동도, 지역구 관리도 그저 면피 수준으로만 하면 되고. 선수를 쌓을수록 타성에 빠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총선을 앞둔 일부 초선 의원의 용퇴도 이런 정치 문화에 염증을 느낀 탓도 있을 게다.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훈현 국수(國手)는 "남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그만이다. 안 맞는 옷 벗고 돌아오니 이제 살겠다"고 했다. 그의 눈에 비친 여의도는 비상식이 득세하는 세계였던 것이다.
모든 다선 의원을 '노욕(老慾)의 화신'으로 폄훼할 뜻은 없다. 다선의 관록이 국사를 논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데 효과적일 때가 많다. 지역구 발전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다만 4선, 5선을 하고도 성에 차지 않는 듯 '묻지마 다선'을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 더욱이 국회에서 존재감도 없었고, 시쳇말로 '농땡이'까지 쳤다면 말이다. 제22대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실 '아름다운 퇴장'을 기대하기엔 촉박한 시간이다. 다선 의원들은 공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버틸 모양새다. 하지만 표심(票心)의 기본 속성은 '변화'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고인 물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지금 물러나는 게 대표팀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결정이다." 박지성의 은퇴 변이다. 누가 봐도 용퇴가 필요한 정치인이 있다면 곱씹어 볼 만하다. 참, 김용갑 전 의원 말마따나 '3선이면 환갑'이라 했는데, '요즘 환갑은 청춘'이라며 항변할 수는 있겠다.
이창호 논설위원

이창호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단독인터뷰] 한동훈 “윤석열 노선과 절연해야… 보수 재건 정면승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603/news-p.v1.20260228.8d583eb8dbd84369852758c2514d7b37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