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설탕을 싣고서~' 고무줄 놀이 편가르기 가위바위보에 내 친구 정희는 늘 첫번째 당첨자였다. 나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키에 발이 무지하게 빨라서 운동회 400m 계주 마지막 주자는 늘 정희였고 정희가 있는 팀 아이들은 공책을 하나씩 더 받아갔다.
동네 친구들과 매일같이 하던 고무줄 놀이에 키 작은 나는 늘 감자(깍두기) 신세였다. 내가 정희보다 노래도 더 크게 하고 박자도 잘 맞추는데 그럼 뭐해? 땅에 손을 짚고 다리를 올려도 발끝이 고무줄에 닿지를 않았으니 말이다. 고무줄을 잡고 있어야 할 때엔 모두들 맞잡은 친구쪽으로 안가고 경사가 내려간 내 쪽으로 가까이 오는 바람에 치켜올린 친구 다리에 맞아 엉엉 운 기억도 있다. 콩나물을 매일 한 시루씩 매일 먹었으면 감자를 면했을 텐데…. 감자의 쓴 기억은 (나중에 더 큰다 걱정말라시는 엄마 말씀 덕분인지) 뒤늦게 훌쩍 커버린 키 덕분에 나를 못알아 보는 동창회 해프닝으로 기분좋게 갈무리되었다.
어린 시절 놀이에는 대부분 노래가 있었고 어릴 적 불렀던 그 노래는 수십 년이 흘러도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동네마다 가사나 음정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다. 이 동네와 저 동네 아이들이 같이 놀라치면 서로 자기 동네 노래가 맞다고 우겼고 불뚝 성질을 가진 친구 몇은 씩씩거리는 콧김에 심지어 몸싸움도 불사했다. 이렇게 동네마다 노래가 달랐던 것은 바로 '구전'으로 노래가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 나라 또는 지역에 오랫동안 불러와 구전으로 전해진 노래들을 '민요'라 일컫는데 민요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안고 있다.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는 1894년 당시 사회 혼란과 정부 및 관료의 부패에 민심이 동요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그 배경으로 한다. 가사 속의 '파랑새'는 파란 군복의 일본군을 '녹두밭'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뜻한다. 아이들은 동네 골목에서 일본군의 눈을 피해 이 노래 불렀고 일제의 서슬 퍼런 칼날에도 불구하고 저항의 노래는 구전에 구전을 더했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한국가곡 '고향(망향, 그리워)'의 작곡가 채동선(1901~1953)은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일제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이자 음악가였다.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 재학 중 3·1 운동에 가담한 이유로 강제 퇴학을 당했고 이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뒤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민요 채보와 한국 전통음악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우리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는 바로 작곡가 채동선의 노력으로 악보로 남게 된 곡이다. 조수미의 첫번째 한국 가곡 앨범에도 실려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8월이 되면 우리의 역사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우리 문화'가 1945년 광복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키워가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이 더욱 깊이 울리는 오늘이다.
이선경 <이선경가곡연구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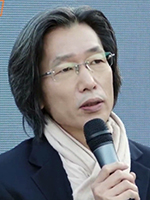
백승운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