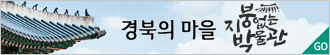none-display-h1
눈물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③서세일 고베 테크노플로우원 대표
2016.08.09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1부>] 3.배윅토리아 새고려신문 사장
2016.02.01
2016.01.06
[디아스포라 .12·<끝>]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
2015.12.04
2015.11.24
2015.10.30
[디아스포라 .9] ‘한족마을 내 경상도마을’ 흑룡강성 하얼빈시 홍신촌
2015.10.21
2015.10.13



보도의 그 후, 뉴스 후(後)
더보기영남일보TV
더보기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 4천346억 규모 대구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 2공구 건설 공사, 결국 수의계약 가닥 1
- 또 하나의 특별시 '대구경북특별시' 탄생한다…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2
- 경북대, 21일부터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부총장이 대행 3
- 1~2인 가구 증가, 분양가 상승…대구 아파트 시장서도 59㎡가 새로운 강자로 뜬다 4
- 삼성라이온즈 한국시리즈 진출, 대구 외식업계도 'KS 특수' 기대감에 웃는다 5
- 에이럭스·탑런토탈솔루션, 공모주 청약 시작 6
- TK 행정통합 합의문 발표…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7
- 한국시리즈 사상 최초 '서스펜디드 게임', 열받은 삼성팬 8
- [국정감사] "대구 군부대 이전, 군부대가 지역 상생 전략 발굴해야"…제2작전사 국정감사서 각종 현안 도마 9
- [트렌드트립N] BTS 진, 내달 첫 솔로앨범 '해피' 발매…- 황영웅, 정규1집 발매 첫날 30만장 돌파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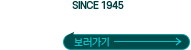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5. 황외금 공화비닐화공지사 대표](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9/20160901.01006073355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4. 정동일 히데카즈 상사 대표](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8/20160815.01005073521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③서세일 고베 테크노플로우원 대표](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8/20160809.01006072230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2) 오사카 경북도민회장 박재길 이하라공업 대표](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7/20160726.01006073333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2부> 1. 김진묵 도쿄 경북도민회 부회장...중견 택시회사 CEO…“한국인으로서 자부심 日귀화 생각 없다”](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7/20160718.01006073651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1부> 5. 이춘식 사할린 코르사코프 시의회 부의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3/20160302.01008072914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1부>] 4. 강영복 사할린경제법률정보대 총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2/20160217.01009073844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1부>] 3.배윅토리아 새고려신문 사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2/20160201.01006072746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1부>] 2.김춘경 전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의원·한인회장](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1/20160118.010050722590001i1.jpg)
![[디아스포라 '눈물을 희망으로' .1] 프롤로그](https://www.yeongnam.com/mnt/thum/201601/20160106.010030710550001i1.jpg)
![[디아스포라 .12·<끝>]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을 것](https://www.yeongnam.com/mnt/thum/201512/20151204.010050730480001i1.jpg)
![[디아스포라.11] 버림받은 땅 우토로](https://www.yeongnam.com/mnt/thum/201511/20151124.010060726540001i1.jpg)
![[디아스포라 .10] 중국에서 태어난 조선민들의 꿈](https://www.yeongnam.com/mnt/thum/201510/20151030.010060747480001i1.jpg)
![[디아스포라 .9] ‘한족마을 내 경상도마을’ 흑룡강성 하얼빈시 홍신촌](https://www.yeongnam.com/mnt/thum/201510/20151021.010050725310001i1.jpg)
![[디아스포라 .8] 그곳을 어찌 꿈엔들 잊으리오](https://www.yeongnam.com/mnt/thum/201510/20151013.010100752370001i1.jpg)

![[영상]영남아 반갑다.호남아 사랑한다.](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10/M2024102200230425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