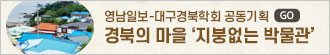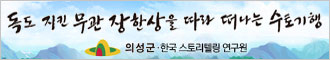|
| 붓을 움직이는 건 과연 누구인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완성체라고 가정한다면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억지로 끌고 가는 얄팍한 창작열은 쉬 바닥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열정을 딛고 신명(神明)으로 건너가야 된다. 그러하니 맘에 드는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은 분명 이승이 아니라 저승의 한 수가 개입되어야 될 것 같다. 그 기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찰나적으로 나타나는 번개 같은 것이리라. |
여기 한 장의 종이가 있다. 그 옆에 칠흑의 어둠을 머금은 거대한 붓이 또 놓여 있다. 맘은 일순간 붓이 되어 종이 위로 올라간다. '필무(筆舞)'의 시간. 혼신은 어떤 극치를 향해 피어오른다. 그게 '일필휘지(一筆揮之)'의 양대 필력이랄 수 있는 용사비등(龍蛇飛騰·용의 기세와 같은 힘찬 필력)과 평사낙안(平沙落雁·모래사장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듯한 한없이 가볍고 날렵한 필력)이랄까.
기원전 108년 한무제 시절, 한자가 한반도로 건너온다. 해동 서예의 신기원이 열리게 된다. 때맞춰 후한의 환관 채륜(蔡倫)이 인류 최초의 종이를 발명하게 된다. 이후 2천년 넘게 왕희지, 구양순, 안진경, 조맹부, 동기창, 왕탁, 등완백, 김농, 조지겸, 오창석, 하소기, 추사 김정희 등 불후의 명필이 줄을 잇는다. 청나라 서예가 양헌은 '평서첩'에서 중국 서예사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한 바 있다. 진나라(왕희지)는 '신운(神韻)', 당나라(구양순)는 '법도', 송나라(소동파)는 '의취(意趣)', 원(조맹부)·명나라(동기창)는 '자태(姿態)'를 숭상하였다. 그러나 청나라는 요란하고 화려하게 번지기는 했지만 신기원이 될만한 서체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한 개인의 경지만 보여주는 서풍(書風)만이 피어났다. 하지만 성과도 있었다. '양주팔괴(揚州八怪·청나라 때 장쑤성 양주에 모인 금농, 정섭, 나빙 등 8명의 개성파 서화가)'가 나타나 법고창신(法古創新)에 기반한 전통서예 현대화에 불을 붙인다. 20세기 현대미술의 바탕이랄 수 있을 수작이 피어난다. 그 흐름에 편승한 불세출의 한국 서예가가 바로 추사 김정희다. 나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서예계로 들어왔다. 어느 날 선이면서도 동시에 악의 존재가 바로 추사란 사실도 절감하게 된다. 그를 닮는 건 가능했어도 그를 넘어서는 건 불가했다.
 |
| 대부분의 작업 주제는 존재와 삶에 대한 물음이다.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조형언어는 서예이며 이것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인화·서양화·전각기법 등을 끌어왔다. 돌에 각을 하고 있는 일사 석용진. |
붓을 움직이는 건 과연 누구인가?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를 완성체라고 가정한다면 전략적으로 교묘하게 억지로 끌고 가는 얄팍한 창작열은 쉬 바닥이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히 열정을 딛고 신명(神明)으로 비상해야 된다. 그러하니 맘에 드는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은 분명 이승이 아니라 저승의 한 수가 개입되어야 될 것 같다. 그 기운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찰나적으로 나타나는 번개 같은 것이리라. 서예는 기(技)와 술(術)이 아니고 하나의 예(藝)이고 도(道)이고 법(法)이다. 붓은 물성이지만 붓글씨는 신성(神性)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이 몸이 어찌 거기로 흘러갈 것인가? 나의 지난 삶은 오직 그 화두와의 싸움이었다. 지독한 더위가 엄습하던 이번 여름, 난 내겐 기념비적이랄 수밖에 없는 한 권의 서예론을 출간했다. '한 생각 만 갈래'란 제목의 서예 묵시록 같은 책이다.
모두 77개의 작품에 어울릴 단상(斷想)을 병기했다. 내 작업의 주제는 존재와 삶에 대한 물음이다. 그 물음은 선배 성현들의 관점을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이러한 30여 년의 여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도 바뀌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형언어와 기법들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본다면 내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조형 언어는 서예이며 이것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기호학적인 해석과 해체주의적인 경향과 더불어 문인화적인 어법을 바탕으로 한 서양화와 서예의 조화, 나아가 전각기법을 화면에 끌어온 것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나는 '오래된 약속'이라고 명명했다. 가급적 문자의 자형이 가진 사회적 약속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극한 것은 다 '불립문자(不立文字)' 아닌가. 경계와 변방의 물성이 짙을 수밖에 없는 것. 하여 2019년부터 시작된 내 작업의 주제는 '모호한 약속'이란 명칭을 갖게 된다. 고딕체로 된 영어, 그리고 그것과 상응하는 한자, 거기에 어울릴 그림이 포개졌다. 그걸 받쳐주는 재료도 무진장하게 변화됐다. 나무, 돌, 쇠, 유리, 심지어 빙렬(氷裂·도자기 표면에 형성되는 잔금) 효과를 위해 작품 위에 에폭시, 폴리코트, 황산, 부식동 등 같은 도료와 화공약품까지 동원했다. 그건 수직의 영광이 아니라 '수평적 미학의 막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사진=이춘호 음식·대중문화 전문기자 leek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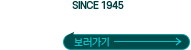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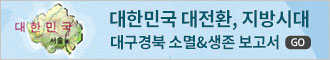



![[ 시도때도없는 뉴스06.18] 대구 수성구 한 호텔 피트니스센터, 76세 이상 출입 제한 논란](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6/M2024061800094409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