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人사이드] ‘초대박’ 경산지식산업지구 숨은 공신…김병삼 DGFEZ 청장의 기업·투자 지역 유치 해법은?
경산지역 숙원 사업이던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아울렛 투자자로 현대백화점 계열사인 한무쇼핑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지난 2월 19일. 교육 및 산업도시이던 경산을 상업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썩일 때 한쪽에서 뿌듯한 웃음으로 자축하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병삼 대구경제자유구역청장이다. 김 청장에게 경산지식산업지구의 개발 가시화가 남다른 감회로 다가오는 것은 경산지구 내 부지 용도 변경이라는 성과를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여 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정적 기류에도 김 청장은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을 주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됨으로써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입주가 가능해졌다. 영남일보는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에 위치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에서 김병삼 청장을 만나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조화를 통한 기업의 성장 지도를 그리고 있는 그의 구상을 들어봤다. ▶경산지구의 성공적 론칭을 축하한다. 이를 포함한 대경경자청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달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하 대경경자구역)은 IT융합·첨단부품소재·그린에너지·첨단의료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해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이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 중 3개 지구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2개 지구도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및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최적의 산업 입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FDI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다." ▶기업들이 느끼는 대경경자구역의 투자 매력 포인트를 꼽는다면. "대구경북은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돼 협력사 및 공급망 연계가 용이하다. 또 기업간 투자 및 협업을 통한 국내 시장 진출이 유리한 환경도 갖췄다. 특히 구미(전기전자), 포항(철강·2차전지), 울산(자동차·중공업·조선), 마산창원(중공업·기계공업) 등 주요 산업 클러스터와 1시간 내 인접해 있다. 때문에 삼성, LG,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무궁무진하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두축 중 대구는 전기차 모터·서비스 로봇·AI 블록체인 빅데이터(ABB)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인력 양성, 자율주행 실증 기반 구축, UAM(도심항공교통)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 역시 친환경차, 2차전지, 바이오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투자 핵심 유인 요인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에 주는 혜택도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특례·마케팅·투자유치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경산지구와 수성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 지원 플랫폼을 개설해 기업 간 네트워킹과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한편, 8개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에게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 국내외 박람회 참가, 기술 자문 등의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 확장과 추가 지정을 임기 내 꼭 완료하고 싶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제2수성알파시티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군위하늘도시, 군위 첨단산업단지, K-2 후적지, 구미경제자유구역지구, 경주첨단혁신산업지구, 포항경제자유구역지구 신규 지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핵심 전략산업인 ICT 로봇, 의료 바이오, 미래모빌리티산업을 중심으로 외투기업과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목표다. 특히, 올해 분양을 앞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등 외투 1억 달러를 포함한 1조9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는 것은 당면 목표이기도 하다." ▶해외 자본이나 기술 유치는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들이 많다. "경제자유구역의 최우선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인천이나 부산·진해와 같은 물류 해운이 가능한 도시를 선호한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은 모두 31건에 8억3천900만 달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규모의 외투 유치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해외로 나갔던 지역 연고 기업을 다시 유치하는 리쇼어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대표적인 리쇼어링 기업으로 '아진'을 들 수 있다.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도 만만찮을 것 같다. "대경경자청은 해외로 진출했던 국내 기업의 복귀와 정착을 위해 각종 비용에 보조금과 법인세관세 등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거점 무역관과 연계해 해외IR 활동도 진행하려 한다. 더불어 주한대사관과 상공회의소 등 주력산업별 외국기관을 통해 대구경북 핵심전략산업과 국가별 타깃에 적합한 다자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행사개최 등을 통해 다각도로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 대경경자구역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도록 하겠다.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이 문을 열면 8개 지구에서 신공항까지 1시간 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입지적인 강점을 홍보 마케팅에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기업들에게 대경경자구역을 자랑해 달라. "기존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국가 첨단산업단지 및 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와 연계해 기업 간 협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또 대학과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간 소통 창구를 지원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경경자구역은 한국을 넘어 글로벌경제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최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대경경자구역은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웃음) ▶마지막으로 대경경자청 내부 고객인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좌우명이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인으로 산다면, 당신이 있는 그곳은 모두 참된 자리라는 의미다. 직원 모두가 주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자기 위치에서 본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을 직접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민원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 없을 것이다. 기업이 잘 되도록 탄탄하게 지원해서 지역과 지역민 사정이 나아지고, 설혹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기업과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 대경경자청의 자리다. 직원들에게 하는 하는 말이 있다. '법령에 명확하게 금지된 규정 외에는 무조건 기업인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 물심양면 지원하라'는 것이다." 대담 - 홍석천 산업팀장 정리 - 이동현 기자 /홍석천 기자 hongsc@yeongnam.com





![[토크 人사이드] ‘초대박’ 경산지식산업지구 숨은 공신…김병삼 DGFEZ 청장의 기업·투자 지역 유치 해법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3/news-p.v1.20250317.dc18cdda2bee45d1b9db75cb2c0f4469_T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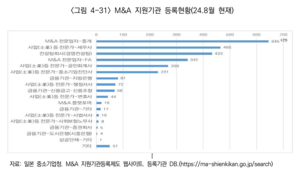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일본 중소기업의 생존 방식 ‘M&A’<3>](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1/news-p.v1.20251103.8f1b9508e95e44a7975b064eeae6f19b_T1.png)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매출보다 시너지” 뷰티 컨설팅社가 200년 전통주 기업 인수](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1/news-p.v1.20251026.0f045f0fe2e2429e99315a6d48a8d464_T1.jpg)
![[동대구로에서] 문 닫는 기업에서, 이어받는 기업으로](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p.v1.20251019.063da01270f04aad8824e57d9b552f40_T1.png)



![[100년 기업 새 패러다임 기업승계] 가업 후계자가 없다… 친족승계 저무는 ‘노포 왕국’ 일본](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10/news-p.v1.20250926.22a7c96df69d45a8a98836f631ad6896_T1.jpg)


![[주목 이기업] 프리미엄 탁송 세차 플랫폼 ‘삐CAR뻔쩍’](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9/news-p.v1.20250917.d2cefae3afb44caca1f9ea8de68392ab_T1.jpg)
